【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생년월일은?"
"신축년 9월 15일이에요."
희끗희끗한 머리에 두툼한 돋보기를 쓴 선생은 내가 말하는 것을 종이 위해 써내려갔다.
"이름은?"
"순할 순, 구슬옥이에요."
"음, 순, 옥이라......."
선생은 마치 수학 계산이라도 하는 듯 알 수 없는 숫자를 써내려가며 옆에 놓인 책을 뒤져가며 다시 또 쓰고, 나는 마치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답을 기다렸다.
"원래 이름에 옥, 구슬옥을 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순자도 그렇고. 이름이 좋은 기운이 없네. 금이 많아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고 해도 막아버리거든. 흠. 그래서 고집도 세고. 고지식하고. 아무래도 이름에 나무가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줘야 할 게야."
"......."
나는 뭐라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내 이름이 너무 좋다거나 만족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름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은근히 화가 났다. 물론 사는 게 답답해서 사주 풀이를 보러 온 내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옥, '순할 順, 구슬 玉'으로 특별한 뜻이나 의미도 없는 이름이다. 거기에 이름이 불릴 때마다 왠지 촌스러운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빠나 언니들의 이름을 살펴봐도 남들처럼 돌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쁘거나, 아니 오히려 흔해도 부르기 편안 이름도 아니고 보면. 가끔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은근히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언젠가 엄마이게 이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름 짓는 게 뭐 그리 중요했겄냐? 그래도 외삼촌이 작명소에 가서 돈 주고 지어온 이름이여. 이름대로 산다는 말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이름을 알리기도 하는 거여. 그러니 괜한 이름 탓 하지 말어."
똑부러지는 말씀에 두 번 다시 이름을 탓하는 일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불만이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예쁜 이름으로, 부르기도 좋고, 들을 때도 좋은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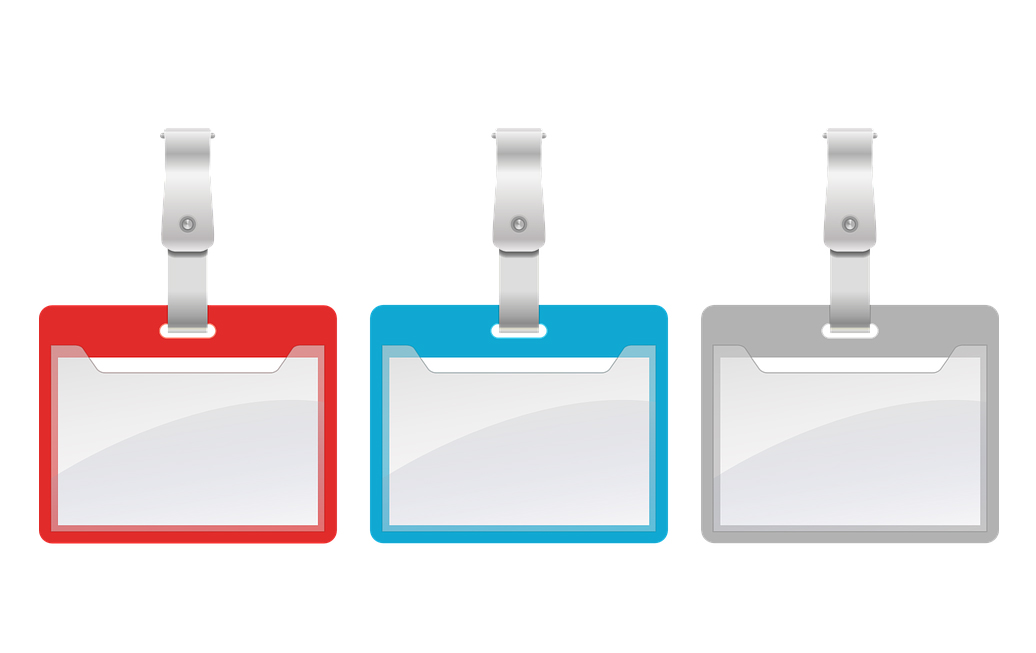
ⓒ Pixabay
한창 호기심 많고 알고 싶을 때도 많은 사춘기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동안 내 이름은 희경이었다. 그렇다고 작심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당황하는 순간에 튀어나온 게 바로 희경이었다.
당시에 서대문에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늘 뒷자리에 앉던 남학생이 내 이름을 물었고 순간 내가 좋아하던 소설가 은희경님의 이름이 떠올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경이라는 답을 했다.
그 후로 집이나 학교 밖에서 내 이름은 희경이었다. 주로 미팅이나 소개팅을 할 때 쓰는 이름으로 내 이름보다 희경이라는 이름을 쓰면 왠지 좀 더 갖춘 느낌이 들고 뭔가 한 겹 두툼한 보호막을 쓰고 있는 것 같아 편안함을 갖게도 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거침없을 수 있었다.
그 뿐인가?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도 가명을 쓰는 게 유행처럼 번졌고 이름이 예뻐서 굳이 가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도 각자 이름을 하나씩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내막에는 은근한 나의 주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창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던 고등학교 시절, 그것도 어느 정도 학교생활이 익숙해진 2학년 때는 무언가 일탈을 꿈꾸기 좋은 시기였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협동심(?)도 컸고. 나를 비롯한 6명의 무리들은 주변의 남학교 학생들과의 미팅으로 흐드러진 봄날을 보내고 있었다.
거기에 나는 선도부로, 학교호국단 간부로 나름 모범생에 우등생으로 학교 내에서는 조회를 설 때면 앞에 서고, 교칙을 위반하면 벌점을 주는 일을 하면서 학교 밖에서의 일탈은 짜릿한 즐거움을 주었다.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오늘 미팅하는 애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오빠 학교 후배야."
"알지? 우리 6명 모두 잘 되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
"각자 이름들이나 잘 불러. 괜히 진짜 이름 부르지 말고."
그날도 우리 6명은 학원에 가야할 시간에 광화문에 있는 태극당으로 향했다. 6명 모두 마음에 드는 상대와 잘 되면 다음으로 연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는 우리만의 규칙으로.
하지만 6명 모두 잘 된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규칙을 지켜나가다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팅을 할 수 있었다. 어쩌면 진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바람보다는 그저 일탈을 즐기는 게 더 좋았는지도 모른다.
빵집에 들어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눈치를 보며 각자 소개를 하고. 물론 가명으로. 그러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고. 남학생들 중에서 코미디언을 자청한 학생의 우스갯소리에 웃기도 하고, 어설픈 퀴즈게임에도 집중하며 나는 희경으로, 다른 친구들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어? 이게 누구야? 이놈, 순옥아."
"......"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교련주임선생님이 어이없다는 웃음으로 서 계셨다. 친구들을 비롯한 남학생들은 순식간에 사라진 후에도 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께 걸렸다는 것보다는 "순옥"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얼굴이 홧홧해졌기 때문이었다.
다음날로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희경이가 아닌 순옥으로. 그 후로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는 순옥이라는 이름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이름 때문에 내 모습이. 내 삶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 이름도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이름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 사람 나고 이름난다는 엄마 말씀이 옳다는 것도. 언제 어디서라도 누군가 내 이름을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답을 한다. 순옥이라고.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