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종종 나야말로 정신과에 한 번 가봐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곳저곳에서 주워 들은 것들을 어설프게 종합해서 몇 가지 병명도 한 번씩 들이대 보는데, 가끔은 우울증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사회불안장애 같기도 하다. 다른 이들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증상의 경미함과 비용에 대한 걱정도 무시할 수 없지만 또 하나는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 없이 약을 처방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것대로 내키지 않고, 긴 상담을 하자니 그 또한 곤란하게 느껴진다. 이건 뭐 어쩌자는 건지, 내가 생각해도 답이 없다.
낯선 이에게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상대는 이런 일에 관한 전문가일 것이 분명하나 나는 생각만 해도 불편하다. 혹시 지루하지 않을까, 뻔하고 뻔한 케이스라고 여겨 하품이 나오진 않을까. 나란 사람은 상담사의 동작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뻔하니 그 피곤한 일을 돈까지 내가며 해야 하나 싶다.
아주 보통의 인간, 상담사 박티팔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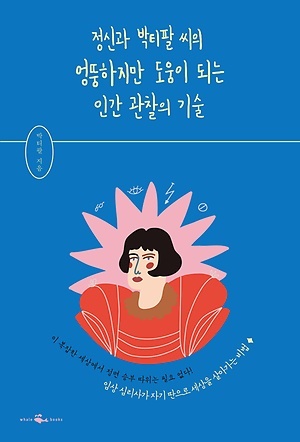
|
| ▲ <정신과 박티팔 씨의 엉뚱하지만 도움이 되는 인간 관찰의 기술> 책표지 |
| ⓒ 웨일북 | 관련사진보기 |
이러니 상담실 풍경을 들을 때마다 귀가 솔깃해지지만 내 발길은 좀처럼 그리로 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읽은 <정신과 박티팔 씨의 엉뚱하지만 도움이 되는 인간 관찰의 기술>은 어찌나 반가운지, 내 마음 속 병원 문턱을 한뼘 이상 낮춘다. 저자 말마따나 '웃픈' 글이 모여 있으니 읽는 내내 웃다가 울다가 한바탕 난리를 쳤다.
책은 정신과 임상 심리사가 썼다. 하지만 치료 사례를 늘어놓는 책이 아니며, 저자 역시 내담자이기도 했다. 스스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한때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 오늘도 좌충우돌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어디쯤에서였을까. 상담에 대한 내 경계심은 저만치 물러가 있었다.
자칫 욕처럼 들리는 티팔은 정신 분열형 성격 장애(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에서 따온 정신과 은어라고 한다. 스스로의 필명으로 병명을 택했다니 프롤로그부터 웃프다. 그러고 보면 작가 소개부터 그렇다. 상담이 업인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언어의 대화가 잘 되지 않아 몸의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러다 세 자녀를 두게 됐단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책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다.
저자의 일상은 이렇다. 어린 딸과 싸우다 삐져 절교선언을 하고 3일째 말을 안 하는 것은 기본. 엄숙한 학회에 참석해 때아닌 울음에 이어 웃음까지 터뜨리지 않나. 편의점 컵피자가 맛있다는 이유로 수업도 제낀다. 공포를 치료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본인은 비행기 공포증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담사 역시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양념이라면 내 마음을 녹인 주재료는 따로 있다. 저자는 자신이 인간을 관찰해야만 겨우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성 부족한 사람이라고 낮춰 말하지만, 내겐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했다. 상담의 기본 자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자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열 마디 공허한 공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마음이 더 진실하게 다가왔다.
인간관계라는 건 누구에게나 불가해하다
큰사진보기

|
| ▲ 이런 존재가 상담사라면, 내 이야기를 해도 될 것만 같다. |
| ⓒ pixabay | 관련사진보기 |
또한 저자는 호기심을 갖고 환자를 기다린다. 그럭저럭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내담자들을 대할 때마다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며, 심리 평가 보고서에는 관심과 공감, 위로가 들어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이런 존재가 상담사라면, 내 이야기를 해도 될 것만 같다.
심리를 전공하고 상담을 업으로 삼는다고 해서 인간과 관계맺음에 관한 도사들만 모여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 업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인간과 관계란 것이 워낙 불가해한 것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내 안에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란 존재가 그 앞에서 너무도 쉽게 발가벗겨지는 것은 아닐까', '내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인데 어쩌면 너무 뻔한 공식들로 이뤄져 코웃음이 쳐지는 것은 아닐까' 등등. 한마디로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 책 덕분에, 어느 머리 아픈 날 기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늘어난 듯하다. 이 느낌 퍽 든든해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평소에는 딱 잘라 올바른 소리만 해 대던 정신과 상담가가 사실은 당신과 별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게 당신에게 위로의 한 방식이 되었으면 한다."(6쪽)
저자의 집필 목적은 충실하게 성공했다고 감히 말해 본다. 네 명의 골수팬의 응원 덕분에 이 책이 나왔다고 하니 나는 이 자리에서 또 한 명의 열혈 팬이 추가됐음을 소리 높여 외쳐 본다. 2권의 출간을 간절히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