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 주민등록증에 새겨져 있는 엄마 이름이다. 곧을 정(貞)에 잠잘 숙(宿) 자다. '정' 자는 정절, 정조 할 때 그 '정' 자다. '숙' 자는 여인숙, 숙박이란 단어에 쓰인다. 여자는 정절을 지키며 잠 자듯이 고요히 살아야 한다고 지어진 이름이다.
하지만 엄마는 조용히 살지 않았다.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랐다. 많은 노래 장르 중 성악을 제일 잘 불렀다. 노래를 잘해서 학창시절 별명이 모차르트였다고 한다. 모차르트는 작곡가이긴 하지만, 당시 엄마 친구들에게 클래식의 대명사는 모차르트였나보다.
노래하는 모차르트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학에 갔다. 여자가 대학에 가는 게 드문 시절이었다. 엄마는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음대 교수였던 성가대 지휘자가 엄마의 재능을 알아보고선 엄마에게 성악과에 한번 진학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엄마는 혼자 원서 쓰고 실기 시험 봐서 단번에 합격했다.
대학 생활은 길지 않았다. 엄마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었고, 일해서 돈 벌어 아버지 치료비에 보태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엄마는 2학년 1학기까지 공부하고 자퇴당했다. 엄마의 오빠들은 대학에 대학원도 마치고 교수까지 됐다. 엄마가 대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외할머니는 "너 대학 못 다니게 한 게 제일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선 몇 달 전 돌아가셨다.
엄마는 노래 그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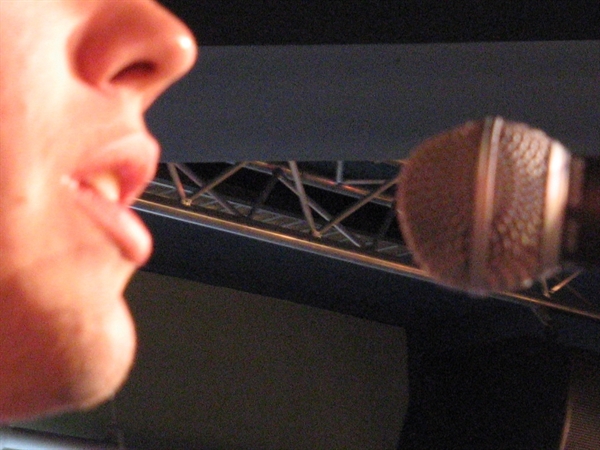
▲ 엄마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랐다. ⓒ freeimages
엄마는 내게 항상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빨래를 널면서도, 밥상을 차리면서도, 돼지 농장의 돼지들에게 사료를 퍼주면서도 노래했다. 들어도 잘 모르는 가곡들, 찬송가들을 늘 불렀다. 어린이 날에는 동요를 부르기도 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따라다니는 가난 때문에 단칸방으로 이사갈 때도 이탈리아 가곡 선집 LP판들은 꼭 가지고 다녔다.
엄마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처음 반한 것은 중학생 때다. 우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엄마와 나는 밤마다 종이를 주워 판 돈으로 쌀도 사고 소풍비도 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도로, 종이를 실은 1톤 트럭을 타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열대야였지만 중고로 산 1톤 트럭에는 에어콘이 나오지 않았다. 창문을 활짝 열고 달려야 했다.
귀가 심심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웅장한 노래가 나왔다. 처음엔 애국가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멜로디 선율은 이내 감미로운 기타와 피아노 반주로 바뀌었다. 구슬프면서도 힘 있고 단단한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태어나 처음 듣는 노래였다.
엄마는 이 노래의 제목이 '여러분'이고 노래 부른 사람 이름이 '윤복희'라고 했다. 이 노래는 원래 찬송가라고도 했다. 그러더니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왼손을 창틀에 걸치고, 오른손으로 운전하면서,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노래하던 엄마의 모습. 중고 1톤 트럭의 모터 소리가 엄마의 노래 소리에 묻혀 버렸다.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과 가로수는 함성을 보내는 관객 같았다.
여자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찬란하게 노래하는 정숙, 징그러운 가난 속에서 생계부양자로 살면서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정숙. 내 눈에 비친 정숙은 노래 그 자체였다.
요즘은 엄마가 제일 멋있다

▲ 엄마는 노래 그 자체였다. ⓒ freeimages
현재 엄마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지역 여성 합창단에만 네 군데에 가입해 노래하고 있다. 소프라노 자리를 빼앗기면 며칠씩 분해 하며 잠 못 자기도 한다. 지역 음대 교수를 찾아가 레슨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제는 다 커서 돈을 버는 내가 레슨비를 보태드렸다.
모녀 사이의 사랑과 전쟁을 말할 것 같으면야, 이 지면을 꼬박 채워도 모자란다. 엄마를 너무 미워하기도 했었다. 엄마 역시 "저 년을 내 배 아파 낳았나" 하는 말도 숱하게 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엄마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엄마에게 연대하고 싶단 마음이 생겼다. 오 남매의 막내로, 보수적인 경상도 집안의 맏며느리로, 가난해도 자식 안 굶긴 가장으로 살아온 모든 세월 중에도 언제나 노래하고 살았던 엄마에게.
사실은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든다. 나이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나의 일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 열심히 돈 벌면서 내가 '나'이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 엄마처럼. 요즘은 엄마가 제일 멋있다. 나이트 근무 끝나고 집에 와서 김치 담그고, 악보 분석하고, 노래 연습하고, 유튜브로 노래 강의 듣는다.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엄마는 몇 해 전부터 이름을 바꿨다. 바뀐 이름은 '정민'이다. 법적으로 개명한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불리고 싶은 이름을 새로 지었다. '숙' 자 대신 내 이름 중간의 '민' 자를 넣었다. '잠잘 숙'자가 너무 싫었다고 한다. '정민'의 한자 뜻을 내가 새로 지어줬다. 맑을 정(晶)에 옥돌 민(珉)이다.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정민은 최근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올려 달라고 했다. 알겠다고, 언제든지 보내라고 했는데 막상 올리려니 영 용기가 안 나시는 모양이다. 꼭 누구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시절 기록으로 남기자고 해도 쑥스러우신가 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너무 하고 싶지만 누가 판 깔아주기 전까지는 망설이는 사람의 머뭇거림을. 정민은 딱 그 상태다. 차근히, 잊을 만하면 노래 부르는 거 언제 찍을 거냐고 물어보고 있다. 새해에는 정민이 부르는 '여러분'을 많은 사람과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