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결국 휴원을 했다. 올해 초에 이어 두 번째 휴원이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나와 집에 있어야 하고, 그건 곧 나의 개인적인 일과는 거의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초에 이미 혹독한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이번에 또 그런 '대환장 파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기 위해선 내 개인적인 일들은 깨끗이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다.
비록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쓰기로 마음먹었던 서평은 두 달 가까이 한 편도 쓰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 생각은 당분간 눈 딱 감고 접어 두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중간중간 생기는 한두 시간의 자투리 시간이 덤으로 얻은 시간처럼 여겨져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기도 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필사하기도 한다. 며칠 전에는 온라인 서점 신간 목록을 살펴보다가 표지와 제목에 반해 충동적으로 책을 한 권 구입했다. 표지에는 나른한 여름의 향기가 느껴질 것만 같은 초록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여인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디스 워튼의 소설 <여름>의 표지에 실린 그림은 '여름을 사랑한 화가', 프랭크 웨스턴 벤슨이 1887년에 그린 <여름(In summer)>이라는 작품이다. 표지 그림과 소설의 분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책장에 꽂아두기가 아쉬워 표지가 보이도록 세워 두고 오며 가며 한참을 바라보았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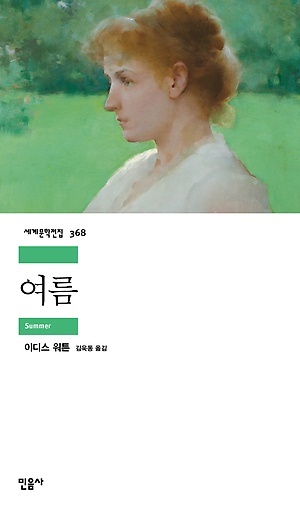
|
| ▲ <여름>, 이디스 워튼 지음, 김욱동 옮김, 민음사(2020) |
| ⓒ 민음사 | 관련사진보기 |
그림을 보고 있자니 잊고 있었던 6월의 풍경들이 떠오른다. 50여 일간의 장마,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여름을 견디느라 반짝이던 초여름의 기억은 아득하기만 하다. 소설 속 황홀한 여름의 풍경을 담은 문장들을 읽으며 짧아서 더 애틋했던 초여름을 떠올려본다.
채리티는 아직 모르는 게 많은 데다 감각이 무뎠는데, 그런 사실도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빛이며 공기, 향기, 빛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몸속에 흐르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손바닥에 투박스럽게 느껴지는 산자락의 마른 풀이며 얼굴을 짓누르는 백리향 냄새, 머리카락과 면 블라우스 속을 스쳐 가는 바람, 솔송나무가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좋아했다. (21쪽)
무료한 작은 시골마을 '노스도머'에서 채리티는 자신의 후견인인 로열 변호사와 함께 살고 있다. 채리티는 마을에 하나뿐인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 앞에 다른 도시에서 온 낯선 남자 '루시어스 하니'가 나타난다. 건축을 공부하는 '하니'는 자료를 찾기 위해 채리티가 사서로 있는 도서관에 찾아오게 되고, 사소한 오해들로 티격태격하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둘은 걷잡을 수없이 사랑에 빠져 있었다……
벌써 눈치챘겠지만 <여름>은 전형적인 연애소설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물론 막장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요소들도 두루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에는 뻔한 이야기를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 섬세하고 아름다운 묘사가 바로 그것이다.
소설에서 풍경은 주인공 채리티의 심리상태에 따라 다른 빛깔을 띤다. 단조롭고 희미하던 풍경이 '하니'가 나타난 후에는 풍경에 색이 더해지고 '꽃받침이 터질 듯' 타오르며 짜릿하고 강렬한 향기를 내뿜는다. 둘 사이의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그들을 둘러싼 여름의 향기도 짙어진다. 그들의 뜨거운 여름은 채리티와 하니가 호숫가에서 함께 불꽃놀이를 보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때 공중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푸른 저녁 하늘에서 은빛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다른 방향에서는 나무 사이로 희미한 로마 폭죽이 하나씩 솟아올랐고, 머리카락처럼 산발한 불꽃이 불길한 징조처럼 지평선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런 간헐적인 섬광들 사이사이에 벨벳 장식 같은 어둠이 내렸고, 월식처럼 어둠이 깔리는 동안 군중의 목소리가 삼키는 듯한 속삭임으로 가라앉았다. (136~137쪽)
소설에서 제일 아름답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한 이 불꽃놀이 장면을 읽는 동안 내 가슴에서도 불꽃이 팡팡 터지는 듯했다. 옆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블록놀이를 하는 동안 나는 혼자서 황홀경에 빠져 가슴 졸이며 <여름>을 읽고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지! 이게 바로 소설의 맛이지!' 소설은 지친 독박 육아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꿀같이 달콤한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여름>은 이디스 워튼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소설로 평가받으며, 이 소설과 짝을 이루는 <이선 프롬>과 함께 '지금 미국 문학사의 고전 반열'에 올라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 워튼은 '어느 작품보다도 이 작품을 쓰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고백하며, <여름>을 자신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디스 워튼의 <여름>을 읽으면서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 아주 잠깐 떠오르기도 했지만 <보바리 부인> 속 '엠마'보다 <여름>의 '채리티'가 나는 훨씬 좋다. 대책 없이 허우적대며 몰락하는 '엠마'와 달리 '채리티'는 세상에 달관한 듯하면서도 당돌하고, 씩씩하다. 결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1917년의 그녀로서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찾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워튼은 "삶이란 죽음 다음으로 가장 슬픈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삶이란 슬픈 것이지만 그럼에도 삶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음보다는 낫다. 삶을 견디게 해주는 '사랑' 이야기를 읽는 동안 나 역시 지치고 힘든 날들을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다. 아직 견뎌야 할 날들은 남아 있고 나에게는 더 많은 '사랑 이야기'가 필요하다.
한참 여름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밖에서 매미 소리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어느 해보다 유난스러웠던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으려니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글을 마치며 이만 여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온몸의 감각을 열어젖혀 새로운 계절의 향기를 음미해보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