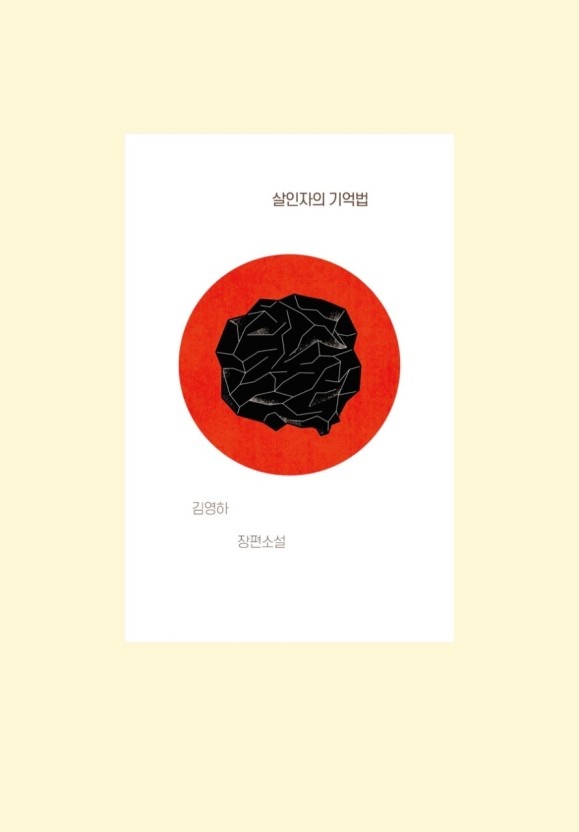
▲ 김영하 저 <살인자의 기억법> ⓒ 복복서가
독서의 장점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타인의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흥미로웠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의 화자는 '살인자'다. 사회 부적응자 혹은 사회의 악…… 이러한 모든 부정적 수식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살인자의 시선에서 본 세상은 어떨까. 독자는 그 궁금증을 시작으로 이 책을 읽어내려 간다.
살인자의 일기 혹은 기록
주인공 김범수는 젊은 시절 수의사로 일하다 퇴직 후 시골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70세 노인이다. 45세부터 25년 동안 살인 없이 살았다. 마지막 살인 대상은 그가 지금 키우는 딸 '은희'의 친모다. 우리 딸만은 살려달라는 은희 엄마의 마지막 부탁에 따라 은희를 입양해 지금까지 키웠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 살인범,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주태를 보곤 직감적으로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다. 얼핏 보면 사냥꾼의 차 같은 지프 트렁크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 살인범은 살인범을 알아봤다. 그런데 그 녀석이 딸 은희의 남자친구로 나타났다. 그때부터 그의 마지막 목표는 은희를 노리는 연쇄살인범인 그놈을 죽이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달리 머리는 자꾸만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었다. 어딘가로 가고자 나왔는데 어디로 가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점심을 먹은 사실도 잊어 개수대엔 그릇이 두 개가 쌓인다. 이러다 박주태의 존재도 금세 잊어버릴까 그는 모든 일을 메모하고 녹음하기 시작한다. 어제의 모습조차 그에겐 기억하기 힘든 일이다.
모든 불행의 시작점
책 속에선 그의 첫 살인에 대한 기억을 보여준다. 열여섯, 술만 먹으면 엄마와 여동생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인 것이 살인의 시작이었다. 개인적으로 '불우한 과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투의 흐름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며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살인범인 화자가 독자들에게 그게 최선이었다고 설득하는 것 같았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할 의지를 갖고 있기에 인간이다. 심지어 아버지를 죽였을 때는 이유가 있었지만, 이후 살인들은 이유가 없고 충동적이었다. 살인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로 변해갔던 것이다. 그의 손에 죽어간 이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다. 치매에 걸린 인간은 벽이 좁혀지는 감옥에 갇힌 죄수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숨이 막힌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 70대 노인, 그에게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은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글을 본 적이 있다.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이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시체를 토막 내고 있는 중에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라고, 그들에게도 부성애라는 게 남아있는 것일까.
자신의 딸을 노리는 박주태를 제 손으로 죽이리라는 목표가 생기자 이상하게도 밥도 잘 넘어가고 몸도 가볍다. 화자는 이게 은희를 위한 일인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이제 헷갈린다 한다. 그를 미행하고 그의 행동반경을 파악한 뒤 25년 전 그때처럼 살인의 계획을 세운다. 모든 것은 그놈에 대한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 끝내야 한다.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금전적 여유에서 행복을 찾고, 또 누군가는 자아실현을 통한 성취감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나'가 말하는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다르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날마다 살인을 생각하고 그것을 도모하던 때 아니었을까. 그때 나는 바짝 조인 현처럼 팽팽했다."
살인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나'의 말은 일반인의 상식으론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듯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세상은 익숙치 않은 새로운 곳이며,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김영하표 문장들은 독자들을 '나'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살인자의 기억법>이 특별한 이유는 독자들은 믿을 수 없는 화자의 말에 의존해 이야기를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나였을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말을 중간중간 반복하며 자신의 기억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와 흡입력 있는 문장 구성력이 돋보였던 소설이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