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09년 11월 1일 자 <황성신문>에 실린 끽다점
ⓒ 황성신문
백 년 전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업소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일본식 끽다점, 유럽식 카페와 살롱, 우리식 다방, 다실, 다원, 다점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명칭에 따른 차이가 엄격했던 것은 아니다. 업소 명칭을 보고는 어떤 곳인지 구분할 수는 없었다. 명칭과 상관없이, 시대에 따라 커피라는 음료를 파는 방식이 변해 왔다. 커피 소비 방식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었다.
근대 초기에 커피를 파는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다. 서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 첫 번째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의 라틴어권과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한 방식이었다. 음식점에서 커피를 팔았다. 커피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음식을 파는 곳에서 디저트의 하나로 커피를 팔았다.
두 번째는 미국 방식이었다. 태번(Tavern), 펍(Pub), 바(Bar) 등 술을 파는 곳에서 커피를 팔았다. 커피도 음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생긴 문화였다. 오랫동안 미국 문화에서 커피는 집에서 마시든지 일터에서 마시는 것이지 그 밖의 공간에서 마시는 음료는 아니었다. 술집에서 사이드메뉴에 올리는 것이 커피였다.
세 번째는 독일식이었다. 베이커리에서 커피를 파는 문화다. 독일에서 커피는 베이커리에서 빵과 함께 파는 음료였다. 따라서 빵을 파는 베이커리 출입이 많았던 여성들이 커피 소비를 주도한 것이 독일 지역 커피 문화의 특징이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온 초기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커피는 이런 세 가지 문화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유행하였다. 처음에 들어온 것은 베이커리 카페였다. 독일의 영향이었다. 1890년대 후반 정동에 독일인 골샤키가 세웠던 카페나 1900년 조선인 윤용주가 홍릉역에 열었던 업소는 베이커리카페였다. 빵과 함께 커피를 팔았다. 기록에서 전하는 가장 오래된 커피 판매 업소들이었다.
두 번째는 음식과 함께 커피를 파는 끽다점과 카페였다. 1910년 전후에 등장하였고, 이후 1920년대 중반까지 번창하였다. 유럽에서 유행하던 방식이었다. 끽다점은 1909년 남대문역에 처음 등장하였고, '카페'라는 업소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1년 남대문로에 생긴 '카페타이거'였다.
카페라는 명칭이 우리나라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14년 6월 7일 자 <매일신보>였다. 기사 제목은 '탑동카페-'였는데 기사 내용에는 카페-파고다, 탑다원, 끽다점, 다점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커피를 취급하는 업소에 통일된 명칭이 없던 시절을 잘 보여주는 기사였다.
탑동카페-는 탑동공원, 현재의 탑골공원(옛 파고다공원)에 새로 문을 열게 된 카페였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인 6월 8일 문을 여는 신장개업 카페를 소개하는 광고성 기사였다. 남대문역 끽다점이나 탑동카페 모두 취급하는 음식은 서양식이었다. 샌드위치와 스테이크 종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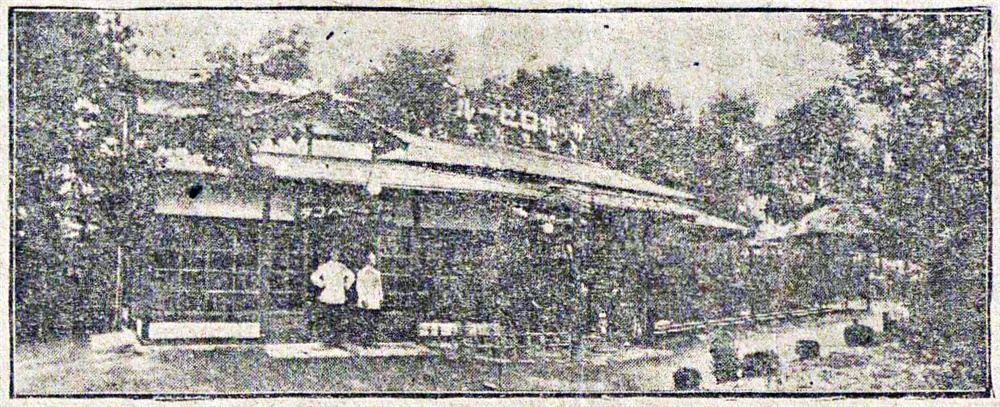
▲ 1914년 6월 7일 자 <매일신보>에 실린 '탑동카페' ⓒ 매일신보
악카페의 등장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며 미국식 커피 문화가 들어왔다. 미국에서는 1919년 초에 내려진 금주령으로 공개적인 술 제조나 거래가 막히자 마피아가 주도하는 술 밀조, 밀매, 밀수입이 극성을 부리던 시대였다. 국가에 내야 할 술 세금을 마피아에 내는 꼴이었다. 술이 금지되자 커피와 콜라 소비가 폭발하였다. 커피를 마시며 재즈 음악을 즐기는 문화가 유행하였다.
미국에서는 금주법으로 술 문화가 지하로 숨었지만, 조선 땅에서는 서양식 술 문화가 오히려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광란의 시대, 1920년대가 조선에 도래하였다. 카페에서 음식보다는 술을 열심히 팔았고, 이야기 나누는 소리보다는 재즈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였다. 커피는 부수적인 음료가 되었다.
문제는 술을 팔기 위해 여자 종업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여뽀이로 부르다가, 차차 여급을 거쳐 웨이트리스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급여를 받기보다는 고객이 주는 팁으로 생활을 하였다. 팁을 받으려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카페는 점차 퇴폐의 길로 접어들었다. 결국 신문에 악(惡)카페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악카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했다. 술, 커피, 음악, 잡지 등은 기본이었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광학적으로 성적 도발을 유도하는 것, 당시 용어로 광학서비스였다. 홍등과 청등, 즉 현란한 빛으로 하는 서비스다. 실내조명을 가능한 한 어둡게 하여 여급과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였다.
단속 대상이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1931년 10월 17일 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본정 경찰서는 영락정에 있는 카페미쯔와에서 흐리 컴컴한 광선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주인을 호출한 후 과료 처분을 하였다.
두 번째 서비스는 일명 애로서비스였다. 1932년 1월 1일 자 <중앙일보> 신년 특집호는 한 면 전체를 "마작과 카페에 대한 비판"이란 제목의 기사로 채웠다. 문제를 제기한 이여성은 당시를 "조선 도시의 퇴폐 절정기"로 불렀다. 애로광들이 카페 문 앞에서 행렬을 짓고 있는 모습을 예로 들었다.
그는 카페가 조선을 애로와 알콜로서 죽이려는 독살범이라고 표현하며 묵인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물었다. 각계 대표들이 찬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카페를 근절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경제공황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에로티시즘을 성행시킨 것이기에 퇴치는 어렵다는 주장도 발표되었다.
겉은 번쩍번쩍하였지만 속은 썩은 사회
<매일신보>는 1932년 1월 7일 자에서 당시 카페를 "애로 백퍼-센트의 요염한 웨트레쓰"가 있는 곳으로 묘사할 정도였다. 물론 이런 풍기 문란은 서울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부산일보> 1932년 2월 5일 자에는 "카페의 애로"라는 제목 아래 대구경찰서의 문란한 카페 단속 기사를 다루었고, 3월 9일 자에는 부산 시내 "카페의 애로화"를, 3월 11일에는 상주의 "카페 만원 성황"을, 6월 16일에는 "카페만 느는 군산"을, 10월 10일에는 "마산 카페 적옥 호평" 등을 연이어 다루었다.
카페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인지, 이를 빙자하여 카페 출입을 부추기는 기사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언론이 시대에 영합하였을 뿐 시대를 이끌지는 않았다. 요즘과 다르지 않았다. 애로서비스 다음에 제공되는 것은 이른바 정조서비스, 매춘이었다.
경찰이나 당국이 늘어나는 카페에서의 이런 문란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큰소리는 쳤지만, 실제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철도국에서 운영하던 경성역 2층에는 부인 대합실이 있었다. 5년 정도 운영해 오던 대합실을 없애고 끽다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1931년 11월 20일이었다.
철도국 발표에 따르면 적자 보충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끽다점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철도국은 왜 늘 적자인지는 모를 일이다. 관에서 주도하는 끽다점이기에 다른 카페나 바처럼 여급을 두거나 음악을 써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공사에 착수하였다.
반년이 지난 1932년 6월 1일에 완공하여, 끽다점 개업을 하였다. 그런데 그 요란하던 각오와는 달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웨이트리스도 미인으로 4인을 두어 피곤한 여객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라는 광고와 함께 문을 열었다. 철도국의 광고인지, 경성역 주변 조폭 집단의 광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한 일간 신문의 표현대로 1930년대 초반 경성은 "카페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였다. 100여 개의 카페에, 1000여 명의 웨이트리스, 청등홍등의 으슥한 불빛과 함께 흘러나오는 "환락의 짜스"는 밤의 경성을 더욱 음탕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다.
권력도 동참하였고, 언론도 함께 춤을 췄다. 1880년대 미국 사회를 보며 마크 트웨인이 말했던 "도금사회"였다. 겉은 문제없는 듯 번쩍번쩍하였지만 속은 썩은 사회였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유튜브 '커피히스토리' 운영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