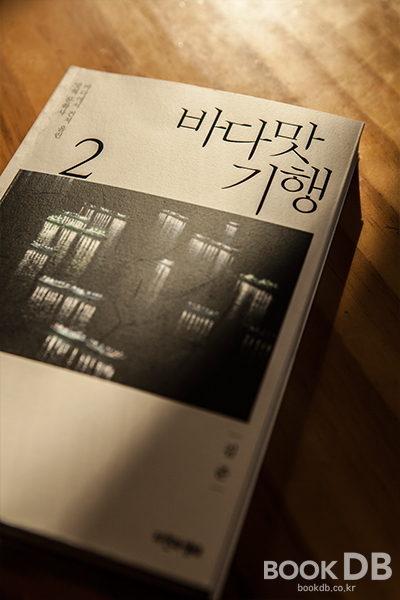▲김준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동석
"먹방 열풍에 사람들 몰려 어촌 '싹쓸이'... 방송 역할 유감" - 대하의 천연 서식지에서 양식장으로 바뀐 천수만의 웃지 못할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밥상에서 맛보기 힘들어지는 바다맛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바다에서 그런 천연의 맛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어부들 만나면 늘 '옛날에는 여기서 조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서해에서 조기가 없어지고 동해에서 명태가 없어졌듯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남획이죠. 많이 잡는 것도 문제고, 다 크기 전에 잡는 것도 문제고, 산란 시기에 잡는 것도 문제고.
1차적인 책임은 어부들에게 있지만, 소비자들도 무관치 않죠. 맥주 마실 때 노가리 좋아하잖아요. 4~5년 커서 명태가 돼야 하는데 어린 노가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명태가 없어진 것을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으로만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늦가을~초겨울) 한창 주꾸미 낚시 철이에요. 낚싯배가 정말 많은데, 어부들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전부 도시에서 온 낚시꾼들이에요. 어부들한테는 그나마 산란기 조업 금지라든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낚시꾼들은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서식환경이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갯벌은 점점 사라지죠, 바다는 오염되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자꾸 떠나야 되잖아요. 어민들이 사는 가까운 바다에 고기들이 있어야 그게 쉽게 밥상으로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먼바다로 가야 하는 거죠.
먼바다로 간다는 것은 어부들보다는 기업적인 선단이 많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어부들은 그냥 '피고용인'이 되는 거고, 어촌의 커뮤니티와 문화는 사라지고 그냥 수산업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에게 바다가 줬던 가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잡은 갈치가 대형마트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방렴 멸치를 잡아먹으려고 올라오던 갈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치를 잡기 위한 어구나, 고기 잡는 소리, 풍어제 전통 같은 것들이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박제화 돼서 국립극장 공연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밥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가 같이 사라지는 거죠."
- 밥상이 아니라 문화가 사라지는 거라는 말씀이 참 무섭게 와닿습니다."요즘 '먹방' 열풍을 보면서도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방송이 우리 밥상을 지키려는 노력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은 파급력이 엄청나잖아요. '만재도' 편을 봤는데, 그렇게 한번 방송에 나오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홍합 다 따고 통발 던져서 다 체험하려고 하고,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어부들이 아니면 도구를 가지고 어업을 할 수 없어요.
낚시꾼들이 낚시가 안 되면 홍합을 다 따가지고 가버려요. 그거 다 주인이 있거든요. 바다에도, 어민들끼리 정한 구역이 있어요. 다 방송을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막이나 멘트로, 원래 이곳은 어민들만 고기를 잡는 곳인데 방송을 위해 고기를 잡았다든지, 체험을 하고 싶으면 어촌계에 문의해 허가된 지역에서만 해야 한다든지, 시청자한테 알려줘야죠. 그러면 방송의 공정성에도 좋고 어민들한테도 좋을 것 아니에요."
- 선생님처럼 맛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대개는 '맛집 블로거' 수준이 되고 마는 게 현실입니다. 맛 기행과 맛 기록을 제대로 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맛은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벌교 여자만에 장도라는 섬이 있어요. 뻘배 타고 꼬막 잡아서 사는 섬이에요. 뻘밭에서 뻘배를 타보지 않으면 그 맛을 이해하지 못해요. 꼬막을 캐기 위해서 찬 갯바람 소리를 듣는 과정도 있어야죠. 벌교 시장에 가면, 꼬막을 삶아서 상차림 해주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꼬막에 밥 비벼서 막걸리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갯바람 소리도 듣고, 뻘에도 빠져보고, 시장 할머니들이 좌판을 벌려놓고 파는 것도 보고 나서 혀로 느껴야 맛을 알 수 있는 거죠.
차별화된 기록을 하기를 원한다면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죠. 어떤 방식으로든 오감을 통해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우리는 음식 소리라고 하면 음식을 씹는 소리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동안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도 있어요. 적절한 민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바지락을 얻기가 어려워요. 농산물만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 생물들도 비를 기다려요. 그런 생물들은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할 것 아니에요. 음식에 비도 바람도 우주도 들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하는 문제예요."
- 인터뷰를 끝내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다가, 섬이 좋으십니까?"1992년부터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섬 답사를 시작했고 2000년에 학위를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섬사람들을 귀찮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죠. 만약 제가 자연과학을 했다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식으로 되돌려줬을 텐데, 저처럼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은 귀찮기는 한없이 귀찮게 하면서 그 사람들 삶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해왔잖아요. 삶의 이야기 속에 환경에 대한 철학이 있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지혜들이 있어요. '오래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섬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여행이라면 여행이고 공부라면 공부가 된 거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도움, 소비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다가 나중에는 내가 빠져든 거예요. 몇 차례 간 곳들을 다시 가도 지겹지 않은 게, 늘 바뀌어 있거든요. 그 삶의 이야기가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겠어요? 갈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바닷가에 가면 꼭 그곳에서 생선을 사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족한다면 계속 직거래를 하면 좋죠. 그게 <바다맛 기행>을 쓴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게 우리 바다와 어촌을 지키고 섬의 문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밥상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다를 지키는 것은 소비자들의 밥상에서 시작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