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거리
달그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 우리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던 우리의 문화 유산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킨 유홍준 교수의 말씀입니다. 학창 시절 수학여행에서 우리가 지나치던 불국사의 돌층계 하나도 거기에 얽힌 '사연'을 읽고 보면 달라 보였지요.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를 읽다 보면 그저 돌탑 하나, 그저 도자기 하나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다른 식물들을 돌보는 사랑의 마음은 유홍준 교수가 말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이 하나로 겹쳐지듯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던가요? 결혼식 주례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가 된 두 사람은 하고. 그런데 그 '하나'가 문제예요. '하나'여야 한다는 '사랑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와 내가 사랑하는데 다르냐고 물음표들이 난무합니다.
심리학이 학문으로 정립된 지 100여 년, 프로이트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인간 심리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결 방법을 제시해왔지만, 그 '심리적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건 결국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를 괴롭혀왔던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애초에 '다르다'고요. 한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저마다 다른데,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의 세계가, 백 사람에게는 백 사람의 세계가 있겠지요. 애초에 다르니 당연히 관계가 내 맘대로 될 리가 없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다름'이 겹쳐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가 내가 아니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적당한 거리'는 바로 그 '다름'이 보일 때까지 물러섬입니다. 그 다름을 보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러서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다가서고 함께 하고 원이 겹쳐지듯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는 정 반대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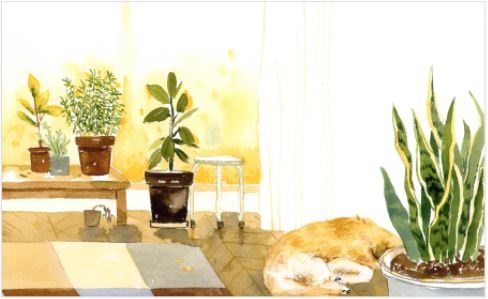
▲적당한 거리
달그림
102세를 맞이하신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해법도 <적당한 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같습니다. 100년을 넘게 사셨으니 당부하실 말씀도 많으실 듯한데 외려 노철학자의 당부는 명쾌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첫 번 째 조건은 바로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아이에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선택의 자유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삶을 헤쳐갈 마음의 근육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노철학자의 '자유'는 '적당한 거리'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의 세계를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곧 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아이의 걸음은 어른의 행보와 다릅니다. 보폭도 다른 데다 아이의 눈에 세상은 어찌 그리 볼 것이 많은 지 종종 걸음을 멈춰섭니다. 갈 길은 바쁜데 말이지요.
그래도 아이의 손을 잡고 갈 즈음이라면 번쩍 들어안고 걸음을 재촉할 수라도 있지요. 더 자라서 마음의 손을 잡고 가는 여정은 난감합니다. 먼저 살아봤다고 갈 길이 뻔히 보이는데 아이는 '갈 지'자를 합니다. 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고지가 저긴데 말이죠. 내 마음은 벌써 저곳에 가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달려가는 내 마음과 싸우는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쳇말로 '속 터지죠'.
어디 아이를 키우는 것뿐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랑이 늘 '적당한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몰라 헤메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의 간이라면 맛이라도 보며 '적당함'을 찾기라도 하죠. 작가 소개가 나오고 책이 끝났나 싶은데 다시 한 장을 넘기면 '나의 무지와 무심함으로 말라간 식물들에게'라고 덧붙여진 에필로그가 읽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이 에필로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사랑으로 인한 시행착오'의 연속일지도 모르겠다는 뒤늦은 깨달음 때문입니다.
▲적당한 거리
달그림
그런데 말이죠. 기꺼이 너를 알기 위해 한 발자국 물러서는 거, 그거 사랑하니까 하는 일입니다. 내 무지와 무심함으로 사랑을 말라 죽게 하고 싶지 않아 한 발자국 물러서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식물들을 그 '다름'을 살펴보며 키우듯 서두르지 않고 예단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것, 그 '속 터지는' 일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너의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봐 주는 거 마치 너에게 방점이 찍히는 거 같지만, 결국 그건 내 사랑입니다. 싱그러운 화분의 식물들처럼 싱그럽게 피어나는 관계를 위해 기꺼이 한 발자국 물러서는 '적당함', 당신의 사랑는 어떠신가요?
적당한 거리
전소영 지음,
달그림, 2019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식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단 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