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꼭꼭 메워진 삶을 위한 작은 틈은 어디에 있을까. ⓒ 양지혜
꼭꼭 메워진 삶에서 '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조금은 여유이고 적당히 벌어진 간격이란 것으로 정의한다면 이젠 별 도리 없이 한동안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희망을 싹틔울 나의 '틈새'를 찾아야 했다.
더구나 15층 허공에 발 딛고 사는 곳이라 마음을 틈틈이 허허롭게 했다. 곁을 채워주는 안온함도 없고, 위아래를 잇는 온기도 없다. 그래서 한발 딛고 나서는 길은 언제나 무섬증이 먼저 온다. 더구나 풍광이 좋다 하나 내려다 보이는 까마득함의 공포와 바라다 보이는 산의 아스라한 정경은 오히려 내가 허공에 머문다는 현실을 늘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무엇보다 이전에 살던 집보다 십여 평이 좁아진 집안 탓의 협소함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편함은 새 집에 대한 부적응을 더 부채질하니 어서 마음 붙일 곳 찾는 게 가장 급선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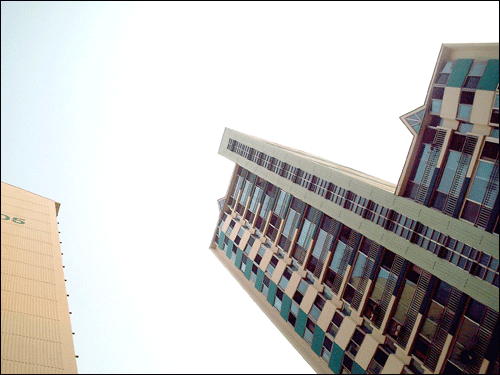
▲삭막하기만한 아파트 생활이라고 인정의 틈까지 막힌 것일까. ⓒ 양지혜
이사한 지 보름이 넘었건만 동네 구경은커녕 현관 밖조차 제대로 나가지 않았던 무심함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유난한 낯가림을 털어내야만 했다. 이래저래 불편하고 고달프더라도 내 일상을 채울 모든 것들을 이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길 찾기가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혼자서는 따로 일어 설 수도 없고, 주어진 공간과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는 한계가 나의 현실이니.
아이의 손을 잡고 동네 구경을 나서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자 엘리베이터 안의 서넛이 먼저 눈인사를 하며 말을 건넨다.
"새로 이사 오셨죠? 우리 라인은 이사가 드물어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아휴 우리 통로에서 가장 어린 애기가 되겠네. 늦둥인가 봐요."
화들짝! 얼굴이 붉어진다.
"이사 떡이라도 돌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사한다고 소란만 떨고는…. 반상회 때 뵐게요."
"그러세요. 정 붙이고 이웃사촌으로 살면 좋아요. 놀러 오세요 차 마시러. 다들 오래 산 집들이라 모두 친하답니다."
잠시지만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색함을 더는 오가는 말에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고 위아래를 이어주는 이웃이란 줄이 생겼다. 이렇게 정들면서 흉허물없는 이웃사촌이 되는 모양이다. 정이 오가는 틈새로 선뜻 들어서는 온기가 따사로웠다.

▲아이들은 가장 먼저 쉽게 벽을 허물고 틈을 열었다. ⓒ 양지혜
가장 먼저, 아이가 매일 뛰어 놀 놀이터로 향했다. 도란도란 걸어가는 언덕길이 밋밋한 평지보다 정겹다. 놀이터 벤치에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의 수만큼 옹기종기 모여 수다스럽다. 낯선 아이들과의 어울림이 어색한지 쭈뼛거리며 다가서는 내 아이에게 또래들은 희희 대며 반긴다.
천진함으로 맞아주는 아이들의 폼이 마치 오래오래 마음두고 놀았던 친구를 대하는 모양새다. 아이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마냥 친밀감을 드러낸다. 그래 맞아. 시간만이 친구 수를 말하지는 않는 거야. 저렇게 서로 마음을 풀어헤치면 훈기 넘치는 친구가 되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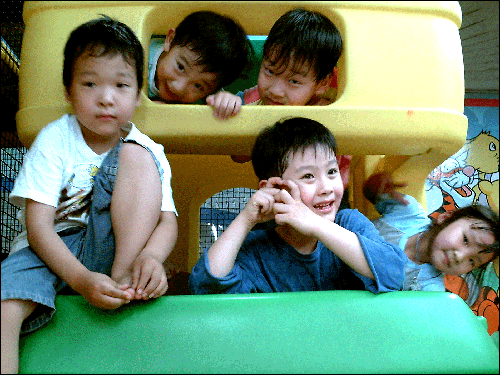
▲유치원 친구들과 새로이 시작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내게는 예쁜 희망이 싹텄다. ⓒ 양지혜
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또래집단에 대한 반감이 컸던 내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은근히 웃음 지며 서로 속닥이는 아이들 위로 여름을 가득 물들인 초록 잎이 아롱거린다. 아이를 반가이 맞아주는 틈이 열려진 기쁨이라니.
아파트 나이를 가늠하게 하는 커다란 등나무 그늘 사이로 늙고 비대해진 비둘기 두 마리가 종종걸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노닌다. 이곳은 매큼한 콘크리트 냄새를 밀어내고 사람 냄새가 더 깊이 밴 곳이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햇살이 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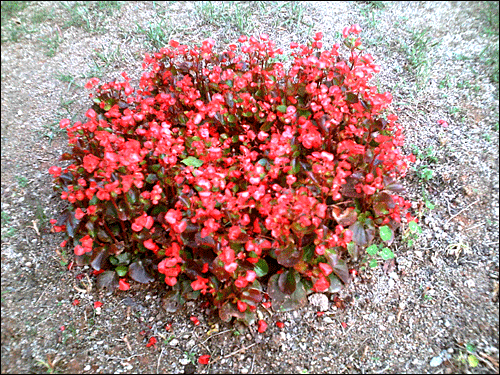
▲오가는 짧은 인사속에 '이웃사촌'의 정이 시작 되었다. ⓒ 양지혜
아이가 다닐 유치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문 앞에서 반가이 맞아주는 선생님과 친구들 모습에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간 거쳐왔던 유치원에 대한 아픈 기억은 저 멀리 날려 버린 것일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명료한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커다랗게 붙여 놓은 유치원 교육 목표가 새삼 감동으로 다가선다. 아마도 지난날 내 아이를 맡았던 선생님에게는 내 아이의 가슴 속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보다. 마음을 열지 않고, 귀 기울여 새겨듣지 않아 알아듣지 못함을 두고 아이를 탓하다니.
선생님과 아이들의 손놀림으로 가득 채워진 유치원 곳곳에 대한 내 아이의 호기심은 식을 줄을 모른다. 그리고 새로 함께 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연신 제 소개를 해대느라 종알거린다. 다행이다. 아이의 마음에 교육을 받아들일 틈이 생겼고, 그 틈새로 다가서는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서로의 생김새를 익힐 따름이라 한번에 다 얻기는 어려웠다. 아쉬워하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섰다. 그렇게 아이를 향한 소망의 씨앗 하나가 열려진 틈새로 봉긋 싹을 틔운다.

▲내 마음의 빗장을 열때 선뜻 다가선 용서란 틈은 지난 아픔을 지워주는 지우개가 되었다. ⓒ 양지혜
골목 모퉁이를 돌기만 하면 늘 눈앞에 있던 산을 오르는 길이다. 보는 것과 그 속에 스며드는 것은 차이가 있으리라. 눈앞의 산에는 작은 절 마당과 시원한 폭포와 가끔씩 산허리에 걸려 오르지 못하는 구름을 품고 있다. 그래 다가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기쁨도 있다지. 더구나 어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어설피 무엇을 안다는 것은 도무지 실없는 일일 테니. 몸이 걷는 것의 불편함을 알기에 단단히 마음 다짐을 하고 눈으로만 담았던 곳을 온 몸과 마음으로 더듬어 보기로 했다.
몇 번을 아빠와 올라와 봤다며 앞장선 아이의 종알거림과 지저귀는 새소리가 어우러져 숨 죽인 듯 조용하던 초록 숲에 경쾌한 공명을 일으킨다. 촘촘한 나뭇잎 새로 쪽빛 하늘이 보이고 틈새마다 하얀 햇살이 부서진다. 잠시의 걸음에도 가쁜 숨소리가 내 귀를 어지럽히고, 입안이 말라 가는 갈증에 정신까지 아득해질 쯤 아이의 손에는 어느새 빨간 작은 바가지가 들려 있다.
"엄마. 달콤한 약숫물 드세요." 달달한 약수 맛을 아이가 알까마는 그저 목마름을 풀어주는 기쁨을 그리 느끼는 것이리라. 하지만 아이가 내미는 물은 정말 달큼했다. '아. 달다.'

▲숲 길을 걸으며 삶이 주는 '틈'이 어떤 것인지 곰곰 생각 했다. ⓒ 양지혜
장마비가 쏟아진 전날 탓으로 여름 숲은 싱그러운 향기를 뿜어내며 갈매 빛으로 번져가고 있었고 숲 가운데로 들어설 수록 온통 초록빛 바다를 이뤘다. 수런수런, 나무들의 소리가 소란하다. 순간 나는 나무가 되었고, 길섶의 들꽃이 되어 버렸다.
'그래, 가끔은 이렇게 인간의 말을 닫아 버리고 숲의 언어로만 통하며 살자.' 한달음에 내달리고픈 마음과는 달리 후둘거리는 다리를 쉬게 하려 어둑하고 넓은 바윗돌을 찾아 앉았다.
산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맛이 있었다. 발 밑에 수줍게 자신의 영토를 지켜내는 풀꽃에게 눈길이 머무르고, 아이는 "예쁜 꽃아!"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아이는 풀꽃들과 화사한 밀담을 나눈다. 어느새 우리 둘의 마음에도 숲의 초록 물이 깊게 든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자그마한 계곡으로 들어섰다. 가랑가랑 돌쟁이 코고는 소리를 내며 흐르던 계곡 물이 위로 오를수록 청년의 기침소리를 낸다. 산이 깊어지면 물도 깊어지고 여름도 깊어가나 보다. 문득 숲의 정수리로 구름 한 가닥이 달아나고, 그 틈바구니로 시원한 바람한 줄기가 불어온다. 숲이 함께 사는 이곳은 내 삶의 또 다른 '틈'이어라.

▲길섶의 이름 모를 꽃 한송이를 들여다 보는 것도 '틈'이 주는 선물이었다. ⓒ 양지혜
익숙지 않은 걸음 탓과 뉘엿 지는 햇살과 낮게 드리워진 구름이 예사롭지 않기에 나머지 오름은 다음을 기약하며 산 허리춤에서 돌아서기로 했다. 오를 때보다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몽롱한 초록빛 바다에서 빠져 나오는 길. 터벅거리는 내 발자국 소리에 흠칫 놀라서 지나 온 길을 돌아 봤다.
이리저리 흐트러진 발자국들. 그 위엔 절대로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을 듯 지독한 끈기로 달라붙은 흉측한 몰골의 내 그림자가 서 있다. 슬핏, 서러움이 밀려온다. 예까지 마음걸음 하기가 얼마나 힘겨웠는데….
살던 곳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하찮은 욕심과 절망감. 실패를 자초한 긴 시간 동안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그런 내 안의 욕망과 분노를 비우지 못해 화닥댔던 지난 시간들이 짙고 길어진 그림자를 만들었나 보다.
지난 한해, 시시때때로 다가섰던 좌절감만으로도 버거웠건만 지인들이 던져댔던 배신이란 고통. 차마 용서란 말조차 힘겨웠던 지난 일들이 한꺼번에 눈앞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하마 어쩌겠는가. 다 지난 일이고 부질없는 미련 떨어야 가슴만 더 먹먹한 것을.

▲넉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틈'이 주는 행복이었다. ⓒ 양지혜
아이의 손을 잡고 조금은 험한 샛길로 걸음을 재촉했다. 잡념을 떨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몸의 고단을 자초하는 것이라 했던가. 오를 때는 몇 번을 쉬었던 길을 한달음으로 내려섰다. 턱까지 차 오르는 가쁜 숨을 몰아쉬자 갑자기 가슴 속이 '훤'하니 뚫린다. 어울리지 않는 씻김굿 한판에 날려 버린 허망한 관념이란 이런 것일까.
올려다 본 하늘이 곧 비를 몰고 올 요량인지 검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때가 되면 질 줄 아는 진리와 비워야 채워낼 수 있다는 진실을 저무는 해는 말없이 알려준다. 순간, 내 마음에도 용서라는 작은 틈이 열렸다. 욕망의 비움과 용서에 인색했던 가슴 속을 누구에게라도 들킬세라 시치미 떼며 걸어가는 가벼워진 발걸음 뒤로 인적 끊긴 텅 빈 숲에는 그 사이 어둑한 산 그리메가 숲을 채워내고 있었다. 어둠이 더 깊어진 좁은 골목길 담장 위로 활짝 핀 능소화가 여름 저녁을 환하게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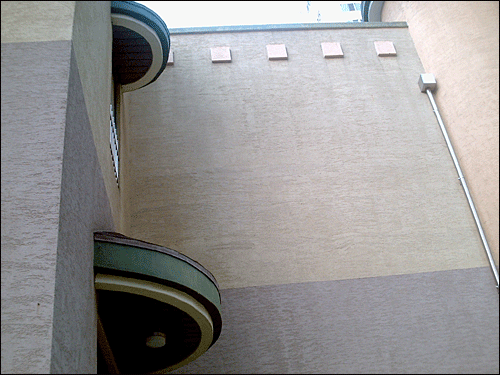
▲마주 선 벽을 넘어가는 길. 그 길에서 찾은 나의 '틈새'는 마음의 '여유'였다. ⓒ 양지혜
새로 이사 온 이곳. 도무지 마음붙일 틈이 없어 보였건만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찬찬히 들여다보니 꽃들도, 아이의 웃음도, 그리고 새로운 희망까지 싹틔우고 피어 낼 수 있는 곳곳이 있었다. 좁아진 집보다 더 넓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머물 틈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반가운 일인지.
저만치 앞섰던 아이가 구멍가게로 달려가는가 싶더니 얼음과자 한 개를 손에 들고 나온다. 내려 올 때 만난 21층 아줌마가 사줬다며 배시시 웃음을 머금는 아이의 얼굴에는 숲에서 담아 온 풀꽃 향기가 가득하다.
아. 사람 사는 곳마다 틈이 열려 있었구나. 엘리베이터 15층 번호를 누르는 사이 우르르 탄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 하세요? 저희 15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반상회 때 꼭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