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왜 여행을 떠나는가. 어떤 이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답할 것이다. <여행의 목적>의 저자 배성아·김경민은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성장·자유·사랑·실연·추억·여유 등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어디 그뿐이겠는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하나의 단어로는 개념화할 수 없는 여행들의 이유들이 있을 터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새삼 묻는 까닭은 박범신의 <그리운 내가 온다>에 가득 찬 '여백'을 메우기 위함이다. 이 책은 소설가 박범신이 터키의 여러 지방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바를 정리한 에세이집이다. 그간의 문학계 관습대로라면 이 책에는 '기행기'라는 장르명이 붙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리운 내가 온다>에 기행기가 아닌 '에세이'라는 다소 모호한 장르명이 붙은 까닭은 이 책이 지닌 표면적 한계 때문이다. 나는 그 한계를 '여백'이라 부르고 싶다.
제 머릿속엔 불멸의 꿈이 스쳐 지나갑니다.그리운 것들은 멀고 모자란 것들은 가깝습니다. 그것이 삶이겠지요.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삶은 '오랜 병'이라고요.나의 꿈들은 이미 초월에 닿고 있습니다.걸어서 별까지 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운 내가 온다>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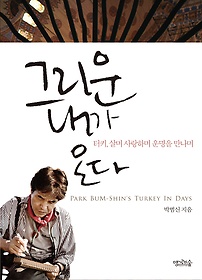
▲<그리운 내가 온다>이 책에 실린 글들은 산문으로 읽히기보다는 차라리 시로 읽힌다. 하여 이 책의 문장들은 깊은 울림을 준다. 바로 시적 행간이 주는 효과이다. ⓒ 맹그로브숲
위의 인용문을 통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그리운 내가 온다>가 에세이집'다운' 책인가 하는 점이다. 이 책의 대부분은 위에 보인 것과 같은 짤막짤막한 문장들로 채워져 있고, 거기에 150여 장의 사진이 덧붙여져 있다.
본래 이 책은 저자가 한 방송사의 제작팀과 동행했던 여행 당시의 생각들을 보완해 꾸려낸 책이다. 에세이집의 평가 기준으로만 보자면, 결과적으로 이 책의 완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저자의 변(辯)에 따르면, '단상'을 정리하고 다듬은 책일 따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태생적 한계가 필자에게는 다르게 읽혔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산문으로 읽히기보다는 차라리 시로 읽혔기 때문이다. 하여, 이 책의 문장들은 깊은 울림을 준다. 바로 시적 행간이 주는 효과다.
이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이 책이 담고 있는 '초월'이라는 주제다. 위 인용문을 다시 살펴보면, 저자는 "제 머릿속엔 불멸의 꿈이 스쳐 지나갑니다"라고 쓰고 있다. 이 문장은 뒤에서 "나의 꿈들은 이미 초월에 닿고 있습니다"라고 고쳐진다. 이를 눈 여겨 봐야 하는 까닭은 '초월'이라는 주제가 박범신의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들 박범신을 '영원한 청년작가'라고 부른다. 그도 어느새 60대 중반을 넘어섰으니 생물학적 나이만으로 볼 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별칭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들을 두루 고려해보면 그에게도 청년다운 면모가 남아있기는 하다. 가령,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노라면 여느 청년작가들 못지않다. 또 <촐라체>의 연재를 통해 우리 문학계에서 인터넷 소설 연재시대를 연 이도 박범신이었으니 그는 분명 젊다. 그러나 이러한 단면들이 그에게 '영원한 청년작가'라는 별칭을 안겨준 것은 아니다. 저 칭호는 온전히 그의 문학이 산출해낸 결과다.
박범신의 소설을 두루 검토해보면, 그의 작품에는 유독 '산'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은 2000년대 이후의 작품들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이때의 '산'은 구체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의 공간이다. 이를 테면 그것은 동경의 대상이며 초월적 세계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설가들이 저잣거리와 같은 세속적 공간을 선호하는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박범신은 뭇 사람들이 웃고 울고 싸우는 저잣거리의 삶에서 탈피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리라. 바로 이것이 그가 끊임없이 젊음을 갱신하는 방법, 즉 '영원한 청년작가'로 살아가는 방법일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장보러 나온 사람들이다 우리네 이웃처럼 정답습니다.제가 젊을 때의 우리네 시장풍경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본문 162쪽)이처럼 박범신은 초월을 꿈꾸면서도 저잣거리의 삶을 버려두는 게 아니다. 이러한 의식은 지구 반 바퀴의 거리에 위치한 터키를 여행하고 쓴 책 <그리운 내가 온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위의 인용문을 보자. 저자는 터키의 시장 풍경을 보고 있다. 분명 이국적인 풍물에 매료되기 쉬울 터인데, 저자는 그 풍경에서 자신이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우리네 시장풍경'을 읽어내고 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필자도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했던 것 같다.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겠노라는 욕심을 갖고 출발했지만, 여행을 하는 내내 떠나오기 전의 것들을 반추하는 경험 말이다. 이것을 실패한 여행이라 규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야말로 여행을 하는 참맛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또, 어떤 식으로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변화됐을 테니까.
여행의 과정에서 흔히 겪곤 하는 '반추'를 새삼 강조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우선, 이번 터키 여행이 박범신의 문학을 갱신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의 소설을 살펴보면, 여행은 작품에서 중요한 동기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작품들은 이러한 바를 확신하게 만든다.
두 번째 이유는 방금 말한 이유와 궤를 같이 한다. 나는 앞서 <그리운 내가 온다>에 실린 글들 대부분이 산문으로 읽히기보다는 차라리 시로 읽혔다고 말했다. 이는 10년 전에 시집을 출간한 적 있는 그의 이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이 책에서 엿보이는 '시적 행간'을 서사로 채워졌으면 하는 게 독자로서의 솔직한 바람이다. "충만한 삶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꿈입니다"(320쪽)라고 말하는 그에게 필자는 차라리 '서사로 가득 찬 결핍'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며 필자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의 한 구절을 전하고 싶다. 박범신의 이번 여행이 이렇게 갱신되면 어떨까.
"내가 현상적으로, 경험의 대상으로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동시에 예지적으로도 나 자신에게 주어져야만 할 것이다."(슬라보예 지젝의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34쪽) 덧붙이는 글 | <그리운 내가 온다> (박범신 씀 | 맹그로브숲 | 2013.01. | 1만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