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여고의 학생회 선거 풍경. 지지자가 후보자의 캐리캐처를 들고 표를 호소하고 있다. ⓒ 장호철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때 열악한 학교 환경 속에서 보수적·관행적 사고에 찌든 교사들이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을 축약했던 표현이다. 처음 교단에 선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학급 정원이 55명이었다. 2016년 퇴임 직전 남고에 근무할 때 정원이 35명이었는데도 아이들로 교실은 터져 나갈 것 같아서 50명이 넘던 초임 시절의 교실이 전혀 상상되지 않았었다.
직접선거로 뽑은 학생회장에게 왜 '임명장'을 주나?
2000년대 들면서 교실에 냉방기가 보급되고, 수세식 화장실이 보편화되면서 학교 환경은 얼마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사회적 진보의 물결을 따라가기 숨이 차다. 며칠 전에 머리를 길렀다고 학생을 징계한 고교 소식이 들리고,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운동이 10년을 넘겼는데도 아직도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6개에 그치는 상황이니 더 말할 게 없다.
며칠 전, 어느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읽다가 나는 무릎을 쳤다. 기사의 제목은
<학생들이 뽑은 학생회장에 왜 교장이 '임명장'?…"당선증 주세요">다. 달리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다. 학생들이 직접선거로 뽑은 학생회장에게 왜 '당선증'이 아니라 '임명장'을 주느냐고 반문하는 이는 물론 학생들이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초·중·고교 학생회장 당선증 및 임명장을 제출받은 결과, 많은 학교가 선출된 학생회장에게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제출한 18개 학교 모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고 하니 머리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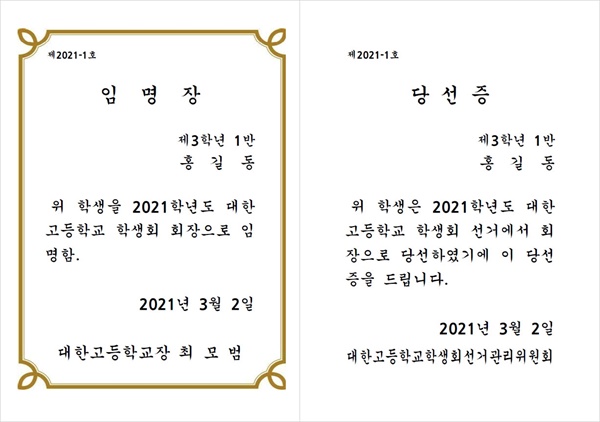
▲학생회장 당선자에게 주는 임명장과 당선증을 만들어보았다. ⓒ 장호철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해 보니 2016년에 경기 지역 학교들이 학생회 임원에게 '임명장' 대신 '당선증'을 발급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충북에서는 2015년에 교육 관련 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되어 교육청은 당선증과 임명장을 모두 수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제하지 않고 학교 실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모두 4~5년 전의 일이니 이 기사는 당연히 '구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게 다시 교육적 의제로 제기된 것은 여전히 학교가 구태의연한 관행을 버리지 못했으며 학생 자치활동도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임을 방증한다. 학교(교사)가 선도해 가든지, 학생이 요구하든지 그 동일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 형식과 내용의 동일성을 갖추어야
유신독재 시기인 1973년에 제정된 '학도호국단 설치령'이 철폐된 게 1986년이니 각급 학교에서 학생회 직선제가 시작된 지도 36년이 흘렀다. 학생 자치활동에서 선거는 그것 자체로 활동의 고갱이면서 민주주의의 실천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다. 비록 성년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이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생회장에게 학교장이 임명장을 주는 관행은 여전히 학생이 학교의 보호와 간섭을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학생이 아직 어리다는 것과 그들의 자치활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학생회장 임명장이 당선증으로 바뀌는 실마리를 마련한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을 안내한 뒤 학기 초 학생들의 선거 문화가 달라졌다고 한다. 2010년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교육청답게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학교에 강제하는 대신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학교장이 주체가 됐던 '임명장'이 학생이 주체로 선 '당선증'으로 바뀌면서 자율과 책임의 학생 자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경기도교육청의 기대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기대로 학생 자치활동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그런 학생회 선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갖추어내게 한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
한때 여고에서 학생 자치활동 담당 업무를 맡아 학생회 선거를 치르도록 도운 적이 있는데, 따로 '당선증'을 준 기억이 없으니 아마 별생각 없이 임명장을 주는 방식을 따랐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는 자치활동을 제대로 지도하고 돕겠다고 생각해, 그 학교에서 첫 축제를 기획하여 집행하기도 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셈이다.
1988년도에 옮겨온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직선제 학생회 선거가 불꽃 튀게 전개되었었다.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을 지적하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한 후보가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하였다. 나는 학교 신문을 맡아서 만들었는데, 신문의 편집 주체를 학생회로 하여 1면에는 학생회장이 쓴 '발간사'와 학교장이 쓴 '격려사'를 나란히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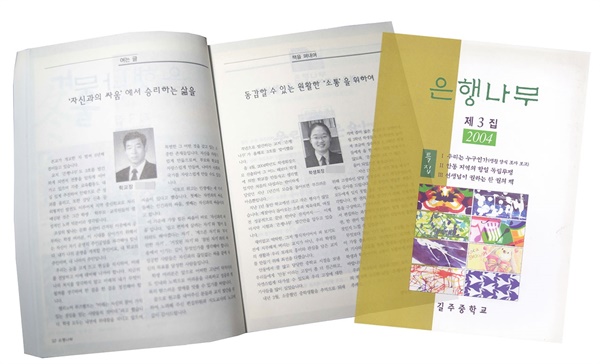
▲2004년에 만든 교지에는 학교장의 글은 '여는 글'로, 학생회장의 글은 '책을 펴내며'라는 제목으로 나란히 실었다. ⓒ 장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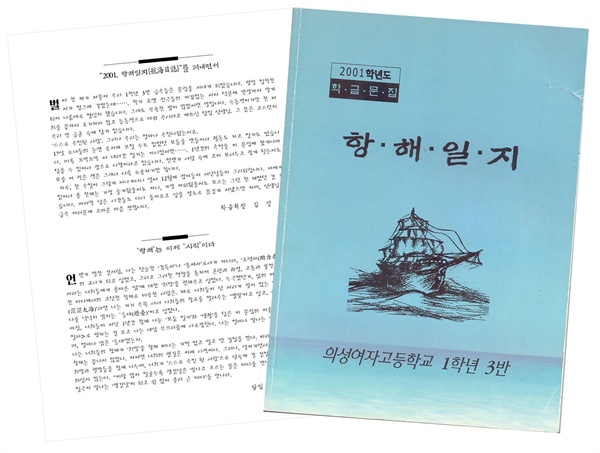
▲2004년도 내가 만든 학급문집. 학급회장의 글을 위에, 아래에는 담임인 내 글을 실었다. ⓒ 장호철
실제로 신문 발행의 주체는 학교지만, 편집의 주체가 학생회니만큼 같은 크기로 나란히 실은 학생회장과 학교장의 발간사·격려사를 보고 불만스럽게 여긴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런 편집의 원칙을 이어간 것은 그게 학교(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학생을 주체로 세우되, 조력자로서의 학교(교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라 믿어서였다.
1989년에 16절 4면으로 만든 학급 신문에서도 1997년 면 소재 중고 병설학교에서의 학교 문집, 2001년과 2005년에 만든 학급문집, 2004년의 교지 등에서 같은 원칙을 지켜갔다. 글쎄, 아이들이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새겼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그 의미를 굳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왜 '당선증' 아닌 '임명장' 주느냐고 되묻는 아이들, 얼마나 똘똘한가
직접선거로 뽑았다고 해도,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 아닌 만큼 임명장을 주는 게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견 발표회를 거쳐 학생들의 직접적 선택을 받아 당선한 학생에게 임명장을 주는 건 형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주어 그들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한 책임 등의 의미를 스스로 새기게 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교육적 의미는 충분하다. 학생들의 표를 얻어 당선해 놓고, 굳이 학교장에게 임명장을 받는 부조화 대신, 당선증으로 그 권리와 의미를 환기할 수 있다면 마땅히 장려할 일이 아니겠는가.
전국 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는 정부·여당의 외압을 받고 있지만, 당대의 현실을 풍자한 수상 학생의 기지는 놀랄 만하다. 왜 당선증이 아닌 임명장을 주느냐고 되받는 똘똘한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현직 시절에 가끔 되뇌기도 한 "아이들이 교사들보다 백번 낫다"가 공치사가 아니라고 새삼 확인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개인 블로그 ‘이 풍진 세상에’(https://qq9447.tistory.com/)에도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