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스트레스'가 여러 사람 고생시킨다. 사진은 영화 <영어완전정복>
시네마서비스
그렇다고 내가 영어에 대해 무사안일, 천하태평으로 일관하는 건 절대 아니다. 외국인이 나에게 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제대로 답변을 하기가 두렵기는 하다. 언제든 대비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종종 영어방송을 하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을 챙겨 듣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어를 못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우리 고유의 말이 입에 밴 상황에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과 간혹 대화를 하다보면 간단한 표현만 써도 영어 잘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소위 '립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 말이 나올 만하다. 우리도 외국인이 우리말 조금만 해도 '한국말 잘 한다'고 좋아하지 않는가. 그거다. 기본적인 영어만 해도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데 두려워 할 이유가 대체 뭐냔 말이다.
2003년에 개봉한 김성수 감독의 <영어완전정복>이란 영화를 보면 단어는 완벽하게 외우지만 회화를 못해서 영어학원 기초반을 다니는 중년의 신사가 나온다. 어려운 영어 단어는척척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회화에서는 꿀먹은 벙어리다. 한국 영어교육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보여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든다.
토익이라는 것도 잘 보면 이런 문법, 단어 중심의 딱딱한 영어 공부의 연장이다. 이걸 잘 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걸까?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 한 마디도 못하고 문서를 잘못 해석해 낭패를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채용한 회사도 망신을 당할 게 분명하다. 그러다보니 토익을 잘 봐도 계속 영어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콤플렉스가 낳은 직장인 영어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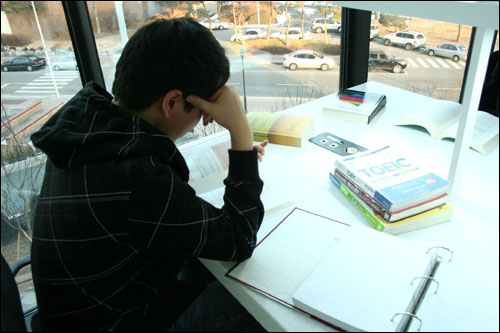
▲대학의 한 도서관기본적인 스펙인 토익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매달린다.
이나영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아직도 '영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영어와는 아무 관계없는 회사까지도 토익 성적표를 요구하고 외국인과 대화를 해야 한다며 무조건 영어 공부를 강요하는 상황이 직장인을 영어 스트레스로 몰고 간 것이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뿌리박힌 '영어 콤플렉스'가 문제인 것 같다. '영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어른들 때문에 참 직장인들이 고생이 많다.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라. 죄다 영어 투성이 아닌가? '하이 서울', '해피 수원', '스크린도어' 등등. 그런데 대부분 영문법에 맞지 않는, 자기네끼리 만든 영어란다.
얼마나 콤플렉스가 심했으면 정권이 바뀌자마자 미국인은 '오렌지'가 아닌 '어륀쥐'라고 말해야 알아듣는다고 '영어몰입교육'을 하자는 제안까지 할까? 직장인, 학생에게만 한정된 영어 스트레스를 이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글솜씨는 비록 없지만, 끈기있게 글을 쓰는 성격이 아니지만 하찮은 글을 통해서라도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글쟁이 겸 수다쟁이로 아마 평생을 살아야할 듯 합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