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 어린이(자료사진).
pixabay
가만히 책장을 열면, 빼곡히 작은 글자들이 세로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빈집에 홀로 친구도 놀러 오지 않는 날에는 새 방에 엎드려 대문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갔다. 중간에 모르는 한자가 섞여 있고 <용비어천가>에서나 볼 법한 글씨들이 간혹 꼬부랑거렸지만, 황홀했다.
실은 거짓말이다. <죄와 벌>은 읽다가 덮었고 <전쟁과 평화>는 보다가 졸았다. 이 책에서 저 책으로 전전하다, 이야기들은 끝내 내 것이 되지 못했다.
그때 난 고작 여덟 살이었다. 역시 무리였다. 어려운 책은 냅다 뒤로 던지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그네를 탔다. 좁은 논두렁으로 다니며 메뚜기를 잡다가 동네 친구들과 나무를 탔다. 산에 가서 총싸움 놀이를 하다 인근 하천인 남대천으로 나갔다. 강을 건너며 놀다가 물살에 신발 한 짝이 둥둥 떠내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다.
신발 잃어버리고 늦게 들어온 벌로 저녁밥을 굶었다. 새 방에 들어가 눈물을 닦으며 두꺼운 책을 펼쳤다. 줄 잘 선 군대마냥 열병식에 익숙한 글자들은 위로엔 젬병이었다. 대신 느린 걸음으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그 시절 가족 중 누군가 책 읽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즐겁게 책을 읽었다. 그런 풍경 속에서 산 덕분에 지금 우리 집 책장에도 책이 가득 있고 책을 가까이 두고 즐겨 읽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 읽지 못해도, 군데군데 읽어도, 한 부분만 읽거나 아예 거들떠보지 않는 책이 있어도. 시나브로 책은 나에게 친밀하고도 가까운 무엇이 되어주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세상, 스마트폰이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간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다. 거실엔 대형 디지털 텔레비전이 있고 각자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바쁘다, 매일 학원으로 야간자율학습으로 과제로. 아파트 숲에 사는 아이들은 원하는 친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기도 어렵다. 틈이 나면 인터넷,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하다.
무료할 틈은 없고 부모의 잔소리만 듣는다. 잔소리하지 말라는데,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둬도 괜찮을까. 여전히 책은 아이들 가까운 곳에 있지만, 시선을 빼앗겼으니 어쩌나. 책이 아이들에게 의미가 되어줄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다는 고민이 깊어질 즈음 책 <소설처럼>을 만났다. 다니엘 페나크의 <소설처럼>은 강압적 독서교육을 비판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말하는 에세이다.

▲다니엘 페나크의 <소설처럼> 표지
문학과지성사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걸, 당신이 아이들에게 기대한 건 당신이 정해준 소설을 읽고 그럴듯한 독후감을 쓰는 것, 당신이 골라준 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학생들이 당신이 뽑아준 예상 문제 중에서 나온 텍스트를 능숙하게 분석해서 적절히 '설명'하거나 당일 아침 시험관이 학생들의 코앞에 들이미는 문안을 칼같이 '요약'하기를 바라는 거잖아." (p.95)
욕심 많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책속 이 문장과 마주했을 때 나는 하마터면 두리번거릴 뻔했다. 작가가 어딘가에서 나를 훔쳐보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서. 그래 맞다, 내가 그랬다. 다니엘 페나크의 날카로운 지적에 속이 뜨끔했다.
아이가 스스로 읽기 시작할 무렵, 밤마다 내가 책을 읽어주던 행위는 그쳤다. 학년이 올라가자 나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고 싶었고, 아이가 그럴듯한 독후감을 쓰길 원했다. 사실 처음부터 아이에게 책 읽기를 강요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다니엘 페나크는 폐부를 찌르는 말로 강압적 독서교육에 대해, 이야기꾼이었던 부모가 잃어버린 순수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한다. 한편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안심시켜준다, 길을 열어준다. 희망을 준다.
"그 즐거움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 몇 해를 허송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예전처럼 다시 아이와 읽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p.69)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옥같은 작품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주어야 한다." (p.168)
슬픈 사랑 영화를 보고 절망해서는, 나는 내가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부정했다. 너무 슬퍼서 배우들 연기에 빠져서 여러 번 돌려봤더니,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내 마음에 새겨졌다.
하교한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에 가득했던 그것은 언어가 되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어둠이 내린 밤, 차 안에서 이야기는 시작됐다. 내 마음에 아프게 새겨졌던 이야기의 아련함이 아이들 마음에도 고스란히 가서 닿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p.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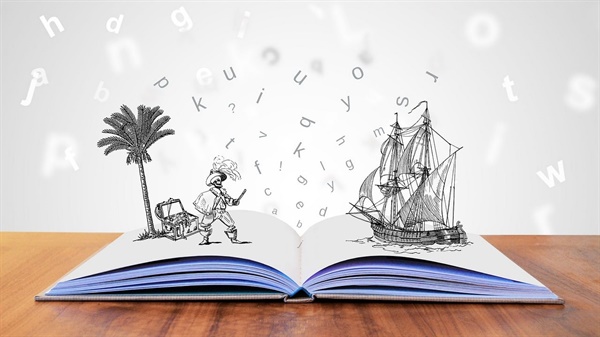
▲책과 상상력.
pixabay
우리는 우리 주변 소중한 존재에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추천한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우리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통상 가깝고 소중한 존재로부터 추천받은 책이다. 아이들에게 독서를 강요하기 이전에 먼저 어른이 내가 책 속에 묻혀 감동해야 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나누어지니까.
<소설처럼>은 어른들의 변화를 촉구한다. 아이들을 위해 침해할 수 없는 독자의 권리를 주장한다. 우리는 다 읽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심지어 아예 책을 읽지 않을 권리가 있다. 건너뛰며 읽을 권리가 있고, 군데군데 골라서 읽을 수도 있다. 다시 읽고 아무 책이나 아무 곳에서, 소리를 내거나 내지 않으며 읽을 권리 무엇보다 책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책이란 우리의 아들딸이나 청소년들이 읽은 뒤 설명하라고 쓰인 게 아니라, 마음에 들면 읽으라고 쓰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p.178)
함께 떠나는 독서 캠프
우리 가족은 이번 휴가때 '독서 캠프'를 가기로 했다. '독서 캠프'에 대한 제안은 큰딸이 했다. 큰딸은 마침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고, 어딘가로 떠나기엔 구성원들끼리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았던 탓이다.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책 읽는 건 어때요.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나는 좋은데 아빠랑 애들이 어떨지……."
"제가 설득할게요."
감사하게도 놀기 좋아하는 열아홉 둘째와 중2 아들도 '독서 캠프'를 하는 것에 찬성했다. 책은 아이들이 고른다. 각자 흩어져서 읽은 뒤 소감 발표는 모여서 하기로 했다. 나는 기뻤다. 잃어버렸던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되었다.
다 읽지 못하더라도, 조금 건너 띄엄띄엄 읽거나 감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함께 읽는 시간을 갖고 좋았고 인상 깊었던 대목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하다. 우리는 눈을 마주 볼 것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서로를 더 알아가고 공감을 얻게 될 것이 틀림없다.
독서 캠프, 나는 그윽한 눈으로 책 읽는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고 싶고, 함께 먹을 특별한 간식도 준비해 주고 싶다. 커피 한 모금 입에 물고 가만히 내 유년의 방으로 들어가 못다 한 이야기를 들려줄 대문호를 만나고 싶다.
소설처럼
다니엘 페나크 (지은이), 이정임 (옮긴이),
문학과지성사, 2018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상담 자원봉사를 합니다. 블로그에 북리뷰를 하고 브런치에 글을 씁니다.
공유하기
아이들에 독서 강요하던 나, 이 책 읽고 바뀌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