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유현미 부부
김지영
혜주에게 남편은 여전히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 남편이 혜주의 손을 처음 잡은 날도 집으로 데려오던 그 날이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과자를 사주겠다고 꼬드기면서 간신히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혜주는 서울 집에 가서도 한참 동안 남편만 보면 질색을 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거실에서 자는 걸 좋아했던 혜주 때문에 주말에 집에 올라 온 남편은 거실을 지나야 하는 화장실도 갈 수 없을 정도였다.
"엄마. 혜주가 저 조그만 손으로 지 얼굴보다 큰 컵에 물을 따라 마실 수 있어.""엄마. 혜주가 혼자 문도 열어."형제 없는 집에서 혼자 자라온 아들은 어린 혜주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신기한 모양이었다. 아들은 한참 어린 동생 혜주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였고 혜주의 모든 것을 금방 사랑하기 시작했다.
내 나이 마흔 일곱에 얻은 둘째 자식이고 첫째 딸이었다. 나 역시도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육아에 대한 서투름 때문에 아이 옷에서부터 나이에 맞는 장난감과 가구들을 사서 입히고 놀게 하고 구색을 맞추는 게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었다.
혜주는 두 돌 반이 지나는 동안 시설에서만 자란 아이였다. 무엇 하나 자기 것이라고는 가져 본 적이 없었고 자기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 혜주가 내 딸이 되고 나서 혜주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르친 것은 이제부터 너를 둘러싼 모든 것은 온전히 너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여기는 혜주 집이야' '이 장난감은 혜주 꺼야(것이야)' '엄마는 이제 혜주만 엄마야' '엄마는 혜주한테만 엄마고 다른 애한테는 엄마 아니야' '아빠도 혜주만 아빠야' '오빠도 혜주만 오빠야'입양이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제 아빠, 제 오빠, 제 엄마가 되는 건데, 그건 물이 물인 것처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가르쳐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제가 그 나이를 먹도록 살아 온 삶이 공동의 엄마, 공동의 방, 공동의 장난감 같은 것들로만 이루어졌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 혜주를 나무랄 일이 아니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그렇다는 걸 혜주가 받아들일 때까지 그걸 말하고 또 말하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했다. 그래야지만 혜주가 비로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가족은 원래 그렇게 배타적인 사랑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 빛나는 존재감이 제 건강한 삶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를 한 달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여전히 시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혜주가 함께 생활했던 아이들을 빗대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빠는 혜주만 오빠야. 민국이는 오빠 아니야." "이건 혜주 꺼야. 이 집은 혜주 집이야. 진영이 집 아니야.""엄마는 혜주 엄마야. 다른 애 엄마 아니야."'엄마는 혜주 엄마'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애 엄마' 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입이 절로 벌어지고 얼굴은 붉어지며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다.
드디어 혜주에게 가족이라는, 저만의 엄마 아빠 오빠가 생겼다는 의미였다. 혜주가 그걸 마음 속 깊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혜주는 그렇게 집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비교적 일찍 내 딸이 돼 주었다.
혜주에게 언니가 생겼으면 좋겠다혜주가 아빠를 받아들인 건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돌이켜보니 시설에서 집으로 온 지 백일 되던 그 즈음이었다. 주말을 맞아 서울 집으로 온 남편의 품에 혜주가 안겼고 남편은 그런 혜주와 처음으로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눈빛을 나누었다. 남편에게 그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다. 남편은 평생 그 날의 그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을 거라 했다.
혜주가 모든 가족을 저만의 가족으로, 혜주만의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온전하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교감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날이기도 했다.
평화와 안정이 동시에 찾아왔다. 서로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화학적인 결합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안도감도 들기 시작했다. 혜주가 우리를 드디어 받아주었다는 확신이 들면서 혜주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은 더욱 걷잡을 수 없어졌다. 혜주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예뻤고, 혜주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가장 예쁘고 가장 귀한 존재인 혜주를 볼 때마다 나이 많은 우리 부부가 겹쳐지고 혜주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혜주가 나중에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 외로우면 어떡하지' 사랑이 깊어갈수록 걱정도 따라서 깊어갔다. 자식을 하나 낳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으레 그렇듯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걱정이었다. 남편 표현으로 '어차피 꼬인 인생, 하나 더 키우자'로 생각이 모아졌다. 혜주가 집에 온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다시 임마누엘 보육원으로 달려갔다. 달려가기 전에 고민을 했다. 이번 입양은 순전히 혜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오든, 오는 아이는 순전히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혜주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도덕적인 자기검열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모들이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것도 그 출발은 앞서 낳은 자식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자신들의 삶을 자식들과 함께 더욱 풍성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모두가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같은 마음이었다.
두 번째 입양은 처음보다 더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았다. 우리 부부의 나이와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하고 살펴야 했다. 두 번째 입양은 혜주에게 언니뻘 되는 아이가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단 두 번째 입양을 결심하자 마음은 급해졌다. 혜주가 이제야 온전한 가족이 되었는데 더 시간이 흐르면 위로 언니를 받아들이는 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임마누엘에서 여섯 살 여자 아이를 소개를 했고, 혜주를 그랬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집으로 데리고 왔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혜주보다 늦게 우리 딸이 된 혜인이는 그렇게 혜주 언니이자 우리 부부의 큰 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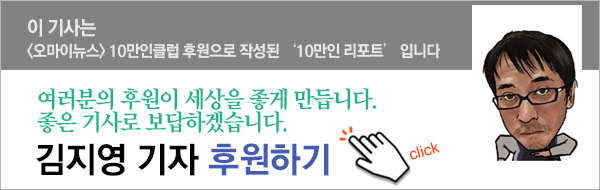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4
20년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을 거쳤다가 서울에 다시 정착했다.
공유하기
마흔 아홉에 얻은 둘째, 아빠는 화장실을 못갔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