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우화소설 <개> 앞표지푸른숲
새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던 담배의 남은 불로 불을 붙일 만큼 골초이므로 하루에 성냥개비가 하나 밖에 필요치 않았다고 하는 공초 오상순. 그는 어느 날 아이들 가르치러 학교에 출근하다가 개가 흘레하는 것을 발견하고 쭈그려 앉아 구경했다고 한다. 흘레하는 개를 돌멩이를 던져 쫓아버리는 단순한 사람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암수가 엉덩이가 붙은 채 “깨갱” 하며 달아나는 모양이라니, 너무 가엾지 않은가. 거리에 풀어놓은 잡견이니 어차피 잡견인 것을, 뭐 어쩌겠는가.
한 가지 더, 엊그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어느 식당 강아지 두 마리가 문 앞에 함께 있다가 작은 한 마리가 주저앉더니 실례를 했다. 한 쪽 다리를 들지 않은 걸로 보아서 암컷인 모양이었다. 그러고 부끄러운지 슬금슬금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다른 한 마리는 오줌 냄새를 맡더니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 특별히 안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을 터,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오히려 나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개’답다고 생각했다. 아래, 개를 의인화하여 쓴 김훈의 경장편소설 <개>의 독백을 보자.
나는 어린 영수가 싼 똥을 먹은 적이 있었다. 나는 똥을 먹은 일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똥을 먹는다고 해서 똥개가 아니다. 도둑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는 개가 똥개다. 하지만 내가 똥을 자꾸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는 똥을 먹지는 않는다. 먹고 싶을 때도 참는다. -<개> 84쪽에서
내가 똥을 먹었다고 해서 영수는 나를 더러운 놈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세 살쯤 되어서 영수는 나를 끌어안고 주무르면서 별 장난을 다 했다. -<개> 87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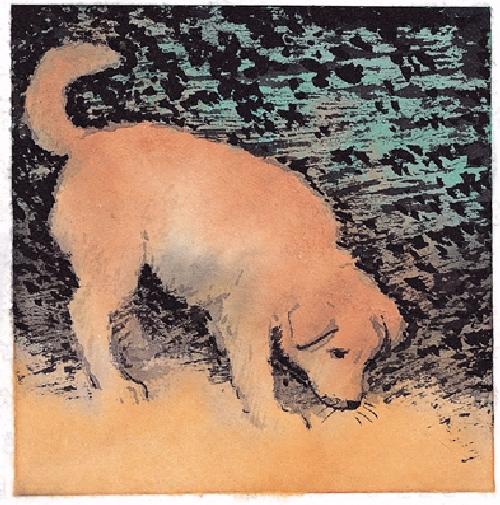
▲진돗개 보리의 어린 시절(<개> 51쪽 삽화)김세현
김훈이 이순신 속으로 들어가 <칼의 노래>를 열창하더니, 이번엔 진돗개 속으로 들어가 <개>를 탄생시켰다. 그러고 독자들에게 진돗개의 사색의 깊이를 들려주었다. 덕분에 나도, 과거에 <칼의 노래>를 읽으며 이순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개>를 읽으며 진돗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멍멍" 짖고 눈으로 얘기할 뿐 말을 하지 못하는 한 마리 개의 내면을 읽을 수 있었다.
<개>는 우화(寓話)의 옷을 입은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돗개 보리는 자기 주변의 세상 바라보기와 생각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보리는 매우 영리하다.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자연을 선생님 삼아 배울 줄 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개 이야기도 하고 사람 이야기도 하고 세상 비판도 한다.
그때, 엄마는 우리 형제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낳았어. 우리 엄마 젖꼭지는 모두 열 개인데, 그 열 개에서 모두 다 젖이 콸콸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 -<개> 14쪽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밭에 물을 대지 않았다. 할머니는 배추가 저절로 커지기를 기다렸다. 배추가 다 자라면 할머니는 밭떼기로 배추를 팔고 이 마을을 떠날 것이다. -<개> 227쪽에서
산중턱 마을 사람들은 돼지나 닭을 길러서 살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돼지똥과 닭똥이 저수지로 흘러들어와 농사를 망쳤다고 논동네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산동네로 쳐들어가서 싸운 적도 있었다. -<개> 80쪽에서
그러나 내가 짖지 않고 노려보기만 할 때가 무섭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 -<개> 111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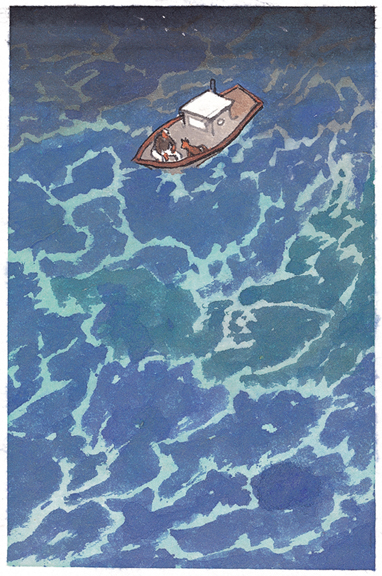
▲어부인 새 주인과 바다로 간 보리(<개> 159쪽 삽화)김세현
보리는 강이 있는 산촌에서 살지만 댐 공사로 수몰되기 때문에 어촌으로 간다. 그곳에서 암캐 흰순이를 사이에 두고 도사견과 불도그의 잡종으로 보이는 큰 개 악돌이와 혈투도 벌인다.
그러던 어느 날 새 주인은 술에 취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익사하고 만다. 보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들었던 할머니는 섬으로 찾아와 보리의 새 주인 집에서 살지만, 또다시 밭을 버리고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보리와 혈투를 벌인 악돌이는 어디로 떠났는지 보이지 않고, 흰순이는 악돌이의 씨로 여겨지는 새끼들을 낳고서 주인집 아들 군대 갈 때 먹이려는 보신용 고기로 바쳐진다. 도심지 아파트로 이사 가는 영희네는 보리를 데려가지 않고 할머니가 당분간 맡게 된다.

▲맹견 악돌이와 1차 혈투를 끝내고 돌아온 진돗개 보리(<개> 184~185 삽화)김세현

▲대형견 악돌이와 2차전을 벌이는 진돗개 보리(<개> 202~203쪽 삽화)김세현
악돌이가 떠나고 흰순이가 죽고 없는 마을은 견딜 수 없이 허허로웠다. 할머니는 남은 짐을 정리하느라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는 추수가 끝난 빈 들판을 할 일 없이 쏘다녔다. 주인님의 무덤 아래쪽으로 바다는 언제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철석거리며 밀려나가고 밀려들어왔다. -<개> 230쪽에서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개>. 보리의 일생 모두를 그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적당하다. 숨을 쉬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어 좋다. 할머니와의 이별을 남겨놓고 있는 보리, 녀석은 이제 또 누구를 만나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고장에서는 어떤 개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모랫말 아이들>의 삽화를 그린 김세현 화백의 삽화가 곳곳에 살아 있다.
한 가지 더, 이 소설책에는 권말소설평이 들어 있지 않아서 좋다.
덧붙이는 글 | ●김선영 기자는 대하소설 <애니깽>과 <소설 역도산>, 평전 <배호 평전>, 생명에세이집 <사람과 개가 있는 풍경> 등을 쓴 중견소설가이자 문화평론가이며, <오마이뉴스> '책동네' 섹션에 '시인과의 사색', '내가 만난 소설가'를 이어쓰기하거나 서평을 쓰고 있다. "독서는 국력!"이라고 외치면서 참신한 독서운동을 펼칠 방법을 다각도로 궁리하고 있는 한편, 현대사를 다룬 6부작 대하소설 <군화(軍靴)>를 2005년 12월 출간 목표로 집필하고 있다.
개 -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
김훈 지음,
푸른숲, 2005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