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 속의 대화' 포스터예술의전당
내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앞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사실, 아니 다른 것은 다 떠나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자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본다’라는 의미를 여타의 동사와 다르지 않은 ‘당연히 가능한 행위’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둠 속의 대화'(1.5-3.11,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는 그래서 당혹스럽다. 미스터리 영화나 호러 영화의 제목 같은 전시명에서 이번 전시가 어딘지 심상치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한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전시공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어둠이 빼곡하게 들어찬 전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다. 때문에 ‘어둠 속의 대화’는 전시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나 여기 있어요”라고 최소한 스스로의 존재를 옆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이다.
먼저 전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하얀 지팡이로 불리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케인’과 한 시간 정도 칠흑같은 어둠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그것이다. 케인은 손에 들었지만 미처 용기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기자는 ‘과연 내가 이 어둠 속에서 60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공포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을 몇 번이고 감았다 뜨면서 허방을 손으로 더듬기를 반복했다.
@BRI@다행히도 전시장 안에서는 조를 이룬 관람객을 이끌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자리에 한참을 붙박인 듯 서 있다가 가이드의 목소리를 쫓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발짝 떼었을 때의 그 기분, 낭떨어지에 발을 내딛은 것 같은 그 기분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처음 손에 와 닿은 그 울퉁불퉁한 벽의 감촉 또한 잊을 수가 없다. 사람이 사용하는 오감에서 시각이 80%를 차지한다고 하니 언제 한번 그렇게 온 신경을 촉각에 혹은 청각에 곤두세워본 적이 있었겠는가. 만지고 또 만지고, 냄새까지 맡아본 후에야 그 울퉁불퉁한 것이 바로 대나무로 만든 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딱 그만큼씩 어둠에 익숙해졌다. 여전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힘들었지만 손 끝에 스친 사물의 이름을 맞춰가는 것이 흥미로워지긴 했으니 말이다. 이렇게 관람객들은 가이드와 혹은 옆에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들리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바람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 내 입 속으로 들어가는 음료가 어떤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는지 등 그동안 정말 제대로 사용은 했던 것일까 싶은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사감을 곧추세우는 생경한 체험을 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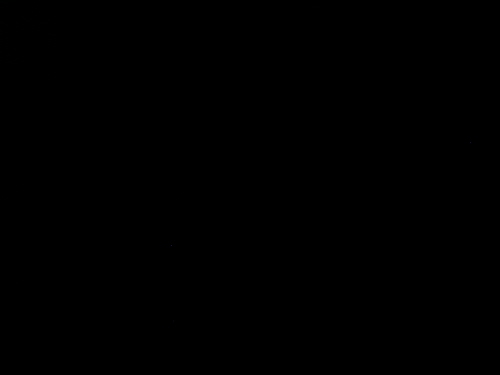
▲전시장 내부는 바로 앞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다.컬처뉴스
특히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바로 신호등을 건너는 체험이었다. 차 소리가 그득한 곳에서 어떤 도움도 없이 길을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나 다름 없었다.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건너야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난감할 뿐. 이러한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지속되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이 전시회 가이드
관람객들은 그저 자신의 감각에 대한 체험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앞 사람을, 뒷 사람을 서로 염려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떠올려보면 쑥스러우면서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장면이다. 특히나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의 눈과 발이 되어 안전하게 관람을 마칠 수 있게 도와준 가이드 모두가 중증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알 수 없는 미묘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독일의 심리학자 안드레아스 하이네케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거리를 좁히고자 지난 1988년에 고안해 낸 것으로 독일에서 시작된 이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브라질, 일본 등 전 세계 19개국 130여 개의 도시에서 개최됐다. 이스라엘에서는 벤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사재를 털어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브라질에서는 피렐리 타이어 전 CEO와 부동산 재벌이 상설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난 7년 동안 19번이나 개최돼 모두 매진 사례를 보여줬다고 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EMS 아시아퍼시픽의 박상미씨는 “어둠 속의 대화는 단순히 시각 장애 체험만을 위해 만들어진 행사인 것만은 아니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감각의 눈을 뜨게 만드는 아름다운 행사”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상설전시장이 마련되어 작지만 시각장애인 고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3444-0239.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컬처뉴스>(http://www.culturenews.net)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