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크의 <귀가하는 노동자들>고된 노동을 마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몰려나온다.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다. 뭉크는 이들에게서 근대 문명의 불안을 포착했다. 거칠고 신경질적인 선과 어두운 색채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다.
자료그림
그러나 그런 자위도 소용없을 때가 종종 있다. 창조적 영감을 위한 여유는 없고, '예술적'이어야 할 일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편집은 예술'이라는 소신을 가진 나는 시간이 갈수록 지쳐간다.
지친 몸을 이끌고 출퇴근할 때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고민하기 일쑤다. 그럴 땐 뭉크의 그림 <귀가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가도 이 저주스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먹고살까 하는 물음에 닥치면 소심하게도 그냥 말없이 다시 출근길에 나선다.
내가 편집을 맡은 원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노명우 지음, 사계절 펴냄)는 우리가 매일 겪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
언젠가 나는 출근 인파로 가득 찬 만원 버스 속에서 1시간 이상을 선 채로 갇혀 있어야 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의 얼굴을 읽었다.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같았다. 모두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밝은 표정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노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다...우리는 왜 일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노동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현재 노동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저자 서문에서노동에 대한 강박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우리는 왜 일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하는 질문은 강하게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자 노명우 의 분석은 한줄기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노명우는 우리가 언제나 노동을 중시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근대 이전 사람들은 우리처럼 '일에 미쳐' 있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을 멀리했다. <성경>은 노동을 신이 내린 형벌로,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노동을 저주받은 행동이라 경멸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1년 365일 중 70일만 노동했고 중세 사람들은 단지 계절에 맞춰 간헐적으로 일했다.
그럼 노동에 대한 찬미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 노동을 찬양하고 근면을 중시하게 된 것은 근대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서면서 생겨난 문화 현상이다. 근대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노동은 가장 낮고 미천한 지위에서 인간 활동 중 최고의 지위로 갑작스럽고도 눈부시게 상승했다.
사상사를 보아도 노동은 근대에 들어서 눈부시게 찬양받았다. 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는 노동을 모든 부의 원천으로 주장하면서 노동의 지위를 한껏 높였다. 인간의 본질을 노동하는 존재로 규정한 마르크스에 와서는 노동의 지위가 절정에 달했다.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강철 감옥'에 갇힌 현대인들노명우는 베버의 저작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친절하게 해설하며 이러한 노동의 지위 변화를 가져온 대전환을 추적했다. 자본주의 노동윤리의 기원을 파헤친 베버의 저작이야말로 그 일에 꼭 맞는 텍스트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정신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적응해야 하는 외적 환경이다. 베버는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강철 감옥'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 예언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의 예언대로 노동윤리로 무장한 채 고된 노동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레핀의 <볼가강의 뱃사람들>긴 끈에 묶인 채 거대한 배를 이끄는 인부들의 모습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상황을 너무도 잘 나타내는 비유인 듯하다. 화면 밖으로 무거운 눈길을 보내는 인부들이 배에 묶인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강철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다.
자료그림
노명우는 베버의 안내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사람들이 노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저자는 베버 이론의 역사적 제한성을 지적하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의 다양한 노동윤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베버의 명제를 수용하여 오늘날 노동윤리에 대해 분석했다.
이 부분이 바로 진정한 하이라이트로, 베버 명제의 역사적 제한성을 넘어 '고전을 새로 썼다'는 평을 가능하게 한다.
저자는 오늘날의 노동 유형을 성공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낙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에 몰두하는 사람, 소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사람으로 유형화해 설명한다. 특히 쇼핑중독자, 아침형 인간, 도박꾼, 비노동주의자 등에 대한 분석이 무척이나 흥미진진하며 또한 의미심장하다.
원고는 내게 '나는 왜 일해야 하는 것일까?' '내 삶에 노동과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하는 생각을 해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나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절박한 물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노명우가 제기하는 물음은 베버의 '합리화의 역설'이라는 명제를 계승한다. 베버는 '수단'이어야 할 노동이 '목적'이 되어버린 체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 자본주의 정신의 근저에 깔린 비합리성, 즉 '합리화의 역설'이라 불렀다. 저자가 제기하는 물음은 이것을 계승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흔드는 불순한 물음, 노동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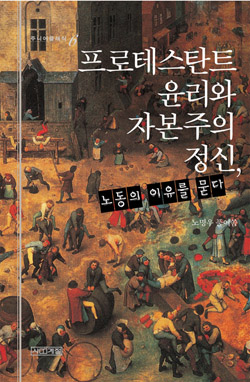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노동에 대한 물음의 이면에는 놀이에 대한 열망이 숨어 있다. 저자의 문제제기는 근대적 현실원칙의 승리에 대한 탈근대적 쾌락원칙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표지는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담았다.
사계절 출판사
또한 노명우의 물음은 자본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영역이 바로 노동윤리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이 자본주의 노동윤리를 의심하고 노동자가 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찰한다면, 자본주의 축적 구조는 위험에 처한다.
노동이 정말 아름다우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노동에 대한 찬미'가 가져온 것은 결국 '노동으로 피폐해진 삶'이 아닐까?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이 책을 편집하면서 노동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에 대한 강박에 시달렸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해야 했다.
이 책은 가까스로 마음을 잡고 얌전히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보자고 했던 내 다짐을 흔들어 놓은 책이기도 하다. 아마 오늘도 퇴근길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하는 의문을 또 제기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서상일 기자는 사계절출판사의 편집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
노명우 지음,
사계절, 2008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2001년 9월, 이달의 뉴스게릴라 선정
2002년, 오마이뉴스 2.22상 수상
2003~2004년, 클럽기자 활동
2008~2016년 3월, 출판 편집자.
2017년 5월, 이달의 뉴스게릴라 선정.
자유기고가. tmfprlansghk@hanmail.net
공유하기
노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과연, 정말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