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자리하실 거다. 그 분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간직하고 이제 신령이 되어 두 눈 부릅뜨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가난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맞으며 한자 '堇(근)'과 '縣(현)'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을 던지는 모습 '堇(근)'
그림에서 '堇(근)'자의 모양을 보자. 갑골문을 보면 ㅂ(기도문을 담은 그릇. 이를 저는 축문그릇 재라 부릅니다)을 머리에 인 사람이 불(火) 위에 서 있다. 가뭄 끝에 기우제를 드려도 비가 오지 않자 자신을 불태우는 사제의 모습이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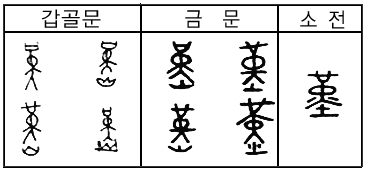
▲ 한자 ‘?(근)’ ⓒ 새사연
▲ 한자 ‘?(근)’
| ⓒ 새사연 |
|
그런데 고대의 제사장은 왕과 동일했다. 실제 동이족이 세운 중국 商(상)나라의 湯(탕) 왕이 이처럼 스스로를 불에 태워 기우제를 드리는 순간 비가 쏟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원시 사회를 야만이나 미개사회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기우제를 야만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고 권력자이자 정치 지도자가 스스로를 희생하여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행위를 어찌 야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행동이다. 상나라 탕왕처럼, 고 노무현 대통령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을 던졌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떠오른 글자가 堇(근)이다.
그래서 '堇(근)'이 들어간 한자는 가뭄이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堇(근)에 食(밥 식)을 더하면 饉(흉년들 근)이다. 예를 들면 '饑饉(기근)'이란 단어가 있다. 堇(근)에 亻(사람 인)을 더하면 僅(겨우 근)이다. 가뭄이 들어 '僅僅(근근)'히 먹고 산다는 뜻일 것이다. '僅少(근소)'란 말도 있다.
堇(근)에 欠(하품 흠)을 더하면 歎(탄식할 탄)이다. 欠(흠)은 입을 크게 벌린 모양이다. 口(입 구)를 붙인 嘆(탄)도 마찬가지 뜻이다. 지독한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면서 외치는 소리일 것이다. '恨歎(한탄)'에서 그 글자를 찾아볼 수 있다.
堇(근)에 艮(그칠 간)을 더하면 艱(어려울 간)이다. 艮(간)은 目(목)과 亻(인)이 합쳐진 자인데 무서운 눈앞에서 사람이 멈춰선 모습이다. 절에 가면 사천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廣目(광목) 대왕을 생각하면 된다. 사천왕은 성소에 들어오려는 온갖 악령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艱難辛苦(간난신고)'란 사자성어가 있다.
言(언)을 덧붙인 謹(근)은 '삼가다'라는 뜻인데 기우제를 지내는 사제의 마음가짐을 나타낸다. 言(언)은 辛(매울 신)과 ㅂ(축문 그릇 재)를 합한 건데 자신의 맹세가 거짓이면 문신용 침(辛)으로 벌을 받겠다는 의미로서 말을 의미한다. '謹弔(근조)'가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쟁기의 모습인 力(힘 력)을 붙인 勤(근)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 즉 부지런하다는 뜻이다. '勤勉(근면)'이란 말에서 본다. 여기에 마음 心(심)을 더한 懃(근)은 살뜰하다는 뜻이다. '慇懃(은근)'이란 다소 어렵게 쓰여진 단어가 있다. 氵(수)를 덧붙인 漢(한)은 강 이름 漢水(한수)이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이 강 근처에서 세운 나라가 漢(한)나라다. 서울의 한강도 이 자를 쓴다. 漢江(한강).
木(목)을 덧붙이면 槿(무궁화 근)이 되는데 가뭄이 되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무로 부활한다면 무궁화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는다. '槿域(근역)'에서 쓰인다.
隹(새 추)를 더한 難(난)도 어렵다는 뜻인데 여기서 堇(근)은 기우제를 지내는 堇(근)과는 달리 옛 자형에서는 불화살의 모습이다. 불화살로 새를 쏘아 어려움을 쫒아내려는 주술의례이다. '住宅難(주택난)'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亻(인)을 더하면 儺(귀신 쫒을 나)이다. '儺禮(나례)'
또 氵(수)를 더하면 灘(여울 탄)이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호신이 되어 '玄海灘(현해탄'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 글자를 쓰게 된다.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에서 최고신으로 대우를 받는 분이 최영 장군이다. 원한이 많은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영적 힘이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객사자의 원혼 떠올리는 '縣(고을 현)'
내 고향은 전북 고창의 奧地(오지)였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았다. 초가집에서 부모님은 농사며 구멍가게며 두부 장사를 하시며 6남매를 키우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셨다. 논에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어느 날, 아버지가 한 할아버지를 들쳐메고 집으로 들어오셨다. 낯선 할아버지가 길가에 쓰러져 거의 동사하기 직전이었다.
아버지가 이른 시각에 그 할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분은 客死(객사)하셨을 거다. 이렇듯 노상이나 집밖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원한이 깊다고 옛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속에서도 바다에 빠져 죽거나 객사한 사람들이 怨靈(원령)이 되어 산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정성을 다하여 굿을 하였다. 김수남의 사진굿 '魂(혼)'을 보니 수용포의 수망굿과 제주도의 무혼굿 장면이 있는데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굿이다.
아마 이런 원령들을 달래지 않으면 산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믿음은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보편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테면 객사라 할 수도 있는데 더구나 정치적 보복이 부른 죽음이므로 그 원한은 깊이가 이를데 없을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열기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았던 것은 원령의 재앙이 두려워서라기 보다 그 분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 이 나라의 수호신이 되어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대인은 재앙을 막는, 즉 액막이 성격으로서 객사자의 혼을 달래는 여러 의식을 거행하였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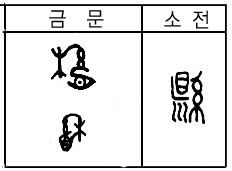
▲ 한자 縣(고을 현) ⓒ 새사연
▲ 한자 縣(고을 현)
| ⓒ 새사연 |
|
'眞(참 진)'은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길가에서 죽은 사람의 모습이다. 제일 위의 모양(화=化의 옛글자)은 쓰러진 사람, 目(목)이 얼굴, 그 아랫부분은 늘어진 머리카락이다. 그림의 소전이 縣(고을 현)인데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사람을 거꾸로 해서 밧줄로 묶어놓은 모습이다. 이 자를 보면 眞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잘 이해가 될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객사한 사람의 모습이 '참되다'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많은 종교가 이야기하듯이, 이승에서의 삶은 찰나이고 허망한 것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하고 참된 세계,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이기 때문이다. 久(오래 구)도 시체를 받치고 있는 모습인 데 역시 죽음이 永久(영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 직후의 모습이 아마 眞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죽음으로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렸다. 왠지 주검으로서의 眞과 진실로서의 眞이 겹쳐진다.
여기에 目(목)을 더하면 瞋(눈 부릅뜰 진)이 된다. 원통하게 죽은 자의 눈을 생각해보라. 臥薪嘗膽(와신상담)과 吳越同舟(오월동주)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는데 오나라 왕 夫差(부차)를 도와 월나라를 제압한 伍子胥(오자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면서 자신의 목을 오나라 입구에 걸어달라고 한다. 죽어서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들어오는 걸 두 눈 부릅뜨고 보겠다고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혼령도 아마 두 눈 부릅뜨고 이 나라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겠다.
단순한 객사자면 원혼을 달래고 양지바른 곳에 장사 지내고 제사를 모시면 충분할지 모르겠으나,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역사적 인물의 원통한 죽음은 단순히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유업을 살아남은 자들이 이룰 때 '解怨(해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