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새 시집을 들고 독자 곁으로 돌아온 시인 신동호.
유수
덩치를 보니 경향각처 장터에서 황소 서너 마리는 거뜬히 제 몫으로 만들었을 법한 씨름꾼이 분명하다. 근데 이것 봐라. 여고생 울리는 속살거리는 시로 열아홉 나이에 일찌감치 등단한 시인이란다. 게다가 손아래인 내게 먼저 악수를 청한다. "당신이 쓴 기사를 잘 봤"단다.
그 씨름꾼 아니, 시인과 죽이 맞아 만난 첫날부터 둘 다 꽁꽁 언 아스팔트를 맨발로 걸어 다닐 만큼 폭음을 했다. 그게 벌써 14년 전 겨울 이야기다. 그 씨름꾼 혹은 시인이 바로 신동호(49)다. 세월은 흘러 갓 서른이던 나는 40대 중반이 됐고, 신 시인은 낼모레면 머리칼에 서리 내린 쉰이다. 망 지천명(望 知天命).
그 14년의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신동호를 만났다. 대부분이 술집이었고, 가끔은 그가 남과 북의 문화교류를 위해 고투하던 공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무실이었으며, 더 가끔은 발 넓은 신 시인이 너나들이로 친한 세칭 '민중 가수들'의 콘서트홀 혹은, 그가 대본을 쓴 뮤지컬 공연장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고등학교 때 <강원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이란 명찰을 달고, 갓 서른에 <겨울 경춘선>과 <저물 무렵> 2권의 시집을 낸 작가다. 헌데, 왜였을까? 만남이 거듭됐음에도 나는 그를 시인으로 느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시인? 혹은, 정열적인 통일운동가?'돈이 되지 않는 것'에 정열을 바치는 것이라면 또래 중 신동호를 따라갈 위인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 중학교 시절부터 '돈 안 되는' 시에 목을 맸고, 대학에 가서는 '돈 안 되는' 학생운동에 청춘의 에너지를 쏟다가 감옥 구경을 2번 했다. 30대가 넘어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는 통일을 위해 집보다는 길 위에서 몸을 눕히는 일이 흔했다.
시인 신동호가 아닌 '통일운동가 신동호'에 관해 여기서 구구절절 시시콜콜 오만가지 사연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다만, 그는 개념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남한에서 출간되던 북한 예술작품의 저작권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또 벽초 홍명희의 손자가 쓴 북한 소설 <황진이>가 남한에서 송혜교-유지태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지는 데 산파 역할을 했으며,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보좌역으로 북한 인사들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를 설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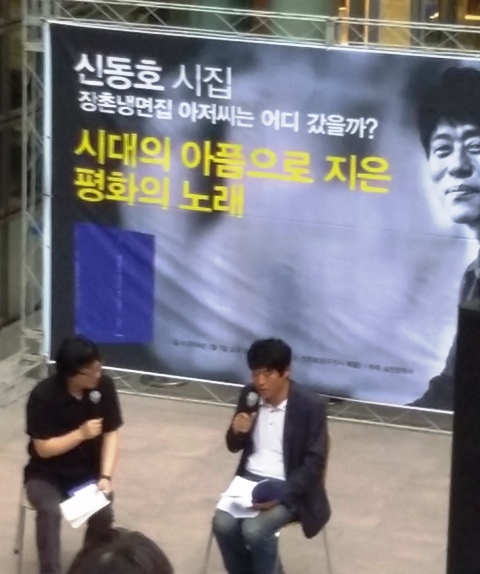
▲지난 7월 1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열린 신동호의 신작 시집 출간기념 북콘서트.
홍성식
지난 주다. '먹고 산다'는 핑계 아래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그와 나. 선배인 그가 후배인 내게 먼저 전화를 해왔다. "시집이 나왔다"고 했다.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한다"고 했다.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왜냐? 난 오래전부터 그가 시인으로 돌아오기를 아니, 살아가기를 바랐던 사람 중 하나였기에.
지난 1일. 대학 시간강사도, 통일운동가도, 인천시장 비서 따위도 아닌 오롯이 시인으로 돌아온 신동호가 교보문고 지하광장에 섰다. 적지 않은 이들의 축하와 꽃다발이 오가는 자리.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를 지켜봤다. 그리고 그날, 내 손에 들어온 책. 자그마치 18년 만에 만나는 신동호의 신작 시집 <장촌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실천문학).
변색하지 않은 시심,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노래꾼

▲신동호의 새 시집 <장촌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
신동호의 새 시집. 고등학교 선배라는 시인 최준의 "이 나라가, 우리 시대가 동호를 시인으로 살지 못하게 했다... 이제는 그대를 그대의 시로 오래 만날 수 있기를 빌어본다"는 표사는 감동적이다. 평론가 김훈겸의 해설 역시 꼼꼼하고 애정이 넘친다.
그러나 시집에서 중요한 건 시. 이런저런 잡설들 다 떼버리고 나는 <장촌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에 실린 시 중 딱 3편의 일부 대목을 아래 옮기고자 한다. 그것이 신동호가 '낡은 시인'이 아님을 실증해 줄 것이기에. 그것 외에 모든 판단은 책을 펼칠 독자의 몫이다.
수줍은 북방의 사내들은 소쩍새처럼 우는 중이다오래도록 눈이 쌓이면 가끔 분 냄새가 그리워지겠지길이 비었다, 반란은 과연 있기나 했던가?- 위의 책 중 '묘향산 小記' 중 일부.신동호는 여전히 길을 묻고 있다. 그건 시인의 권리인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책무다.
국운이 기울자 조선의 의로운 선비들은 신의주에서 강이 얼기를 기다렸다. 만주 망명을 막기 위해 일제가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날, 1919년 10월 7일 일제는 76명의 왕족과 사대부들에게 작위와 함께 은사금을 수여했다. 이른바 '합방공로작'이었다. 일제에게 은사금을 받은 자들이 새누리당의 뿌리다.- 위의 책 중 '사막촌 주막' 중 일부.신동호는 아직도 뜨겁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시는 뜬구름 잡는 신선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메밀꽃처럼 눈이 내리는데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바닷가 물러난 사리 갯벌 어디에서 개불을 잡고 있을까까나리액젓은 현무암 빛깔로 곰삭은 맛을 내고인생도 물냉면 사리처럼 물컹해져버렸는데...- 위의 책 표제작 중 일부.신동호는 타자의 안부를 궁금해한다. 그렇다. 여든둘의 파옹(波翁) 고은은 진작 이렇게 일갈했다.
"남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는 자가 바로 시인이다." 신동호만 그럴까? 나 역시 장촌냉면집 아저씨의 행방이 궁금하다.
장촌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신동호 지음,
실천문학사, 2014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아버지꽃>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 <내겐 너무 이쁜 그녀> <처음 흔들렸다>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공저) <서라벌 꽃비 내리던 날> <신라 여자> <아름다운 서약 풍류도와 화랑> <천년왕국 신라 서라벌의 보물들>등의 저자. 경북매일 특집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