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오가는 북한 주민들.
신은미
조국의 북녘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동안, 제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내용과 실제 북한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을 다섯 차례 여행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올렸습니다. 50여편에 달하는 그 기록은 쌓이고 쌓여 연재가 됐고, 출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의 제안으로 떠나게 된 2011년 첫 여행은 전혀 내키지 않았던 발걸음이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또 제 종교적 신념을 다해 노력해 봐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첫 여행 당시 스스로에게 굳이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사람들은 과연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그 이질감의 골은 얼마나 깊을까?" 등의 호기심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마친 뒤 제게 남은 것은 호기심과 이질감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라는 동질감이었습니다. 동질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의 북한 여행에서 제 관심은 "북한이 얼마나 잘살고 못 사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족적 정서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을까"에 쏠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살고 못 사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동포들이 '이질감'이라는 것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면 통일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새터민이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저는 북한에서 '남과 북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다져진,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민족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무척 당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국의 남쪽에서 어려서부터 받은 반공 교육 때문에 북녘 동포들에게 선입견을 갖고 있던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한동안 당황했습니다. 뿔난 도깨비인 줄 알았던 북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과 북, 우리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활양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질감이라는 것으로 따지자면, 미국이야 말로 우리와는 문화적 이질감이 극에 달한 나라입니다. 동포 중에는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 사회와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럴진대 남과 북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50여 편의 북한 여행기를 써오면서 새터민의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께서 "북한이 받아준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 동포 사이에 이질감이 있다든가, 동질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질감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회복할 동질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양가족 만나러 또다시 북에 갑니다

▲신은미씨가 북한에 두고 온 수양딸 설경이와 수양조카 현수씨.
신은미
누군가 제게 "북한 여행은 당신에게 어떤 여행이었느냐"를 묻는다면 저는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이라고 답합니다. 북한 여행을 통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족애를 느꼈으며, 민족 통일을 염원하게 됐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여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북녘 동포들을 만나면서 조국이 분단돼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현실로 다가와 무척 슬펐습니다. 제가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이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이제 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북한도 제 조국의 일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 제 수양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통일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계속 북한에 갈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말, 열흘 동안 다시 북녘 동포들을 보러 갑니다. 북한의 겨울 풍경, 북녘 동포들의 겨우살이 등을 다시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 전할 계획입니다.
제 기사를 후원해주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통일언론상 특별상 수상의 영광을 10만인클럽 회원님들께 돌리며, 앞으로 편견 없는 북녘 동포들의 소식을 더욱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은미 기자의 연재기사 :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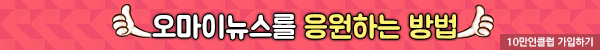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3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공유하기
"아름답고도 슬픈 북한... 또다시 갈 겁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