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12일째였던 지난해 4월 27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리본이 줄지어 있는 모습.
이희훈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의 수심은 약 46m에 이른다. 그 바다에 들어가면 코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 옆으로 쓰러져 있는 세월호 내부는 더 캄캄하다. 세월호는 격실이 많은 배다. 깊은 바다로 잠수한 뒤, 세월호로 들어가 비좁은 격실을 뒤져 희생된 사람들을 찾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일이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세월호 내부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나요? 온갖 부유물이 배 안에 가득합니다. 아이들 유품이라도 찾으려는 부모님 마음을 아니까, 그 많은 부유물도 저희가 다 꺼내왔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손으로 격실 내부를 더듬으며 애기들을 찾았어요. 그러다 내 손에 애기들 육신이 닿으면…."사람을 찾으면 바다 위의 공우영 잠수사에게 통신을 보낸다. 베테랑 공우영 잠수사는 물 속 후배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언하고 격려한다. 선배는 통신 장비로 전해지는 호흡소리로 후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후배는 선배의 말을 들으며 물 밖으로 나온다.
둘의 호흡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 현장에는 선·후배·동료 잠수사 20여 명이 있었다. 이들은 해경의 지시에 따라 조를 편성해 차례로 물속으로 들어갔다. 먼저 들어간 잠수사는 후임자에게 배 내부 상황을 설명하고, 해야 할 일을 전달해야 한다. 아무리 주의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작업이다. 공우영 잠수사가 나서 일을 챙겼다. 기술 전수 등도 그의 몫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해경과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경력이 많고, 후배들도 저를 믿으니까 일을 맡은 거죠. 저는 해경 회의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들이 저에게 세월호 어디 어디를 수색해 달라고 하면, 제가 후배 잠수사들에게 전달하는 식이었죠."잠수사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했다. 초기엔 의료장비와 인력도 없었다. 애초 한 번 잠수를 하면 최소 12시간 정도는 쉬어야 한다. 하지만 찬 바다에 있는 애기들이 마음에 걸렸고, 그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눈에 밟혔다.
"'개집' 안에 시신 쌓아 올려라? 그게 할 소리인가"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루 3~4번 물에 들어간 잠수사도 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데려나올 수도 없다. 어둡고, 비좁고, 물이 꽉 들어찬 세월호. 한 번에 딱 한 명만 끌어안고 헤엄쳐 나올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애기들 끈에 줄줄이 묶어서 한 번에 여러 명 데리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참나…. 아니, 사람이 무슨 굴비인가요? 그렇게 죽은 것도 마음 아픈데, 애기들을 굴비처럼 엮어서 꺼내라고? 가능하지도 않고, 사람이 할 짓도 아니죠!"바다를 모르고, 물속은 더더욱 모르는 사람들의 말과 참견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집'을 제작해 바다로 보냈다. 공우영 잠수사는 개집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 현장에 보낸 철골 제작물. 그 단체장은 여기에 세월호 희생자 여러 명을 넣어 한 번에 끌어 내라는 생각을 전달했다.
공우영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이 철골 구조물을 제작해 구조현장까지 가져온 거예요. 잠수사가 이걸 타고 바다에 들어간 뒤, 애기들을 여러 명 수습해 넣어 한 번에 끌어내자는 거죠. 잠수사 산소 공급줄이 이런 철골구조물에 끼이면 끝장입니다. 게다가 애기들을 이런 '개집'에 차곡차곡 쌓아서 끌어올리자니, 그게 할 소립니까?"해경은 잠수사들은 '모델'로도 활용됐다. 구조 현장에 'VIP'가 뜬 날이었다. 해경은 VIP 동선을 파악해 잠수복 입은 잠수사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앉혀 '배경 그림'으로 활용했다. 고참 공우영 잠수사마저 여기에 동원됐다.
진짜 모욕과 치욕은 따로 있었다. 공우영 잠수사와 후배들은 태풍 탓에 지난해 7월 초 잠시 희생자 수습 활동을 중단했다. 육지에서 장비를 수리·교체하며 다시 바다로 떠날 준비를 했다.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4일 오후 전남 진도해상 '세월호' 침몰 현장을 방문, 민관군 합동 수습작업 중인 바지선에 승선해 잠수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젠 사망 사건까지 책임지라니, 참 이상한 나라""해경에서 '이제 너희들은 희생자 수습작업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들 작업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때까지 희생자 292명을 저희가 수습했는데도 그런 말을 해요. 이광욱 잠수사 사망 책임을 저희에게 떠넘기려는 수순이었죠."공우영 잠수사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순식간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달라졌다. 이광욱 잠수사 사망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후배 잠수사들에게 따로 연락했다.
"공우영을 제외하고 당신들은 다시 돌아오라."대다수 후배들은 이를 거부했다. 국가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험한 바다에 뛰어든 잠수사들. 이제 이들은 맨몸으로 국가에 맞서야 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잠수사들은 조금씩 돈을 보태 변호사를 구했다. 끝을 알 수 없는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해경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사망 사건까지 책임지라니… 국가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요."공우영 잠수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해경이 해군 잠수요원들의 활동을 통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해군은 지난해 4월 30일 공식자료를 통해 "선체 수색을 위한 잠수시간과 잠수 할당순서는 해경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민-관-군 잠수사는 해경의 주도 아래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망한 이광욱 잠수사의 유가족들도 해경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씨의 동생 승철씨는 지난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강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해경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각하했다.
"차가워진 애기들 수습 못한 국가가... 이럴 순 없다"해경 수뇌부 중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바다에 침몰한 암흑의 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더듬어 희생자를 찾아 가족 품에 돌려준 잠수사. 국가는 그 잠수사의 죽음 책임을 동료 잠수사에게 묻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죄를 묻는 거죠?"공우영 잠수사는 깊은 바다에서 막 나왔을 때처럼 깊은 한숨을 토했다.
"국가가 불러서 목숨 걸고 일했는데, 이젠 내 목숨 내놓으라고?"그의 눈빛이 떨렸다. 오랜 잠수를 마치고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도 저렇게 고통스러운 얼굴일까?
"우리 애기들…, 누가 죽였죠? 한 명도 못 구하고, 차가워진 애기들 한 명도 수습하지 못한 국가가 이젠 내 목숨 내놓으라고?"공우영 잠수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애초 10월 1일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코앞에 두고 10월 26일 공판재개로 변경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다시 이를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관홍 잠수사는 분노했다.
"사람 피 말려서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합니다. 재판을 이렇게 길게 끌면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법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주면 좋겠습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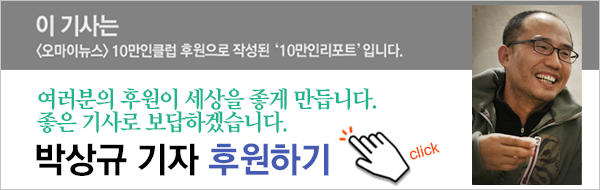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46
공유하기
VIP 뜨니 '병풍'으로 활용... 잠수사들이 당한 진짜 모욕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