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리뷰가 이렇게 어려울 지 몰랐다!
pixabay
먼저, 오마이뉴스에서 이미 영화 리뷰를 쓰고 계신 기자님들의 연재를 찾아서 읽어봤다. 감독이나 배우, 장르 분석 등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실까?" 싶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기자님도 계셨다. 혹은 인문학이나 사회, 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독자적인 분석을 적어내시는 기자님도 계셨다.
연재를 시작하기로 한 이상 나만의 독자적인 주제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기자님들의 연재와 겹치지 않으면서도 좋은 영화들을 찾을 수 없을까? 고민 끝에 미국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가 선정한 <최고의 영화 100선>에서 영화를 골라 리뷰를 써보기로 했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다 잡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연재의 제목은 <이 영화, 드르륵 탁!>으로 정했다. `드르륵 탁`은 2020년 경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쓰이기 시작한 일종의 신조어다. 카세트테이프를 되감아 재생하는 모습을 표현한 의성어인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동적인 대사나 장면 등을 반복해서 언급할 때 쓰인다. 참 재밌는 표현이라 생각했고, 인상깊은 장면과 대사가 있는 좋은 영화를 선별해 리뷰하겠다는 뜻으로 연재 제목에 이 단어를 붙여봤다.
그렇게 야심 차게 시작한 나의 첫 연재. 그런데 웬걸, 열심히 적은 기사가 연이어 이글이글 불타며 끝나면서 나의 도전은 난항에 빠진다(내 연재 바로가기 '
이 영화, 드르륵 탁' https://omn.kr/28za0 ).
처음 쓴 연재는 운 좋게 버금으로 배치되었지만, 그 후 기사들은 연이어 잉걸로 배치됐다. 내 나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고 생각한 기사들이 잉걸로 끝나자 나의 도전 의식은 찬 물을 뒤집어쓴 숱처럼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내 나름 쉬우면서 감동도 있는 리뷰를 쓰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쓰면 쓸수록 알게 되었다. 내 글쓰기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 기사는 다른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마침내 두 손을 든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먼저는 오랜 기간 오마이뉴스를 비롯 다양한 매체에 리뷰를 연재하고 계신 어느 기자님께 조언을 구했다. 기자님은 내 리뷰들을 읽어주셨고 "평론이라고 하기엔 독자적 해석이 부족하고, 기사라고 하기엔 정보전달이 부실하며, 단순 리뷰라고 하기에는 더 매력적인 문장을 쓰려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졸고에 과분한 훌륭한 조언을 보내주셨다.
무엇보다 "오늘의 독자, 즉 한국인들이 이 영화를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화로부터 현재적 의미를 끌어내 중점적으로 전한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 문장을 읽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쓰고 싶은 리뷰를 쓰는데 집중했지, '다른 독자들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조언을 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영화 리뷰에 대한 책이었다. 이미 유명한 평론가들의 평론 모음집과 영화 글쓰기를 주제로 한 책들을 몇 권 읽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쉽게 읽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책은 강유정 평론가가 쓴 <영화 글쓰기 강의(2019)>라는 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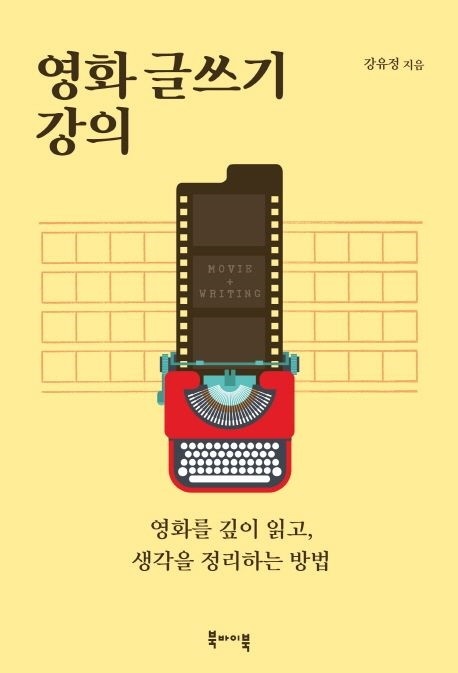
▲<영화 글쓰기 강의> 표지
북바이북
저자인 강유정 평론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2005년부터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학 교수를 거쳐 정치계에 입문하여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저서에는 그는 10년 넘게 평론가로 활동하며 어떻게 영화를 깊이 읽고 생각을 정리해 왔는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책을 읽으며, 나는 내가 영화 리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덤벼들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내가 딱 그랬다.
"영화 글쓰기란 영화와 글쓰기의 합성어이다. 영화 글쓰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화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글을 쓰는 데, 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까? 영화를 보고 나서 글을 써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영화를 보고 난 이후의 느낌이나 감상을 글로 써보고 싶어 끄적거려 본 사람이라면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전자책 21쪽)
저자는 영화 글쓰기에 꼭 들어 있어야 하는 핵심적 내용은 영화에 대한 나만의 분석이라고 말한다. 영화를 보고 글을 쓰는 것은 수백만, 수천만 관객들이 공유하는 그 영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기에 영화 글쓰기는 결국 `나`의 글쓰기라는 이야기였다.
책을 통해 한 가지 더 배운 것이 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나는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는 리뷰를 싫어했다. '좋은 글은 누가 읽든 알기 쉬운 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화 리뷰는 좀 다르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작가들이 글을 쓸 때는 이상적인 독자, 즉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지를 설정하고 글을 쓰는데, 영화 리뷰를 읽는 독자는 영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었다. 이미 영화를 본 후, 해당 영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각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리뷰의 독자이다. 리뷰에 영화의 화면과 서사, 연출을 분석한 전문 용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리뷰를 쓰는 게 더 무서워졌지만, 그래도

▲이 연재 계속해야 될까? 찢고 쓰기를 반복했다.
pixabay
무식했던 내가 여기까지 알고 나니 리뷰를 쓰는 게 더 무서워졌다. 나의 얄팍한 지식이 금방이라도 들통날 것 같았다. 심지어 한국 관객이 아닌 미국 관객들에게 인정받은 영화들을 리뷰 대상으로 고르고 있었으니, 한국의 매체에 내가 이 리뷰를 투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다.
그러면 이대로 중도 하차 할까? 아니지. 그래도 한 번 시작한 연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 그래서 마지막 작성한 기사가 이것이다(관련 기사: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왜 하필 87km를 걸었을까? https://omn.kr/297ul ).
내 나름 다른 기자님들의 조언과 책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열심히 작성했지만 이 기사 역시 잉걸로 배치되었다(하지만 인정하자, 이게 지금의 내 실력이다).
그래도 덕분에 여러가지를 배웠다. 좋은 리뷰를 쓰기 위해서는 영화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는 옛 현인의 말은 영화 글쓰기에 있어서도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가지를 결심했다. 첫째, 언젠가는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독창적인 리뷰를 쓰는 사람이 되겠다. 둘째, 앞으로도 읽고, 쓰고,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이글이글 불타는 연재를 통해 내가 얻은 큰 수확이다.
혹시나 나처럼 영화 리뷰에 도전하고 싶은 기자님이 계시다면, 나의 이 연재 도전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저의 연재글을 읽어주셨던 독자님들, 저는 더 잘 준비해서 좋은 영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윌비백!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7
사랑을 두껍게 할 글쓰기를 꿈꿉니다. Matthew 22:37-40
공유하기
영화 리뷰 쓰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