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로수용소 상징 조형물 ⓒ 안병기
통영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14번국도를 타고 거제대교를 건너 포로수용소터가 있는 신현읍에 닿았다. 이곳 고현리 등 거제도 일원에 있었던 거제 포로 수용소는 중공군 포로 2만, 인민군 포로 15만 등 최대 17만 명의 전쟁포로를 수용하였던 역사적 장소다. 경상남도는 1983년 이곳에 유적관을 짓고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하였다.

▲디오라마관. 당시의 상황이 리얼하게 재연되어 있다. ⓒ 안병기
포로 수용소 유적관에서 만나는 첫번째 전시관인 탱크 전시관을 지나면 디오라마관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포로들이 화장지 대신 짚을 똘똘 뭉쳐서 용변을 처리하는 모습 등 당시의 생활상이 거의 실제에 가깝게 재현되어 있어 보는 이들을 무척 실감나게 한다.
6.25 역사관을 지나 다리를 건너면 포로수용소 게이트가 나오고 뒤미처 중공군,친공, 반공 포로의 막사가 이어진다.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들이 서로 서로를 살육살상하던 끔찍한 역사가 적나라하게 재현된 유적관들을 바라보노라면 이념이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경악하게 된다. 그렇게 유적관의 맨 끝에 이르게 되면 만나는 잔해가 바로 거제 포로 수용소소의 잔존 건물이다.

▲거제 포로 수용소소의 잔존 건물 ⓒ 안병기
이 잔존 건축물을 빙 둘러보며 나는 김수영 시인을 떠올렸다. 1975년 민음사에서 나온 그의 첫 산문집 <시여, 침을 뱉어라>를 처음 읽었을 때 "시를 쓴다는 것은 온몸으로, 온몸으로 밀고나가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시의 형식이다"라는 그의 말은 문학을 좋아했던 스물 한 살의 청년이었던 내겐 존재의 근원을 흔드는 뇌성벽력이었다. 그도 이곳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김수영 <푸른 하늘을>
이곳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시인은 이념이란 얼마나 처절하고 잔혹한 것인가를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도 함께 터득하게 되었으리라.

▲해금강 지도 ⓒ 안병기
버스는 구비구비 만경인 북병산을 오르내리더니 와현 선착장에다 사람들을 쏟아놓는다. 거기서 해금강으로 가는 유람선인 환타지아 2호를 탔다. 배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 서로 맞붙은 동도와 내도 두 개의 섬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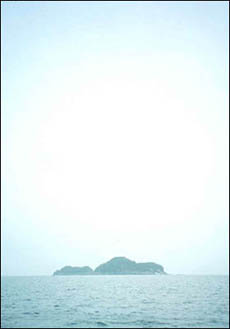
▲동도.내도.내도에는 주민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 안병기
동도와 내도를 지나쳐가자 이윽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명승 제2호인 반달 모양의 섬 해금강이 반달처럼 솟아 오른다.

▲선상에서 바라 본 해금강 ⓒ 안병기
배가 해금강으로 슬슬 다가가자 키 큰 바위 하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은진미륵 바위다. 잠시 뒤 배는 제 이물을 요리조리 틀어대더니 해금강 최고의 비경인 십자동굴로 들어갔다. 순간 아, 하는 사람들의 탄성이 절로 터져나왔다.

▲해금강 은진미륵 바위 ⓒ 안병기

▲해금강 사자바위 ⓒ 안병기
배는 동굴을 빠져나와 섬을 섬을 한 바퀴 돌아나온다.그리고 선녀바위, 사자 바위 등을 지나쳐 남국의 파라다이스라는 외도로 향한다.

▲선상에서 바라 본 외도 ⓒ 안병기
먼 수평선상에서 외도가 다가왔다. 1970년대 이전의 외도는 척박한 바위투성이 섬이었다고 한다. 전화나 전기도 들어 오지 않았으며, 기상이 악화되면 교통이 두절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창호 최호숙 부부가 이 섬에 들어와 30여년간 공들인 결과 비록 개인 소유의 섬이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 외도 해상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지금의 아름다운 외도를 이룬 것이다. 이국적 정취를 자아내는 외도의 풍경이 무척 싱그러웠다.

▲인공적으로 조형된 외도의 향나무 ⓒ 안병기

▲외도의 코코스 야자나무들 ⓒ 안병기

▲외도의 유카나무 ⓒ 안병기
섬 꼭데기를 향하여 올라가다가 맨 먼저 만난 것이 인공적으로 조형된 외도의 향나무였다. 그 맞은편 언덕엔 코코스 야자가 늘어선 길이 있었다. 고구마같은 구근(球根)이 달려 있어 아마존 사람들의 식량으로도 유명한 유카나무나 이성복 시인의 시에 나오는 호랑가시나무, 이른바 '천국의 계단'에 줄지어선 편백나무 방풍림, 여덟 개의 손가락 처럼 생긴 팔손이 나무, 천연기념물 제91호로 지정된 내장산 특산 상록 활엽수인 굴거리 나무 등 수목들이 제 풍모를 뽐내고 있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외도의 동백나무 꽃 ⓒ 안병기
외도에는 이곳 저곳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참 많았다.그러나 외도의 동백나무들은 이제 막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동백이 만개하면 이 섬은 동백꽃 만다라를 이룰 것이다. 1시간 반 가량의 외도 관광을 마치고 다시 환타지아 2호를 올랐다.

▲환타지아 2호 가이드인 김정찬 씨. 높낮이가 없는 경상도 사투리가 재밌다. ⓒ 안병기
1년 남짓 환타지아 2호의 가이드를 했다는 김정찬씨는 참 말솜씨가 구수했다. 높낮이 없는 억양에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그는 거제도 토박이란다. 그가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태양도 바다 위에 붉은 양탄자를 드리우며 지고 있었다.
다시 버스를 탔다. 버스는 해안도로를 구비구비 지나서 학동 몽돌 해수욕장에 내려놓는다. 아마도 오늘 밤은 이곳에서 일박할 모양이었다. 저녁을 먹고나서 모래 대신 파도에 씻겨 반질반질한 몽돌이 깔린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연주하는 散調(산조) 한바탕이 가슴을 파고든다. 때로는 중중모리 가락으로 때로는 청승맞은 진양조로 다가온다.
그 소리 가운데 하나를 베개삼아 잠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