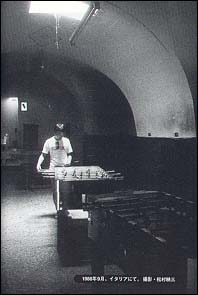
▲<노르웨이의 숲>의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 소학관
<노르웨이의 숲>을 읽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없다. 보통의 문학 혹은 잡지, 인터넷의 글들을 읽을 때도 준비라는 것은 그다지 필요치 않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모니터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된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준비를 한다. 브레히트를 읽기 전에 반드시 그의 빛나는 비유를 미리 생각해 보듯, 보르헤스를 읽기 전에 시간과 공간의 디멘션(dimension)을 떠올리 듯, 그리고 인터넷의 어떤 사이트를 들어갈 때 그 사이트의 특성에 대해 웬만큼 알게 되는 톱 페이지를 마주하듯.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재정립되어 독자, 유저들의 뇌속에 자리잡는다. 이성은 그다지 준비를 명령하지 않았으나, 대상은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이성>이 되어 독자들을 준비시킨다.
<노르웨이의 숲>을 9번째 읽은 지금도, 처음 읽은 7년전도 준비없이 막 책장에서 꺼내들어 첫페이지의 37살 청년의 자화상부터 읽어 내려간다. 추가된 캐릭터 미도리는 전공투 세대를 유유히 비판하고, 삶의 정의를 일찌감치 파악한, 하루키의 자화상이 되어 버린 20살 청년은 겉멋과 포장술로 철저히 독자와 거리를 둔다.
도대체 와타나베에 동화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수 있을까? 그 소설적인 캐릭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묘하게 이끌어내는 허무함과 명쾌함. 그리고, 스타일리즘.
잘된 문학 작품이나 영화는 읽을 때마다 매번 느낌이 틀린다. 그리고 그런 작품을 볼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 이번에는 다른 느낌을 받아야지. <대부>가 그랬고, <보니앤클라이드>가 그랬고, 고리키의 작품들이 그러했으며, <더블린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숲>은 언제나 준비하지 않은 그 순간. 책장속에서 나와 나의 손가락 사이에서 한장 두장, 너풀거리며 넘어간다. 마침 미도리의 펠라치오와 레이코의 주름살이 보이는 귀절이라면 더더욱 금상첨화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 다가와서 몇시간이고 읽게 만드는 마력. 9번을 읽어도 똑같은 감정선을 유지시키는 작품. 연애소설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아쉬운 <노르웨이의 숲>. 그렇게 와타나베는 나이를 먹고 있고, 나역시 나이를 먹어간다.
<키즈리턴>이 20대의 희망을 보여주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술회한다면, <노르웨이의 숲>은 20살의 암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도대체 20살에 무엇을 하며 살아갔던가? 나오꼬도 미도리도, 레이꼬도 만나지 못했던 20살. 심지어 아쓰미 같은 선배의 멋진 여자 친구와 술한잔 할 수 없었던 그 20살. 편지할 상대조차 없었던 그 20살 시절.
교정에서 <노르웨이의 숲>을 읽고 있으면, 선배들이 다가와서 한마디씩 했었다. 대부분이 그런 말들 이었다. 뭐하러 그런 3류 쓰레기 같은 소설 읽냐고. 하루키 읽을려면 차라리 <태엽감는 새>나 읽어라(근데 태엽감는 새나 노르웨이의 숲이나 비슷비슷하던데?) 같은 말들.
하긴 나도 미도리의 학내서클 이야기에서는 열받았었다. 그런 통속적인 인물들이 운동하니 데모하니 하니까.. 전공투가 망했지. 우리는 틀리다. 한국의 운동권은 틀리다...라고 비아냥 거렸던 20살의 기억들. 그리고 한번 읽고 넘긴 그 <노르웨이의 숲>은 어디에도 있었다. 학교 도서관에도, 내 책장에도, 심지어 군대에도.
읽을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번이고 다시 읽으면서도 여전히 감정선은 살아 있다. 기억속에서 떠오른 20살의 희미한 환영 속에 겹쳐지는, 21살의, 22살의, 23살의, 24살의, 25살의, 26살의, 그리고 27살의 내 자화상. 그러나 그 자화상은 와타나베의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나는 그에게 동화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여전히 미도리는, 나오꼬는, 레이꼬는 여전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도리는 나를 향해 말을 걸고 있고, 나오꼬는 초원에서 나를 위해 페팅을 하고 있고, 레이꼬는 나를 위해 <미셀>을 연주하고 있다는 그 느낌.
앞으로도 몇수십년이 지나도, 레이꼬는 나를 위해 <미셀>을 연주해 줄것이라는 안도감. 그것때문에 다시 <노르웨이의 숲>을 꺼낼 것 같다. 고독하고 외롭고,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그때, 원인은 그렇지만, 물론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고 다시 책장을 정리한다면 또 나는 그녀들을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안도하겠지. 적당한 부분만 발췌해서 몇장 넘기고, 다시 적당한 부분을 발췌해서 몇장만 넘기더라도. 나오꼬의 죽음은 슬프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그녀들은 나를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노르웨이의 숲>과 <미셀>이 듣고 싶은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