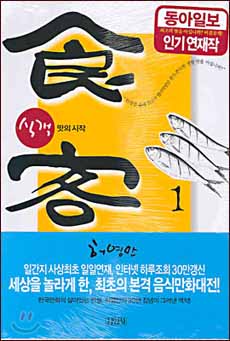
ⓒ 김영사
미식을 즐기는 행복한 사람이건, 악식에 찌들린 불행한 사람이건, 누구나 '맛'과 관련된 추억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기자 역시 그렇다. 지금은 거의 판매하지 않는 분홍빛 소시지. 돼지고기와 닭고기 함유량에 비해 밀가루와 방부제 함량이 턱없이 높았던 둥글고 커다란 도시락 반찬용 소시지는 그것의 맛과는 상관없이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웃음을 준다.
"탕탕"거리는 엄마의 도마소리를 들으며 깨어나는 아침.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함께 분홍빛 소시지가 밥상에 오를 때면 기자는 그때마다 과식을 했다. 그릇에 푼 계란을 겉에 발라 구운 그 소시지의 냄새와 혀에 닿을 때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다.
여전히 기억되는 그 냄새와 감촉은 지금은 떨어져 사는 탓에 1년에 두어 번밖에 볼 수 없는 엄마를 떠올리게 하고, 엄마가 떠오를 때면 지금의 나를 키운 것이 돈이 아닌 새벽녘부터 도마를 두드리던 엄마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허영만(56)의 만화 <식객 1·2>(김영사)은 바로 이 맛에 대한 추억에 기대고 있는 책이다. '그 어떤 것보다 맛에 대한 기억이 가장 오래간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허영만은 '고추장 굴비'와 '전어' '부대찌개'와 '곰탕' 등의 먹거리를 통해 독자들을 가난했지만 아름다운 시절로 데려간다. 비단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잘 지은 밥 한 그릇에 멀건 무국만으로 행복했던 기억들.
<식객 1>에 '어머니의 쌀'이란 소제목으로 실린 만화는 특히 기자를 자극한다. 찢어지는 가난 때문에 아들을 버려야했던 엄마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해외로 입양된 아들. 장성한 아들이 한국을 찾아 어린 시절 주머니에 두고 씹어먹었던 생쌀의 기억을 매개로 엄마를 찾는다는 설정은 눈물겹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니다. 가난을 파탄만으로 몰아가지 않는 허영만의 특유의 낙천성 탓이다.
1974년 한국일보 신인만화공모전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한 허영만은 <벽>과 <오! 한강> 등 사회성 짙은 만화들을 발표하며 한국만화 소재의 폭을 넓혔고, 그의 90년대 작품인 <비트>를 비롯 <아스팔트 사나이> <마스터 Q> 등은 영화나 TV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박경리가 연애소설을 썼다?
- <성녀와 마녀> 단행본으로

ⓒ 인디북
조강지처를 버리고 연상의 여자와 결혼한 아버지. 그럼에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한 채 그의 아이를 낳길 원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며 '나는 절대 남자 앞에서 무릎 꿇은 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딸.
일견 신파극의 줄거리 같은 위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딸'은 다름 아닌 <토지>의 작가 박경리(76)다.
"슬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문학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박경리의 초기작품이 사랑의 낭만성과 서정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그의 유년체험 때문이 아닐지. '남녀의 사랑이란 맹목적일 수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1960년 여성지 연재 당시 적지 않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소설 <성녀와 마녀>(인디북)가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박경리가 쓴 거의 유일한 연애소설이자 그의 초기작품 경향과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녀와 마녀>는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사랑과 갈등, 증오와 재회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성녀 혹은 마녀가 존재하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미려한 문장과 치밀한 구성은 박경리 문학의 힘이 이미 43년 전에 발원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아, 코를 찌르는 찔레꽃 향기
- <2003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 해토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이효석문학상'의 2003년도 수상작과 후보작들이 작품집으로 묶였다. 4회째를 맞는 이 문학상의 올해 수상자는 <은어낚시통신> 등으로 독자들에게 익숙한 소설가 윤대녕. 수상작은 '찔레꽃 기념관'이다.
유년 시절 온통 찔레꽃으로 둘러싸인 이발소에서의 추억을 삭막한 현대도시의 오피스텔 속으로 끌어와 '절망과 상실은 왜 이토록이나 질기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것일까'라고 묻는 '찔레꽃 기념관'은 심사위원인 김병익과 이청준으로부터 "따뜻한 시선으로 슬픔의 문을 열어 보이며 낮고 누추해진 우리네 삶을 위무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께 실린 수상후보작 중에도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다.
문학기자로서 일가를 이루고 이제 펜 끝을 소설로 돌린 김훈의 '화장(火葬)'은 존재한다는 것과 사라진다는 것의 장엄한 문제를 미세한 문체의 세밀화로 그려냈고, 이승훈의 '심인 광고'는 독특한 구성법과 세련된 문장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김영하와 한강, 최시한 등의 작품이 실렸다.
바람에게서 배운 언어
- 장철문 신작시집 <산벚나무의 저녁>

ⓒ 창작과비평사
바람만큼 자유로운 것이 세상 어디에 있으랴. 사람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땅의 경계와 깊이 모를 바다까지 무시로 넘나들며 낮은 휘파람 소리로 떠도는 바람. 그 바람이 '내 살갗에 와서 태어난다'고 말하는 장철문(37)이 시집을 냈다. 제목하여 <산벚나무의 저녁>(창작과비평사). 전작 <바람의 서쪽> 이후 2번째다.
불교도시 미얀마에 머물다 돌아온 장철문은 이번 시집에서 '바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이 과거와 현재를 노래하는 동시에 미래까지 예측하고 있다.
정처와 발원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바람의 가장 큰 특성. 장철문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할머니와 큰형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 삶의 정처없음과 비의(悲意)를 자신 역시 겪을 것이란 걸 담담하게 수긍한다.
그런 까닭에 시집에 수록된 '할머니의 봄날'과 '쌀밥'은 상실이나 눈물이 아닌 또 다른 희망으로 읽힌다. <산벚나무의 저녁>을 접한 박형준 시인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야말로 장철문의 미덕"이라며 동료의 출간을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