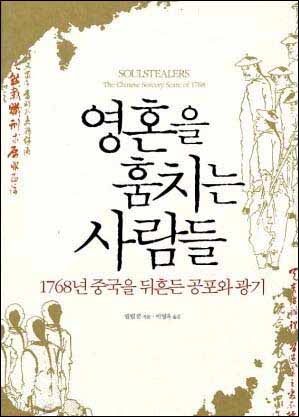
ⓒ 책과함께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필립 쿤 지음, 이영옥 옮김, 책과함께 펴냄)의 번역 원고를 읽은 건 탄핵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3월 말이었다. 그 무렵에는 1987년 6월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2002년 월드컵 때의 광화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중파 방송에서 연일 탄핵에 분노한 광화문의 사람들을 '그때'의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건 광화문에 나가지 않거나 분노가 치밀지도 않는 사람은 분위기상 위축되었다.
2004년 3월 광화문, 탄핵에 분노한 사람들이라고 뭉뚱그려지는 그들의 분노는 모두 같았을까? 혹 같은 생각과 같은 꿈, 같은 기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편한 의심을 품고 있던 중에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을 읽은 것이다. 책은, 절대적으로 옳은 무엇이 있기라도 한듯 한곳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겹쳐 읽혔다.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은 1768년 중국 청나라를 휩쓴 어떤 소문에 대한 이야기다. 요술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변발을 자른다고 했고 자른 변발에 마술을 걸어 영혼(말 그대로 '영혼soul'이다)을 훔친다고 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당시 유럽 전체의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던 중국 전역에 퍼졌고 황제가 사는 자금성 안까지 흘러들었다. 황제 건륭제는 변발을 자르는 요술은 만주족인 청나라에 대한 모반 음모라고 확신하여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을 훔치는 요술은 정치 범죄가 되었다. 황제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사건이었지만 '반란을 획책하는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다.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은 거대한 광기에 휩쓸린 1768년의 중국에 섬세한 렌즈를 들이댄다. 하버드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저자 필립 쿤의 렌즈에 잡힌 것은 누군가에게 '영혼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집단 광기이며 누명을 쓰고 죽어간 억울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역사는 이 시절을 '태평성대'라고 기록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의 저자 필립 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혼을 훔치는 일은 백성들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개인적인 공포였지만 황제에게는 모반의 조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야 했던 관료들에게는 평온한 일상에 들이닥친 폭풍과 같았다.
저자는 공포와 광기에 휩쓸린 1768년의 중국을 찬찬히 살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에게 태평성대는 무엇이었는가? 요술에 대한 두려움은 떠도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을까? 공포와 광기는 삶의 배출구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폭력이 용인되는 해방 공간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료들이 혹시 분주한 게으름을 부린 것은 아닐까? 건륭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산시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광기에 휩쓸린 중국을 들여다본 후에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통치자들은 대중들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무시무시한 힘으로 바꿀 수도 있다."
저자를 따라 2004년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나에게 1987년은 무엇이었을까? 누군가가 그 시간과 공간을 회수해간 것은 아닐까? 2004년 봄 광화문에서 우리는 같은 꿈을 꾸었을까? 그 두려움과 광기를 무시무시한 힘으로 바꾼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