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개암사 대웅보전의 문창살 ⓒ 윤돌
부안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보리밭과 유채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보리가 예쁜 줄 몰랐다. 시골에서 자란 덕에 주위에서 흔히 보아서 그랬을까? 세상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일까? 하긴 요즘 느끼는 아름다움을 어릴 때 느꼈다면 난 매일 감탄사를 연발하며 다녀야 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나는 참 행복한 유년을 보냈다.
시골집 건너편 밭에서 자라던 보리가 생각난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선 보릿고개란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굶지는 않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끼니를 보리나 다른 것으로 때우는 경우가 꽤 있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의 도시락을 보더라도 꽁보리밥을 싸오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다.
내 삶의 반도 오지 못한 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던 이야긴데", "노인네 같은 소리를 하네"하고 친구들은 먼 과거 일처럼 이야기한다. 내심 그런 친구들에게 속으로 '니들이 뭘 아냐'하면서 씩 웃는다. 이런 내가 시간의 벽을 넘어 다시 보리밭을 대하니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아직 푸른빛이 많은 보리는 낱알을 가득 품고 부안의 넉넉한 들녘에 서 있다. 간혹 바다에서 시작된 바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를 감듯 부드럽게 고개를 살랑인다. 잘 여문 보리밭처럼 바다와 산과 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 자연이 주는 혜택이 풍요로운 땅. 부안은 그런 곳이다.

▲예전엔 몰랐다. 보리밭의 아름다움을 ⓒ 윤돌
내소사 전나무 길만은 못하지만 개암사 진입로도 꽤나 괜찮은 길이다. 좌우로 늘어선 소나무가 그렇고, 코끝으로 스며드는 소나무 향이 그렇다. 소나무 숲길을 걸을 때마다 몸과 마음에 묻혀 온 도시의 찌꺼기들이 발걸음을 따라 땅으로 곤두박질친다.
숲길에 취해 한참을 걷다보면 오른쪽으로 작은 삼나무 숲이 나타난다. 폭신한 낙엽이 쌓인 작은 숲에 들어가 곧고 높은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본다. 하늘이 주는 따스한 햇살과 기운을 받아내니 행복이 마음에 충만하다.
또 얼마를 걸었을까? 길 왼편으로 무심히 부도 두 기가 있다. 출입을 금하는 담장은 없지만 나무 두 어 그루가 시선의 다가섬을 적당히 막아주고 숲에 포근히 안겨 있다.
개암사는 돌로 높다랗게 쌓아올린 축대 위에 자리한다. 다가설 때 높은 축대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법당을 살짝 가려주며 신비롭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축대를 오르는 계단을 하나둘씩 오를 때마다 법당의 지붕과 처마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래쪽 축대를 오르니 넓은 뜰이 펼쳐진다. 가운데로 능가산 골짜기에 포근히 안긴 대웅보전이 보이고 좌우로 건물 몇 채가 더 있다.

▲능가산 골짜기에 포근히 안긴 대웅보전. 멀리 울금바위가 보인다. ⓒ 윤돌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기와와 처마, 층층이 조각된 화려한 공포, 많은 정성이 배인 문창살, 당당하게 떡 버티고 선 기둥 등 대웅보전은 격식과 위엄,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전각이다. 그렇지만 제 잘난 멋에 거들먹거린다거나, 권위로 주위 전각을 압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기품이 느껴지지만 수수하고 소박하며, 요란하지 않은 정겨움이 있는 것이 개암사 대웅보전이다.
대웅보전은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 건물로 사방에서 보는 모습이 모두 특색 있다.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 당당함과 의젓함이라면 측면에서 보는 모습은 세월의 흐름과 빈틈이 엿보이는 격없는 공간이다.
대웅보전의 뒤쪽 공간으로 이동하면 대웅보전의 지붕을 굽어보며 개암사 경내와 주위 풍광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왼쪽 출입문 주위 공간은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연스럽고 웅장한 기둥 사이에 난 문의 문틀은 근대에 들어 만든 흔적이 엿보이고, 문짝의 창살은 두어 개가 부러져 있다.
부러진 문창살은 성격 급한 아이들이 문고리 대신 잡아채다 그런 것일까? 거센 바람 때문에 벽에 부딪혀 부러진 것일까? 문틀 아래 나무의 덧댄 자국은 나무의 옹이 때문에 그런 것일까? 나무가 갈라지면서 떨어진 것일까? 문 오른쪽으로 페인트 자국 같은 것은 단청을 칠하다 묻은 것일까? 풍경화를 취미로 하는 스님이 있어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로 물감을 엎지른 것일까? 문의 손잡이를 밖에서 걸어놓아 잠그고 반대편의 출입문을 열어 놓았는데 스님들은 이 문으로 드나들지 않고 반대편으로만 드나드는 것일까?
기둥 옆에 단정히 서 있는 저 빗자루에서는 동틀 무렵 대웅보전을 청소하는 스님이 모습도 보인다.
두 평 남짓한 벽면에서 이리도 많은 궁금증과 이야기들이 떠오르다니 놀랍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굳이 알지 않아도, 혹은 모르는 만큼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보물 몇 호, 정면 세 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자연스러운 주춧돌, 이렇듯 수식이나 형식을 조금 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눈과 마음으로 다가서는 모습과 감흥을 받아낼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여유롭지 못하고서야 아는 만큼 볼 수나 있을 것이며, 보는 만큼 느낄 수나 있겠는가? 아! 나는 두 평 반 공간에서 부처님 덕분으로 두 평 반의 진리를 얻은 셈이다.

▲별것? 아닌 대웅보전 왼편 출입문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 주머니다. ⓒ 윤돌
대웅전을 마주하고 오른편으로 발길을 옮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돌계단으로 시작하는 숲길이 펼쳐진다. 혼자 올라도 외롭지 않으며, 벗과 오르면 더욱 좋은 그 포근한 숲길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숲길에 들어서면 주위 소란은 잦아들고 숲은 나를 안는다. 순간, 그 길은 지친 마음과 몸을 보듬는 평안의 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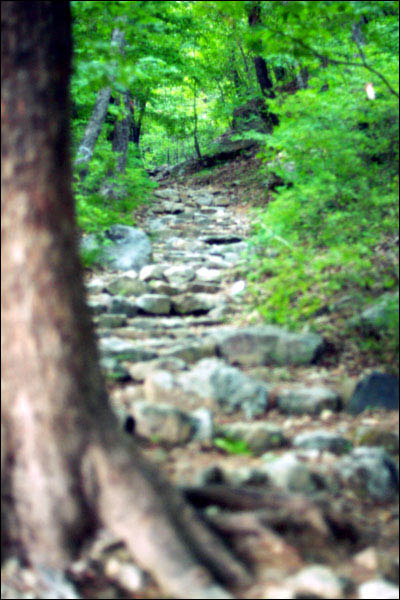
▲개암사 뒤편으로는 평안의 길이 펼쳐진다. ⓒ 윤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