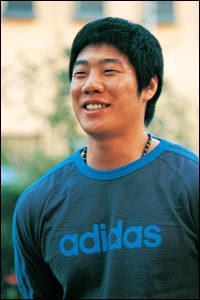
▲선수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을 가로막는 체육계의 관행 때문에 작년에는 대회에 출전하지도 못했던 이세원씨.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후 2004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 인권위 김윤섭
2004년 10월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신흥고등학교 체육관. 이곳에서 제85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역도 일반부 85kg급 경기가 열렸다. 경북대표(경북개발공사)로 참가한 이세원(24) 선수는 이날 인상 종목에서 162.5kg을 들어 올린 데 이어 용상 종목에서도 195kg을 성공시켜 합계 357.5kg의 기록으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이 선수에게는 전국체전 세 번째 우승이자, 꿈에도 그리던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대기만성형 선수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씨름선수였다. 씨름판이 점차 거인들의 축제로 바뀌면서 체격에 부담을 느낀 그가 새롭게 선택한 종목이 바로 역도였다. 여기에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역도부에 들어가자 아예 학교로 들어가서 직접 선수들을 가르쳤다. 이런 이유로 오늘의 영광을 모두 아버지의 공으로 돌린다.
"체중도 안 나가고 특별한 자질도 없던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호된 질책 때문이었어요. 조금 지친다 싶으면 언제나 저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코치 선생님 같다가도,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지곤 해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는 늘 2~3위권을 유지했다. 1등은 항상 그의 동료이자 라이벌의 차지였다. 그는 대학진학 과정에서도 시련을 겪었다.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대학은 체급별로 한 명씩만 선발했고 거기엔 그의 친구가 뽑혔다. 이렇게 해서 쓰라린 상처를 달래며 고향의 실업팀과 1년 계약을 맺고 입단했는데, 이것이 뒷날 이 선수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남기게 된다.
한국 체육계에는 오랜 관행이 있다. 이른바 선수가 팀을 옮기기 위해서는 전 소속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이런 관행이 선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노비문서'라고 줄기차게 비판해 왔지만, '갑(甲, 계약서상에서 계약 상황을 만드는 주체)의 횡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고자 나섰던 선수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프로야구의 임선동 선수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재판까지 벌이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으나, 소송을 위해 선수생활을 중단했던 기간은 고스란히 상처로 남았다.
고등학교 때 입도선매한 선수가 스카우트 분쟁에 휩싸이거나 눈물을 머금고 해외진출을 포기할 때마다 한국 체육계의 해묵은 관행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소모적 논쟁은 있었을지언정 상생의 해법은 없었다.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체육계의 관행은 뜻밖에도 한 비인기종목 운동선수의 문제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물꼬', 뜻있는 체육인들은 이세원 선수의 이적 결정을 그렇게 평가한다.
이세원 선수. 그는 계약서대로 1년 동안 소속팀에서 뛰다가 군에 입대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와 소속팀의 계약이 이 순간부터 무의미하다. 이 선수는 이런 판단에 따라 제대 후 경북개발공사에 입단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전 소속팀은 그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소속이 없는 무자격 선수로 전락하며, 공식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 선수가 2003년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도 솔직히 고향팀에서 뛰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팀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성적이 좀 나오니까 '소속 선수'라고 주장하는 것도 많이 서운했고요. 좋은 감독님 밑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싶은 생각에서 팀을 옮기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방법이 없구나 싶을 때 감독님의 도움으로 국가인권위를 찾게 됐습니다."
2003년 4월, 군에서 제대한 그는 소속팀도 없이 운동하면서 마음고생을 했다. 6월에 열린 2003한국역도선수권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관중석에서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에게 꿈에도 그리던 이적동의서가 전달됐다.
'이세영 선수의 이적을 허용한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전 소속팀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선수의 소속팀을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공표된 지 불과 8일만에, 전 소속팀은 이 선수에 대한 이적동의서를 발급한 것이다. 한편 이 무렵 문화관광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2003년 3월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일반지침'을 폐지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감독님은 잘될 테니 걱정하지 말하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많이 불안했습니다. 동의서가 없어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직접 겪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국가인권위가 뭐 하는 기관인 줄도 몰랐는데, 이젠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국가기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선수는 10월 말 난생 처음 태릉선수촌에 입촌했다. 말로만 듣던 고된 대표팀 훈련 프로그램으로 날마다 파김치가 되고 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볍다. 전국체전을 통해 부동의 한국랭킹 1위를 확인한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아들을 오랫동안 믿고 뒷바라지해 준 아버지께 값진 금메달을 선사한 것이 뿌듯하기만 하다. 이제 그의 목표는 2006년 아시안게임과 2008년 올림픽이다. 벌써 10여 년째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 역도. 그는 또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바벨을 움켜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