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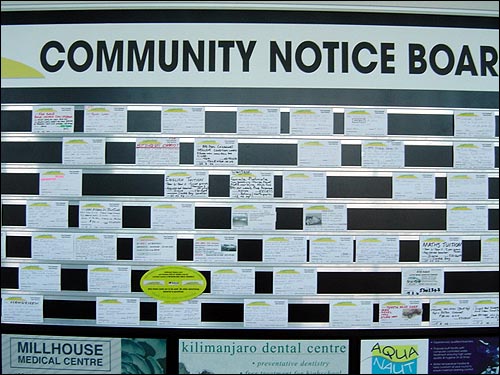
▲슈퍼마켓 입구에 있는 커다란 게시판은 매우 유용한 광고판이다. ⓒ 정철용
동네 곳곳에 '쓰던 물건 사세요!'
이 곳 사람들의 검소한 문화는 옷차림에서뿐만 아니라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아껴 쓰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동네 상가나 슈퍼마켓 입구의 게시판에는 언제나 자신이 쓰던 자전거나 책상, 식탁 등을 팔려는 사람들의 광고 쪽지가 가득하고, 지역 신문에는 항상 그 주의 주말에 게라지 세일(garage sale)을 하는 집의 주소와 그 집에서 팔고자 하는 대강의 물품 광고가 실려 있다.

▲그 광고판에는 밥통과 같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심지어는 팔려고 내놓은 집도 등장한다. ⓒ 정철용
게라지 세일은 말 그대로 그 집의 게라지(차고)에서 그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내놓고 파는 것인데, 우리 가족이 처음 이 곳에 이민 와서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구경하고 다니던 때에는 주말 아침에 게라지 세일하는 집들 몇 군데를 순례하는 게 작은 즐거움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팔려는 물건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낡아빠진 소파나 찌그러진 부엌 소품들, 깨진 곳이 있는 장식품들, 녹슨 정원 손질 기구들, 허름한 옷들, 오래된 음악 테이프나 책들이어서 물건의 풍요 속에서 살다가 온 한국인 이민자들이 선뜻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들은 별로 없다.
게라지 세일에서 배운 검소함
그런 곳을 수십 군데 구경 다니며 실제로 우리 가족이 건지게 된 물건들은 딸아이를 위한 소설책 몇 권과 해변용 의자 두 개가 고작이었지만, 정작 큰 수확은 우리의 생활 태도가 그 후로 몰라보게 검소해졌다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집에서 하는 게라지 세일은 그 규모가 작지만, ‘게라지 세일 축제(Garage Sale Festival)’는 다르다. 오클랜드에서 차로 한 시간 가량 가면 ‘나테아(Ngatea)’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곳에서는 매년 한 차례씩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팔고 싶은 중고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행사인 ‘게라지 세일 축제’가 열린다.
그 날 그 마을의 큰 길이나 작은 길에는 온통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핫도그나 햄버거, 솜사탕 등을 파는 행상들도 늘어서기 때문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축제가 열리는 장소 같다.
우리 가족은 두 해 연이어 그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물건 사기보다는 가족나들이를 나온 기분으로 이것저것 사먹고 다니면서 사람들 구경하고, 그 마을의 집들이나 정원 손질 상태를 꼼꼼히 보곤 했다. 그러나 그 곳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도 역시 이 곳 사람들의 물건 아껴 쓰는 문화를 가깝게 들여다본 것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각 마을마다 주말에 여는 주말시장에서도 중고 물건들을 팔려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거리에 중고품 상점들이 많은 점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 중 하나이다. 중고품 가게에서는 남이 쓰던 물건들을 잘 손질해 내놓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새 물건 못지 않게 구매욕을 자극한다.
그러던 어느날, 이민 올 때 한국에서 쓰던 물건들을 처분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 안을 둘러보니 짐만 되는 가구들과 물건들, 옷들이 제법 많았다. 아내와 나는 그것들을 처분키로 했다.

▲게라지 세일을 하는 집은 집 앞에 풍선을 매단 표지판을 세워 놓는다. ⓒ 정철용
나에게 쓰레기가 남에겐 보물
한국에서 살 때 같았으면 누가 거저 가져가 준다고만 해도 황송한 마음으로 줘 버렸겠지만, 이미 우리는 여기 식으로 변화된 터라 그 물건들을 돈 받고 팔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리하여 작년에 드디어 우리 가족도 우리 자신의 게라지 세일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날 서너 시간 정도에 걸쳐 이것저것 정신없이 팔고 남은 물건들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큰 깨달음을 얻어야 했다. 가구나 부엌용품들은 거의 빠짐없이 그리고 빠른 시간에 팔려 나갔지만, 아내가 몹시도 팔아치우고 싶어했던 정장들이나 액세서리들은 사람들의 눈길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실용적이며 검소한 이들의 문화 때문이다.

▲우리집 게라지 세일 때 옷들과 넥타이들은 끝까지 팔리지 않고 남았다. ⓒ 정철용
체구가 작은 아내의 옷은 그렇다 쳐도, 내 실크 넥타이들을 1달러나 2달러씩(한국 돈으로 천원 안팎)에 내놓았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차림새의 검소함도 검소함이려니와 뉴질랜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소비적 문화와는 거리가 먼 ‘집 안팎 단장하기’이니 옷이나 스카프, 귀걸이들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랴!
이 곳 뉴질랜드에는 ‘나에게는 쓰레기인 것이 남에게는 보물이 되는 날’이 있는데, 평소에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으로는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을 일년에 한 번씩 집 앞에 내놓아 버릴 수 있는 시기(동네마다 그 시기가 다르다)가 바로 그 날이다. 그 때에는 남의 집 앞 쓰레기더미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궁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또한, 한두 달에 한번씩 필요 없는 옷이나 물건들을 담아 집 앞에 내놓으라고 자선단체에서 우편함에 끼워 두고 가는 커다란 비닐 봉투에다 뭔가를 담아 내놓는 일들이 자연스런 일상사다. 이 역시 이 곳 뉴질랜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얼마나 물자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예일 것이다.
구두쇠들만 사는 나라인 듯하면서도 자선단체나 자선행사가 많고 사람들이 참여율도 높은 나라, 너덜너덜하고 흙이 묻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은 구두쇠가 되어 가며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