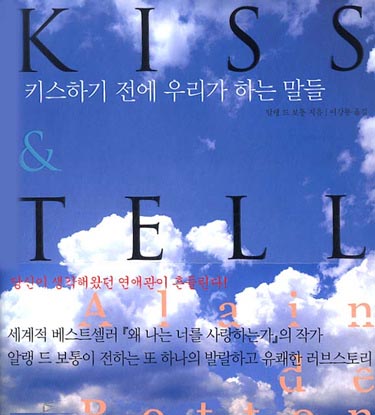
▲ ⓒ
과연 이 책도 연애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알랭 드 보통의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이 든다. 이사벨이라는 여자의 전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과거를 알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알고, 가족과 친족관계 등 이사벨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단순히 연애소설이라고 말하기에는 주저되는 감이 없지 않다. 차라리 '전기'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엄연한 연애소설이다. 그렇다면 연애소설이되 연애소설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그것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잘 알려진 저자의 풍부한 재능과 주제 의식 탓일 게다. 하나의 만남을 인간이 벌일 수 있는 행위 중 가장 심오한 탐구 행위로 묘사하고 서로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행위보다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흥미진진한 일인지를 말하는 저자의 폼과 주제 의식을 보면서 단순히 연애소설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영원한 화두가 바로 이성과의 '만남'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류 역사는 이성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한 것만큼이나 만남의 문화도 오랜 과정을 거쳤다는 것도 사실일 게다. 그 만남이라는 것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천양지차의 경향을 보여줬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민망해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하나의 성이 권력자로 다른 성을 지배하던 시절도 있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만남'이라는 단어가 충동적이며 일시적이고 또한 즉흥적으로 여겨지는 때가 오늘이다. 또 남녀가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작업'이라는 한 단어로 대체돼 버린 현실이 오늘이다. 이것은 비단 어느 한 곳만의 상황은 아닐 테다. 전 세계 곳곳에 인스턴트 음식점들이 자리를 잡고 있듯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일 테다.
그런 상황이 오늘이다 보니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을 쉽사리 연애소설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른바 작업의 생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효과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자는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최소한의 비용이나 최대한의 효과니 하는 것들은 저자 앞에서 모래성이 무너지듯 쉽게 허물어진다. 작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화자인 남자가 우연히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만난다. 남자는 한눈에 여자가 허영심 많고 예술가 뒤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속 빈 강정 같은 부류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나름대로 겉모양과 하는 짓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생각하던 그런 종류의 여자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예술가 뒤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지 않고 속 빈 강정 같지도 않다. 여자의 장점과 단점 모두 남자가 생각한 것들과는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 남자는 평소 서점 같은 곳에서 왜 전기는 유명한 인물들이 초점이 되는지 의아해하던 인물이다. 또 업적이나 업적을 들춰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전기의 핵심이 되는지도 의아해하던 사람이다. 그런 남자였기에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사실, 그리고 집에 데려다주면서도 쉽게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 등으로 '전기'를 써보기로 한다.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은 남자가 여자의 전기를 쓰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의 것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 없다. 마치 인물의 백과사전을 작성하듯, 인물이 살아왔던 기억을 고스란히 전수받아 대신 살아가겠다는 의지라도 있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많은 것을 알아간다. 그 꼼꼼함만 놓고 본다면 남자의 태도는 이제껏 전기를 썼던 어느 전기 작가들보다 앞서가고 있다.
대상인물이 이루어낸 업적에 비하면 여자가 과연 전기의 대상이 될까 싶지만 이미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 전기가 유명인물들의 전유물이라는 법도 없거니와 한 여자가 한 남자의 가슴에 사랑의 감정을 일으켰다는 것 또한 놀라운 업적이 아니겠는가. 그 점에서 여자는 충분한 대상요건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소화해낸다. 남자 또한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한다. 저자 또한 전기를 쓴다는 행위와 별도로 이들이 서로 알아가면서 좋아하게 되는 장면들을 잊지 않고 포착해 내 독자들을 만족시키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실 이 작품이 연애소설답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탐구해가는 작품 속의 모습일 테다. 즉흥적인 만남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겠지만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은 기어코 해낸다. 그리고 즉흥적인 만남에서 얻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에는 동일 분야 도서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독특함이 있다. 그 독특함은 연애소설의 책장을 펼치지 않았던 이들의 손끝을 움직일 정도다. 물론 그것은 중독 현상까지 만들어낸다는 작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도서정보 사이트 '리더스가이드(http://www.readersguide.co.kr)'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