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잊혀진 가람탐험> 표지 ⓒ 여시아문
흔히들 “전생에 연(緣)이 있었기에 이승에서 옷깃을 스친다”고 한다. 나는 지현 장용철 시인을 오래 전(1989년)에 만났다.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의 시집 <서울지옥>을 읽었다.
사람과 자연, 도시와 문명에 대한 시니컬하면서도 풋풋한 풍자에 큰 감명을 받았던 나는 장 시인의 동의도 받지 못한 채 그의 시 한 구절을 내 첫 작품 집 <비어 있는 자리>에 옮겨 쓴 적이 있었다.
그 뒤 10년 쯤 지난 어느 날(작가회의 정기총회 뒤풀이 모임), 그를 만나고는 뒤늦게 사죄를 드렸더니 꾸중은커녕 얼마든지 쓰라는 선심공덕에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날 이후 서로 잊지 않을 만큼 인연의 끈을 드문드문 이어오던 중, 이 복중에 귀한 선물로 ‘시인 장용철의 전국 폐사지 순례기 <잊혀진 가람 탐험>’이라는 당신이 온몸으로 애써 쓴 책을 보내주셔서 어제 오늘 귀로는 매미소리를 듣고 눈으로 책을 보면서 피서를 잘 하였다.
“눈 덮인 산하, 매운 골바람 속에 겨울잠을 자듯 잔뜩 웅크린 폐사지(廢寺址)를 찾는 것은 자못 운치가 있다. 아예 속세와는 경계를 그으려는 듯 솔바람소리가 파도처럼 달음질쳐 와 순례객을 산문 밖으로 밀어낸다. 산비탈에 기대선 겨울나무들은 쩡쩡한 육성을 내뿜으며 온몸을 부르르 떤다. 무슨 꿈이 그리 깊은지 천년의 폐사지는 몇 채씩 두터운 이불을 끌어다 덮은 채 인기척이 요란해도 거동을 않는다.…(11쪽, 양양 진전사지)”
한겨울 그와 함께 두터운 파카를 입고 폐사지를 찾아가는 착각에 오싹한 한기로 복중의 더위를 잊게 했다.
나라와 국토에 대한 사랑이 물씬 배다
“ 만경창파(萬頃蒼波), 횡으로 종으로 줄맞춘 벼 포기들이 넘실대는 김만 평야는 다가설수록 아득하다. 나라 안팎의 어지러움만 아니라면 저 들판의 허수아비가 되어 한세상 허허롭게 머물다 간들 무슨 허전함이 남을까 싶다. 시절이 수상해도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가야 한다. 살아서 죽은 자들의 몫까지 온몸으로 살아가야 한다.
먼 하늘의 우레와 먹구름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서는 벼 포기들. 흰 옷 입은 해오라기들이 벼 포기 사이로 해 종일 미꾸라지를 집어 올리는 이곳이야말로 반도의 문전옥답이 아니겠는가. 이 땅의 백성들 허기질 때, 다투어 섬으로 가마니로, ‘볏골’의 인심을 져 날랐고 여기서 자란 지푸라기는 북풍한설 몰아칠 때 부르튼 맨살들 가려주는 거적이라도 되었던 것이다.…(219쪽, 익산 왕궁리사지)”
이 책의 첫 쪽부터 끝 쪽까지 전문이 모두 장 시인의 나라와 국토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물씬 밴데다가, 투철한 역사의식이 담긴 맛깔스러운 필치로 읽는 이를 경탄케 한다. 필자의 어설픈 안내 글이 오히려 군더더기로 비칠까 염려스럽다.
“한때는 신라 왕실의 발걸음이 빈번했을 옛 가람 테에는 주린 배를 채우려고 날아드는 산 꿩이 푸드득거릴 뿐 흰 구름조차도 금오산 능선에 머문 채 발길을 끊고 있다. 자본주의 물살이 산사태처럼 덮쳐들고 있어 늙은 폐사지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폐사지라도 한번 제대로 발굴하여 역사의 지층에 화석처럼 찍혔을 신라사람들의 발자국이나마 더듬어 보았으면 한다.…(280쪽, 김천 갈항사지)”
거대한 자본의 물살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폐사지 앞에서 장 시인은 한 구도자로 선인들이 남긴 자취나마 제대로 더듬고자 하는 애달픈 마음을 담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 국토는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의 산하가 굴삭기로 파헤치고 누 억년 내려오던 지맥이 끊어지고 웬만한 산조차도 현대문명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온통 마구 파헤쳐진 그 자리에는 철근이 세워지고 콘크리트 건물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 이런 세태에 어찌 폐사지가 마냥 온전하랴.
한 구도자의 순례기
그는 이 책의 머리글 ‘폐사지- 침향, 중심이 흐린 세상을 건너는 뗏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잊혀진 가람탐험’은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려는 역사공부이다. 망가지고 부서진 어제의 불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나쳐온 역사의 그루터기요, 이 나라 전통문화의 주초인 것이다. 잃어버린 한국불교의 과거를 찾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씨줄과 날줄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일이야말로 구도의 작업이요, 중심이 흐린 세상의 새로운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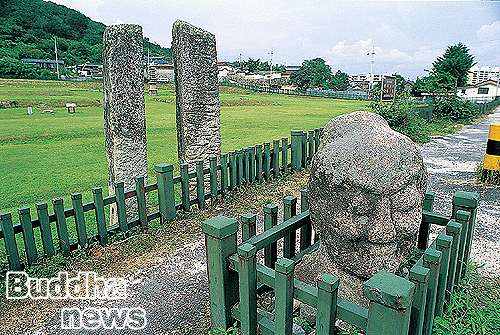
▲길 옆에 몸을 묻고 만복사지를 지키고 있는 인고의 '석인상' (남원 만복사지) ⓒ Buddhanews
그의 이 작업은 숙업으로 잔명(殘命)이 있는 한 계속될 것으로, “잃어버린 야성을 찾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구도의 방법으로 흐린 세상을 건너는 방편”이라고 말하면서 “다 건넌 뒤에는 뗏목조차도 버리겠다”고 하였다.
이 책에는 북쪽 휴전선 가까운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지에서 남도 끝 제주도 수정사지 원당사지 법화사지까지 모두 38군데의 폐사지를 장 시인이 3년 남짓 답사하면서 마치 구슬을 꿰듯 쓴 순례기이다. 그의 글은 그윽한 향기가 우러나는 우리 고유의 차처럼, 영혼이 메마른 이의 갈증을 촉촉이 추겨줄 것이다.
새로운 것, 귀신도 서양 것만 좇아가는 현실에, 이미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우리 옛 것을 찾아 보듬는 장 시인의 모습은 성자마냥 거룩해 보인다. 그의 다음 발길이 네티즌에게도 쉬 전해질 날을 고대해 본다.
| | 장용철씨는 | | | |
불명 지현(知玄), 1958년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서 태어났다. 미국 Lasalle Univ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였으며, 198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민족문학작가회원으로 시집 <서울지옥> <늙은 산> 수상집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전기집 <불법은 체, 세간법은 그림자라> 등을 펴냈다.
현재 진각복지재단사무처장과 윤이상재단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평불협 상임부회장, 문화복지연대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19회 ‘불이상’을 수상하였다.
/ 여시아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