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밝고 환한 오진희 선생님의 웃음. | | | ⓒ 김은주 | "봄이 되면 우리 집 밥상은 푸른 풀밭이다. 나는 자칭, 있는 반찬으로 밥상을 맛있게 차리는 사람이다. 근사한 요리는 못하지만 일상적으로 늘 먹는 밥상은 잘 차린다. 내가 차리는 밥상은 꼭 내 성격을 닮았다. 치장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날로 먹는 게 반, 익혀 먹는 게 반으로 차려지는 밥상이다. 양념도 잘 안 하고, 한다고 해도 원재료의 맛을 없애는 강한 양념은 쓰지 않는다."
짱뚱이 오진희 선생님은 그런 분이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뚝딱뚝딱, 아픈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강화도에 황토집 한 채 덩그렇게 지어 내고, 이 땅의 아이들이 사랑해 마지 않는 볼 통통 '짱뚱이' 이야기를 척척 잘도 풀어놓는 분이다.
선생님의 밥상이 그런 짱뚱이 오진희를 그대로 빼박았듯이, 이번에 새로 나온 '짱뚱이의 상추쌈 명상'도 그런 선생님을 꼭 빼닮은 책이다. 한겨레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 연재했던 두 분 선생님의 맛있는 이야기를 꼬박꼬박 챙겨 보면서 너무 짧은 원고량에 못다 담은 이야기까지 더해 얼른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손꼽아 기다리던 책, '짱뚱이의 상추쌈 명상'.
지난 봄에 강화도 마니산에 올랐다가 선생님 댁에 잠깐 들렀다. 마음이 팍팍해져서, 가만히 있어도 마른 바람이 한 번씩 서걱대며 가슴 안에 풀어와 내 마음밭을 한없이 황폐하게 만들던 때였다. 그래서였나 보다, 오진희 선생님을 뵙고 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외로울 때 유독 엄마가 만들어 주는 된장찌개 생각이 간절해지고, 식당에서 사 먹는 밥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 주는 밥상이 그리워지기 마련이니, 아마도 나는 오진희 선생님의 그 풍성한 밥상에서 위로를 찾고 싶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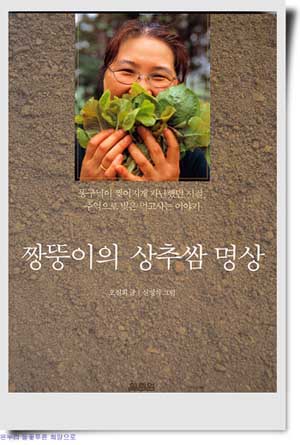 |  | | | | | | ⓒ 열림원 | 선생님 댁에 들어서자마자, "배 고프지? 밥부터 먹자" 하셨지. 마니산이야 두 시간 정도면 정상까지 올랐다 내려오기에 충분해서 별로 힘든 산행이 아니었는데도, 오진희 선생님은 일단 밥부터 먹자 하셨다. 신영식 선생님을 따라 집 뒷산에 잠깐 산책을 다녀왔더니 어느 새 밥상엔 온갖 맛난 것들이 가득했다. 내 보기엔 '요리 도사'임이 분명한 오진희 선생님 어머님이 보내 주셨다는 갖가지 김치들, 말린 표고버섯무침에,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먹는 동안 그래, 그랬다, 내 마음밭에 조금씩 윤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오진희 선생님이 그 맛난 밥상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젊은 날 핵 폐기장 반대운동에 나서 싸웠던 투사였다고는,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열혈 운동가였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지금의 푸근함과 평화로움이 구절마다에서 반짝인다.
"울타리에 강낭콩이라도 심어서 콩 껍질을 까 본 사람은 안다. 도톰한 껍질 속에 숨어 있는 우주를. 콩 꼬투리를 까다 보면 못난 것도 나오고, 꼬투리 양쪽을 받치면서 마치 그 틀을 유지해 주기 위해 자리를 잡은 듯한, 그저 콩 모양만 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도 발견하게 된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콩들로 인해 다른 콩들이 버젓이 잘난 콩 행세를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 작은 콩들을 보면 사뭇 경건해진다."
쬐그마한 콩 한 알 앞에서 경건해져 버린다는 선생님. 그러면서도 무게 잡지 않고 맛있는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갖가지 비법들을 재미있게 알려 주신다. 도시 한복판에서 사는 나 같은 사람이야 절대로 따라 할 순 없어도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이야기들. 언젠가 두 분이 강원도에 사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여보, 나 장에 좀 갔다 오께" 하고 나서는 곳이 앞마당, 뒷산이었듯이, 지금도 돈 한 푼 들고 나가지 않아도 온갖 귀한 먹을거리들을 가득 담아 올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사시는 게 한없이 보기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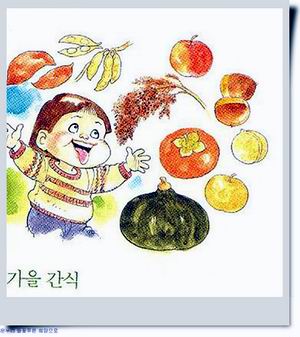 |  | | | ▲ 책 속에는 신영식 선생님이 그린 만화가 함께 들어 있다. | | | ⓒ 열림원 | 사계절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하나씩 적어 내려간 선생님의 맛있는 밥상 이야기를 보자. 보약이 따로 없다는 봄나물 밥상, 햇볕까지 덤으로 올려 놓을 수 있는 한여름 풍성한 밥상, 흙의 단맛까지 죄다 올려 놓는 가을 밥상, 긴긴 겨울날 조금씩 꺼내 먹는 간식 이야기까지, 어느 하나 그냥 버릴 것이 없다.
먹는 얘기도 즐겁고 맛있지만, 어린 시절 동네 두부 집에 가서 두부 사 오던 이야기나 팥칼국수 끓여 놓고 온동네 잔치한 이야기나, 선생님의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돌확 이야기처럼 맛깔스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무척이나 맛있게 읽힌다. 잡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짱뚱이 만화를 연재하실 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어쩌면 이렇게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늘 궁금했는데, 이 책에서도 선생님의 그 놀라운 기억력과 통찰력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 바로 내 눈앞에 그 음식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글쓰기 능력에 입담까지, 참 복도 많은 분이다, 오진희 선생님은. 아, 아니다, 오진희 선생님보다는 그분의 맛난 밥상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함께 나누고 계신 신영식 선생님이 더 복이 많은 분이신가?
 | | | ▲ 두 분, 오래도록 살갑게 행복하시기를. | | | ⓒ 김은주 | | "아!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보니 오늘 밥상은 모두 얻어온 것으로 차려졌다. 올여름엔 유난히 여기저기서 준 것으로 밥상을 차린 횟수가 많았다. 남편이 병원에서 한참을 보내는 바람에 손을 놓아버린 텃밭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을 이웃들이 모두 채워줬다. 그래서 우리 집 밥상은 자연 밥상 위에 사랑의 양념이 첨가된 치유의 밥상이 되었다."
오진희 선생님이 차려 주신 밥상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맛있나 했더니 '사랑의 양념이 첨가된 치유의 밥상'이라서 그랬던 모양이다. 언젠가 선생님 댁에 놀러갔다가 얻어와서 한동안 내 밥상에 올랐던 김 부각의 맛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고습고 따스한 바다의 냄새였고, 빈한한 내 밥상을 걱정하는 우리 엄마의 맛이었고, 강화 순무처럼 '겉보기엔 참 야무지고 단단해 보이는데 말을 걸면 별로 깐깐하게 굴지 않는 싱거운 사람' 짱뚱이 오진희 선생님의 정겨운 맛이었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누구라도, 이 맛있는 밥상 앞에서 무장 해제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나저나 큰일이다. 선생님이 차려 주신 밥상 생각을 하니 입안에 군침이 확 도는데, 이 일을 어쩔꼬?
 | | | ▲ 강화도에 새로 지은 선생님네 집. 따뜻하고 안온하다. | | | ⓒ 김은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