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 | | ▲ 어른 주먹만한 감. 바구니에 담아 말렸는데 아직 덜 마른 상태다. | | | ⓒ 김은주 | | 양양은 유난히 감나무가 많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뒤뜰에 감나무 여섯 그루가 줄을 서 있다.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면 만나게 되는 단층집들 또한 어느 집을 막론하고 마당에 감나무 한두 그루씩은 갖고 있다. 학교 앞 큰 도로는 가로수도 감나무다.
학교로 가기 위해 지나가다 감나무에 매달린 어른 주먹만큼 큰 감은 손만 뻗으면 딸 수 있을 정도로 가깝지만 땡감이라 바로 먹을 수가 없어서인지 따는 사람도 없다. 이리 봐도 감, 저리 봐도 감이다.
또 감이라면 동글납작한 단감을 많이 봐온 내게 이 지역에서 주종을 이루는, 복숭아처럼 생긴 대형 사이즈의 감은 정말 귀하고 좋아 보였다. 우선 크기만 봐도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크고, 홍시가 된 감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달고 맛있었다.
이런 감은 독에 넣어 고이 홍시로 만들거나 아니면 감나무에 매달린 채 서서히 홍시로 만들다가 어느 순간 홍시가 되면 따야 했다. 그런데 홍시 만들자고 갑자기 독을 살 수도 없고, 나무에서 홍시로 만들어 따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중에 저절로 떨어져 터져버릴 위험도 있었다. 그래서 감이 보기엔 좋은데 이용 가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감에 대한 관심이나 미련도 접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 학교에 자원봉사를 갔다가 다시 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떫은 감을 맛있는 감으로 탈바꿈 시키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어제 곶감 이백 개 만들었더니 어깨 아파 죽겠어요."
나와 함께 급식 자원봉사를 하는 1학년 학생 엄마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200개나 되는 곶감을 혼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감 껍질을 어떻게 다 벗길 수 있었는지, 궁금한 게 참으로 많았다.
"그걸 혼자 다 벗겼어요?"
"감자 깎는 칼로 하면 쉬워요."
이 아줌마는 커피를 마시고 난 종이컵도 어느 순간 보면 다른 사람 컵까지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러 가 있을 정도로 손도 빠르고 행동 또한 빨랐다. 이 아줌마를 보면 주부라고 다 같은 주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주부가 아니라 유능한 주부였다. 인터넷서 배 분양하는 정보를 알아내서 배 한 그루를 4만원 주고 분양 받았는데, 이번에 따러 가면 아마도 몇 박스는 나올 거라 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었다. 지난 주는 곶감 이야기로 또 기를 죽여 놓았다.
 | | | ▲ 3단짜리 발 속에서 잘 마른 감. 수분이 빠지니까 좀 줄어들었다. | | | ⓒ 김은주 | | "말리는 건, 그릇 점에 가면 삶은 나물 말리는 발이 있거든요, 생선도 말리는 그거, 3단짜리가 있어요, 그걸 사다가 거기 감을 말리면 돼요. 감은 처음에는 햇빛에 말리다가, 다시 그늘에서 1주일 정도 말리면 껍질은 쫄깃쫄깃하고 속살은 홍시처럼 되거든요. 그때 통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먹을 때 꺼내 놓으면 말랑말랑 해져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겨울 내내 아이들 간식으로 줘요."
정말 좋은 정보였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우리도 감을 따자고 했다. 낮에 들었던 곶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도 '맛있는 감' 만들고 싶다고 했더니 쉬는 날 감을 따겠다고 흔쾌히 대답했다.
우리 아파트 뒤뜰에 있는 감은 아무도 나서서 따는 사람이 없어 언제나 그 모습으로 있었다. 가끔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 애들이 잠자리채로 홍시가 된 감만 몇 개 따가는 정도지 작정하고 감을 따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감을 따겠다고 작정한 그날 우리보다 앞서 감나무를 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부엌 창문으로 뒤뜰을 내다 봤더니 한 부부가 감을 따고 있었다. 남편 되는 이는 감나무에 올라가서 손으로 감나무 가지를 꺾고 있었고, 아내 되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감 따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도 안 따는 감을 나서서 따기에 배짱이 부족한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 감을 따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감 따고 있다고 했더니 옳다, 싶었는지 헌 옷 좀 달라고 했다. 감나무 가지에 걸려 찢어져도 괜찮을 옷을 찾아 입고 나가려는데 큰 애가 갑자기 불길한 말을 했다.
"아빠, 감나무는 가지가 약해서 부러지기 쉽데요. 그래서 감나무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나도 그런 말 어디선가 들은 것도 같았다. 감 따다 떨어지면 병신 된다는 말을. 그래서 갑자기 감 따는 걸 그만두고 싶어졌다.
"그래, 감 몇 개 따자고 큰 일 날겠다. 그냥 관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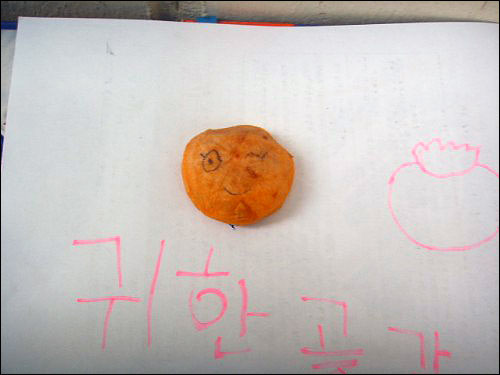 | | | ▲ 1학년짜리 작은 애가 찍은 귀한 곶감 사진. | | | ⓒ 김은주 | |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자른다고, 헌 옷까지 찾아서 입고 등산화까지 신은 마당에 큰 애 말 듣고 그냥 주저 않기는 싫은지, 어렸을 때 감나무에 많이 올라가 감 많이 따먹었다며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검은 비닐봉지 한 개 들고 먼저 나가고, 나는 하던 일 끝내고 뒤늦게 나갔다.
감나무에서 떨어지면 불구자 된다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어 감나무에 올라가 있는 남편이 몹시 걱정됐다. 그러나 남편은 어렸을 때의 나무타기 경험이 남아 있어 다람쥐처럼 나무에 잘도 올라가 순식간에 한 봉지 가득 감을 땄다.
그날 우리가 딴 감은 60개였다. 난 그걸 급식에서 만난 아줌마의 조언대로 감자 칼로 껍질을 벗겼다. 정말 쉽게 벗겨졌다. 껍질을 벗긴 감을 나물 말리는 발에 담아 베란다에 걸어뒀다. 일이 모두 끝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버려질 수도 있는 감을 이용해서 맛있는 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유쾌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오늘 드디어 감을 다 말렸다. 정말 1주일이 되니까 껍질은 쫄깃쫄깃해지고, 신기하게도 떫은맛이 나던 속살은 홍시로 변해 있었다. 양양은 햇빛이 강해서 과일이 달고 맛있는 편인데, 감도 설탕을 뿌려놓았나 싶을 정도로 달았다. 아이들한테 먼저 몇 개를 맛보게 했더니 맛있다고 계속 더 달라고 졸랐다. 10개 정도를 한 자리서 먹고 나머지 50개는 통에 담아 냉동실에 얼렸는데, 이런 기세로 먹는다면 얼마 못 가 동이 날 것 같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