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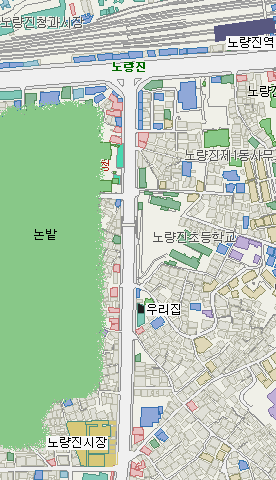
▲T자 모양의 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대방동과 영등포, 오른쪽은 용산, 아래쪽이 장승백이 입니다. 지도 위쪽으로는 샛강과 여의도가 있습니다. 노량진 초등학교 밑에 까만 부분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입니다. 아래쪽 갈색으로 칠해진 곳은 제가 "덕칠이"에 쓴 노량진시장입니다. ⓒ 서울시
그래도 노량진은 나은 편이었습니다. 대방동으로 해서 영등포 쪽을 보면, 유한양행, 삼각산표 광목을 만들어내던 경방(경성방직), 그리고 방림방적이 있는 공장지대였습니다. (지도의 위쪽에 있는 큰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대방동입니다.)
그 당시 모든 아이들이 그랬듯이, 또래 친구들과 놀 시간은 철철 넘쳤습니다. 삭막한 공장지대는 우리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우리의 놀이터는 물고기가 드글드글하던 샛강이었고, 그 건너편 여의도에 있는 땅콩밭도 철이 되면 표적지가 됐습니다. 당시 여의도는 사람이 살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이 드나드는 무인도였습니다.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위쪽 철길 건너편 쪽입니다.)
'울 어멍'에서 썼듯이, 어머니는 서울역 앞에서 국밥 장사에 매달려 계셨고, 그렇다고 아버님은 살림에 손끝 하나 대지 않는 분이었으니 제 꼴이 어땠는가는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요. 오늘은 그 얘깁니다.
"세수는 하루에 한번"
드디어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가 따라왔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서러웠다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바로 옆에 있는 학교는 원래부터 제 놀이터였고, 친척들이 노량진에 몰려사는 바람에 손 위 조카들이 상급생으로 층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나이 차가 너무 나다 보니 제 또래는 모두 조카였고 심지어 손자뻘까지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 나와바리에 '빽'까지 든든한 동네였으니 입학이라기 보다는 옆집에 놀러가는 기분이었죠. 제 눈에는 오히려 엄마가 쫓아와서 코를 닦아주는 모습이 '애들'로 비쳤습니다.
당시 시골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6학년 누나 한 명을, 학교 다니면서 제 밥이나 해주라고 데려왔는데, 저나 그 누나나 후다닥 등교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제가 그 누나 말을 안 듣고 도망가면 세수를 하건 말건 어쩔 수가 없었죠.
어느 날이던가, 선생님은 급우들 앞에서 저를 세워놓고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수는 하루에 한번 아침에만 하면 되는데, 정병태 어린이는 그게 귀찮아서 세수를 안 하고 옵니다. 착한 어린이일까요, 나쁜 어린이일까요?" 애들은 또 어찌나 잘 아는지 "나쁜 어린이요" 하고 입을 모았고 ... 그 속에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강남달이 밝아서 님이 놀던 곳..."을 꾀꼬리같이 부른 예쁜 계집애도 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모하는 여인 앞에서 쪽팔림을 당한 겁니다. (왼쪽 볼에 점이 있던 그 아이도 지금은 중년 부인이 됐겠죠.)
다음날, 저는 드디어 세수를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것도 밥 먹기 전에 한번, 밥 먹은 후에 한번. 학교 옆에 살던 저는 늦장을 부리는 편이어서, 조회에 들어가는 선생님의 무리를 지나쳐갈 때가 많았는데, 그런 때는 저를 그 선생님들 앞에 불러 세워놓고 망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보세요, 예가 세수하고 왔어요!" 하면서 광고를 하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연거푸 기특하다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급우들 앞에서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세수한 걸 갖고 칭찬을 받다니...
그 다음날은 일부러 세수를 하지 않고 등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수를 하나 안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선생님은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오늘은 왜 세수를 안했니?" 하고 물으셨고, 저는 정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박장대소를 하시더니 앞에 가는 다른 선생님들을 불러 세우고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선생님들도 큰 소리로 웃는 게 아닙니까?
그 중 한 선생님께서 몇 발 뒤에 오는 저를 돌아보시면서 아까 우리 선생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리와봐, 오늘은 왜 세수를 안 하고 왔지?" 저는 조금 전 우리 담임선생님 앞에서 했던 대답을 한 번 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설명까지 덧붙여서. "어저께 두 번 해서요. 우리 선생님께서 세수는 하루에 한번씩 하는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계모'?
공부도 잘 하는 똘똘한 아이인데, 어제 세수를 두번 해서 오늘은 안하고 왔다고 하는 걸 보면 한참 모자란 아이 같기도 하고. 입학식 때도 혼자 왔지, 학교에 보낼 때 세수도 안 시켜 보내지. 그런 저를, 선생님은 계모 슬하에 자라서 정서가 불안한 아이로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은 소풍 때 제 점심을 보고서는 확신으로 변하셨으니... 제 도시락은 양은 양재기에 밥을 담고 그 위에 달걀 프라이를 얹은 것이었습니다. 앞서 '울어멍'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서울역 앞에서 국밥집을 하시느라 집에 들어올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풍 때 김밥싸서 나무 도시락에 싸 보내라고 밥하는 누나에게 돈을 따로 주셨는데, 돈이 필요했던 그 누나가 꾀를 낸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어이없는 도시락은 어머니를 '계모'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선생님은 저를 학부형들이 싸온 풍성한 점심식사 자리로 데려가셨고, 밥 먹은 후에는 (당시로서는 귀했던) 미제 캐러멜과 초콜릿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계모 슬하의 자식이 양재기에 밥을 담아온 것이 얼마나 안됐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김밥에 칠성사이다를 마시며 마냥 좋아라 했으니... 어쨌거나 1학년 7반 담임이셨던 이성주 선생님, 지금 생각해봐도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일학년을 거의 마칠 무렵, 저희 집은 경기도 광주 저푸리라는 곳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위에 쓴 선생님의 의중은, 그 때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뵈었던 어머니로부터 훗날 전해들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