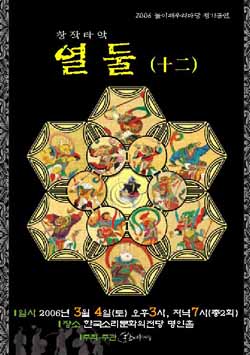
▲창작타악 <열둘(十二)> 포스터. ⓒ 놀이패 우리마당
그런 와중에 마침 '창작 타악'이라는 문구가 눈에 쏙 들어오는 공연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지난 4일 오후 3시와 7시에 두 차례 선보인 이 공연의 제목은 <열둘(十二)>. 전주의 대표적인 놀이패인 '우리마당'이 기획하고 연출했다.
여기서 12란 숫자의 의미는 다양하다. 12시, 12달, 12성좌, 12부위(관상에서 인상), 12음역(국악의 음계), 12마당(판소리), 12차 농악(진주 삼천포), 열두마치(좌도굿) 등등. 공연은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숫자 12의 의미를 12지신을 통해 음악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산발적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여기저기에서 창작 국악 공연이 올라오는 건 우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반가움이 시연이 끝난 뒤에도 오래 지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관련 용어가 아직까지도 낯선 이 문외한에게도 기존의 국악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안일한 공연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작 타악 <열둘(十二)>은 적어도 이러한 평가에서는 좀 벗어날 듯했다. 먼저 숫자 '열둘'의 이미지를 관념적으로만 차용하지 않고 연행자, 악기, 가락 속에서 구현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맞이' '질주'에 이은 제3부 '열둘'의 무대는 십이지신의 이미지를 음악적으로 구현하려는 열정과 고뇌가 돋보였다. 서양의 드럼과 기타가 우리의 타악기(북․꽹과리․장구)와 소리를 만나 조화를 이루는 대목은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또 제3부 마지막에 신명나게 부른 이른바 '십이지신가'는 이 공연의 절정으로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모두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다. 하지만 십이지신에 해당하는 연희자들의 개인 무대가 너무 판에 박힌 모습이었다는 건 아쉬웠다. 걸맞은 의상이나 소품 못지않게 음악적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이 공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꾸준히 관련한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니 내심 기대해 본다.

▲본 공연이 끝난 후 놀이 마당에서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졌다. ⓒ 권오성
우리 국악이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하는 당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국악축전>이나 여러 연희 단체들을 통해서도 시도된 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담아야 국악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인지는 필자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분명 아니다.
그렇지만 기존과는 색다른 그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통 국악의 이미지는 박제화한 채 머릿속으로만 그려질 것이다. 진정 가슴으로 만나고 몸을 부대끼며 느끼는 그런 '현대의 국악'을 만나고 싶은 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터이다.
한 가지 더. 오페라나 발레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게 있는 것처럼, 국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련 용어에 대해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을 들여다보는 어느 정도의 품은 들여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관람 태도라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