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06년 1월 국숫집2 ⓒ 이승숙
내가 이 국숫집을 만난 날이 생각난다. 사람들 말을 듣고 국수를 먹으러 국숫집에 갔다. 메뉴는 딱 두 가지뿐이었다. 비빔국수와 물국수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나도 비빔국수를 시켰다. 그리고 국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식당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꾸밈이었다.
'이 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이라는 성구가 새겨진 액자가 벽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바닷물 때 시간표가 있는 강화도만의 달력이 벽에 있었다. 또 다른 한 벽엔 치렁치렁하게 조화가 걸려 있었고 그리고 내 바로 눈앞의 벽엔 커다란 패널이 걸려 있었다.
처음엔 그것이 뭔지 몰랐다. 꾸미지도 않은 그것,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언가가 쓰인 것이었다. 저게 뭘까. 무심히 읽어 보았다.
'비빔국수'.
그것은 성석제가 이 식당을 소재로 쓴 '비빔국수'라는 글이었다. 그 글을 크게 복사해서 벽에 붙여 놓았다. 걸어놓은 지 오래된 듯 글자 색이 좀 바래 보였고 그리고 밑줄 친 빨간색 사인펜 색깔도 흐릿하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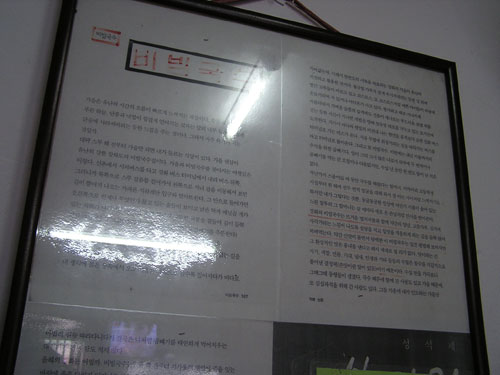
▲2006년 1월 국숫집3 패널사진 ⓒ 이승숙
좁은 골목길엔 차를 세워둘 곳도 마땅찮았다. 그래서 경찰서 마당에 차를 세웠다.
날이 추워서 그런 걸까 점심시간인데도 별반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끼리 온 고등학생 셋이 비빔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었고 그리고 다 먹고 나가는 한 팀뿐이었다.
식당 안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조금도 없었다.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액자며 조화 그리고 달력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연탄 난롯불에 손을 쬐면서 비빔국수 둘에 곱빼기 하나를 시켰다.
"할머니, 여기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 다 주인이지. 손님도 주인이고 다 주인이지."
주인 할머니가 그리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우리 사돈이 주인이지."
그랬다. 그러자 따님인 듯한 젊은 여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러면서 다들 호호호 웃었다.
김이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좁은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던 세 여인은 참 고왔다.
"사돈 간이세요? 그럼 누가 따님이고 친정어머니세요? 할머니가 친정어머니세요? 두 분이 많이 닮았다."
그러자 두 여인이 벙긋 웃었다.
"우리 둘이 닮았어요? 내 딸이 아니고 며느린데 닮았나?"
"할머니 진짜세요? 진짜 며느님이세요? 그런데 진짜 닮았다. 오래 같이 함께하다 보니까 서로 닮았는갑다."
정말로 며느님과 시어머니는 많이 닮아 보였다. 오히려 친정어머니가 남인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두 고부간이 닮아 보였다.

▲2006년 1월 국숫집4, 모녀 같은 고부 ⓒ 이승숙
국수가 나왔다. 뜨끈뜨끈한 멸치국물과 김치 한 종지 그리고 비빔국수, 이렇게 단출한 차림이었다. 국수 면발 위에 양념한 김치를 얹고 파, 통깨, 고춧가루, 김 가루 그리고 노란 설탕 한 숟갈을 얹은 국수가 나왔다.
멸치국물을 조금 따라 붓고 젓가락으로 국수를 비볐다. 아삭거리는 김치와 설탕, 그리고 개운한 뒷맛을 위해 넣은 김 가루와 파, 멸치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는 잘 비빈 국수를 한 젓가락 가득 집어 올렸다.

▲2006년 1월 국숫집5, 아삭한 비빔국수 한 그릇 ⓒ 이승숙
비빔국수도 물국수도 2500원밖에 안 한다.
"할머니, 언제부터 하셨어요?"
"응, 한 사십 년 됐지."
"그런데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가격을 안 올린다면서요?"
"응, 이제 올려야지. 올릴라 그러고 있어."
사돈 간이라는 두 분도 선량해 보였고 따님이자 며느님도 선량해 보였다. 말을 꾸며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시는 그 할머니들을 보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정 엄마같이 느껴졌다.
자랑할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았고 항상 나를 낮추던 어른들. 작은 성취에도 기고만장해 하고 작은 성공에도 자랑이 늘어지는 요즘 우리네와 다른 세대의 어른들이다. 강화경찰서 앞 비빔국수 집 할머니들은 그런 세대의 어른이었다. 잔잔한 미소와 주름이 정겹고 아름다운 할머니들이었다.
덧붙이는 글 | 제 아이들은 둘 다 고등학생입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는 한밤중에 돌아옵니다. 오랫만에 애들과 함께 했던 어느 추웠던 토요일 오후는 아삭아삭한 비빔국수와 인정이 있어서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