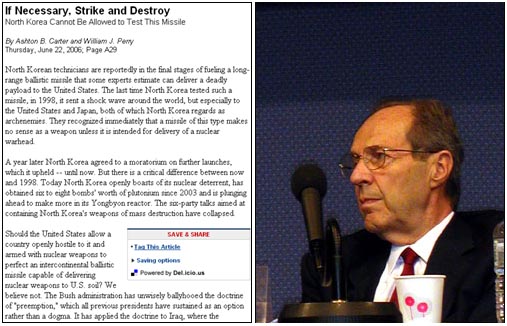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 스탠포드 대학 교수와 당시 국방 차관보였던 애쉬톤 카터 하버드 대학 교수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대를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윌리엄 페리(왼쪽) 전 국방장관과 그의 글이 실린 <워싱턴포스트> 캡처 화면이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설이 한반도 상공을 휘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나선 당사자들이 클린턴 행정부 때 고위 관료를 지낸 바 있는 대북 온건파라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크다.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와 차관보를 지낸 애슈턴 카터는 22일 <워싱턴포스트> 공동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 추진한다면, 미국은 미사일 시설을 공격해 이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핵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면 북한은 더욱 대담하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주장을 뒷받침하려 한다.
북한의 이성에 대한 이중잣대
특히 이들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을 보복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한에 대한 보복 공격 즉, "수 주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자신들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김정일 체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페리와 카터의 김정일 체제의 합리성에 대한 자기모순적인 주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수천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미사일 공격하는 순간 국가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가공할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페리와 카터는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 공격할 만큼 무모하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더라도 북한이 한국 내 주한미군에 보복하지 않을 만큼 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정당화 할 때는 김정일 체제의 무모함을 강조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피력할 때는 김정일 체제의 이성을 들먹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가?
페리와 카터는 "남한은 오늘날 미국의 영토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한이 수십년간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님은 물론이다.
오히려 페리와 카터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남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보다 사려 깊게 이해해야 한다. 남한의 안보 위협은 북한으로부터도 오지만,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으로부터도 온다.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든,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의해서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자체로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페리와 카터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문제의 칼럼에서도 밝힌 것처럼, 1994년 한반도 위기 당시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타진한 인물들이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대북 선제공격이 북한의 보복공격을 야기해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수백만의 한국인과 수만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 EmoryUniv.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맞물려 외교의 복원을 가져왔고, 그 결과 제네바 합의가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서도,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외교의 실패를 운운하면서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전쟁 위험을 회피하는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질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있다. 즉, 북한은 전쟁불사론을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페리와 카터는 그들 자신이 핵심적인 당사자였던 1994년 위기 때, 미국이 군사 행동 조짐을 보이자 "선제공격의 권리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결사 항전 태세로 들어갔던 북한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당시의 위기가 해소되었던 것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위협이 아니라 지미 카터의 중재 외교에 있었다는 것을 정령 잊었단 말인가?
외교의 실패인가, 외교의 포기인가
페리와 카터는 "외교는 실패했고, 우리는 앉아서 치명적인 위협이 무르익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진정 부시 행정부가 외교다운 외교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비록 제네바 합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더라도, 부시 행정부가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북한이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축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때의 미사일 협상을 계승했다면, 오늘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공화당은 '스타워즈'로 일컬어지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2000년 말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반대했다. MD에 사활을 걸었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월 출범하자마자 북한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9·11 테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재발한 이후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줄곧 거부해왔다. 이 정도면 이는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외교의 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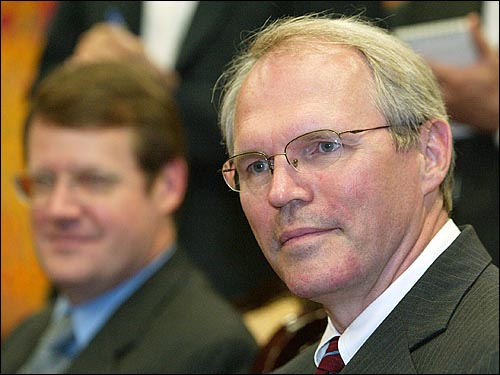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필자 역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춘 대화의 재개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정부가 미사일을 북한에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기 클린턴 행정부 때 전쟁 위기를 겪었고, 2기 클린턴 때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인 페리와 카터가 '잃어버린 외교'를 찾는데 용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 위험하고, 무모하며, 무책임한 선제공격론은 동맹국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필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동북아는 물론 미국도 더욱 안전해지기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미국이 '스타워즈'라는 허황된 꿈을 좇아, 빈곤 등 인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실종되었던 '외교'를 되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