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졸업식날, 후배들이 졸업자들이 사용했던 사물함 열쇠를 수거하고 있다. ⓒ 허환주
내가 세상을 잘못 산 걸까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경황이 없었다. '왜 나에게 졸업시험 공지가 났다고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것일까'하며 학과 관계자들을 원망하기도 하다가,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 범위를 보니 자료 찾는 데만도 하루가 족히 걸릴 거 같았다. '이를 어떻게 하나'하고 생각을 하는데, 공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1차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 2차 시험까지 있다고 한다. '그럼 그렇지,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하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지화자'를 외쳤다.
결국 난 11월 20일에 치러진 졸업시험에서 떨어졌다. 뭐 그렇다고 한심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3과목 중 한 과목은 이틀 동안 '빡 세게' 공부해서 붙었다. 이제 남은 건 2과목, 2차 졸업시험에서 꼭 붙으리라 맘먹었다. 2차 졸업시험은 11월 27일.
2차 졸업시험 주간에는 뭔가 일이 제대로 꼬였었다. 군대에서 휴가나온 후배가 날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아오지 않나, 어머니의 중요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집에 가야 하지 않나,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던 친구에게 연락이 오질 않나…. 뭐가 꼬여도 제대로 꼬였다.
하지만 자료야 다 구했겠다, 시험 보기 이틀 전부터 밤새서 공부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내 생각은 또다시 완전한 오판이었다.
난 3학년까지 신문을 만드는 학보사에서 활동을 했다. 4학년이 되어서는 이제 신문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신문사 후배가 시험을 앞둔 3일 전에 나에게 전화를 했다.
"선배 바쁘세요?"
"어. 아니, 안 바빠, 왜?"
"아니요. 마감을 해야 하는데, 기자들이 한 명도 없어서요."
"엥, 그래? 기사는 다 채웠어?"
"아니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아, 그래…."
"……."
"……."
솔직히 후배의 도움요청을 뿌리치기는 어려웠다. 기자 1, 2명이 힘들게 신문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체하기란 어려웠다. 결국 난 시험을 3일 앞두고 후배를 돕기 위해 학보사로 갔다. '빨랑 끝내고 시험공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몸도 마음도 파김치
금요일부터 시작한 학보사 일. 빨리 끝내고 시험공부를 해야겠다는 내 생각은 신문을 만들면서 저만치 멀리 떠나갔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문은 토요일 새벽에야 겨우 다 만들었고, 나는 후배와 함께 마감의 피로를 풀기 위해 소주 한잔을 기울였다. 이제 졸업시험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되어버렸다.
거의 아침이 될 때까지 마신 다음 학교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눈을 뜨니 낮 12시. 정신적 공황상태를 느꼈다. 졸업시험은 오후 2시였기 때문이었다.
난 2차 시험 역시 떨어졌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었다. 그렇다고 넋을 놓고 있을 순 없지,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과사무실에 문의를 했다. 3차 졸업시험은 없느냐고…. 딱 잘라서 "없다"고 했다. 그 말이 얼마나 서글프던지, 눈물이 날 뻔했다. 그래도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다. 학과장 교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학과장 교수님은 어찌나 바쁘시던지 연구실을 갈 때마다 번번이 계시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안절부절.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구구 절절한 사연을 담아서…. 물론 거짓말도 약간 담아서 말이다.
이게 통했던 것일까. 교수님에게 답 메일이 왔다. 3차 시험 보는 것을 다른 교수님들과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바로 답 메일을 보냈다.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평소 교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다며 나의 진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며…. 속이 너무 보였나? 그 뒤 교수님에겐 연락이 없었다.
조금 천천히 걷기
속이 부글부글, 머리가 지끈지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이번에 졸업하지 못하면 여름에 졸업하는 것인데, 그럼 취직도 못 하고 집에서는 아마 날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초조한 날이 얼마나 지났을까. 교수님에게 메일이 왔다. 학과사무실에서 내 연락처를 몰라 연락을 하지 못했다며 시험은 12월 26일 교수연구동에서 본다는 내용이었다. 기쁜 마음 반, 우울한 마음 반이었다. 기쁜 거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였고, 우울한 마음은 시험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인생이 왜 이런 거야 대체….' 난 자학했다.
그래도 이틀 동안 별 방해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일까. 겨우겨우 졸업시험을 통과했다. 다행히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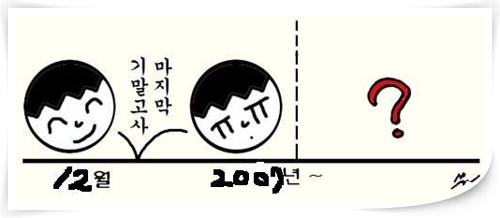
▲새로운 곳으로의 도전. 누구나 두렵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 김수원
참 힘들었다. 남들을 보면 졸업 참 쉽게 하는 거 같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그게 아니었나 보다. 다들 졸업을 하기 위해 뭔가 어려운 사정들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어쨌든 난 이제 졸업을 한다. 졸업이라는 것이 조금은 두렵고 사회라는 곳에 발을 내딛는 것이 무섭긴 하지만 말이다. 깜깜한 터널에 혼자 내버려진 느낌이랄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아 그저 저 멀리 보이는 빛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가는 기분이다. 하지만 뭐 어떠랴, 늘 해왔던 것처럼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가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