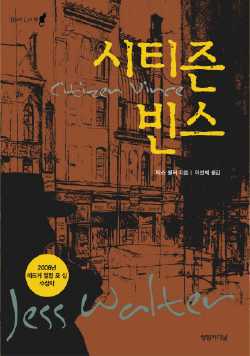
▲<시티즌 빈스> ⓒ 영림카디널
미국의 작가 제스 월터의 <시티즌 빈스>는 바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범죄자의 이야기다. 오슨 웰즈의 전설적인 영화 <시민 케인>을 연상시키는 제목이다.
<시티즌 빈스>의 주인공은 '빈스 캠든'이라는 36살의 남자다. 14살 때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18살 때는 첫 번째 중죄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미국에서 중죄판결을 받으면 교도소에서 나오더라도 두 가지를 잃게 된다. 하나는 총기 소지권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권이다. 하지만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게 총이기 때문에, 총을 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문제는 투표권인데 이것 또한 아이러니하다. 일반인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투표에 범죄자가 얼마나 관심을 둘까. 중범죄자가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그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라니.
주인공 빈스 캠든은 오래전에 뉴욕에서 신용카드 위조와 관련된 절도와 사기로 여러 차례 기소된 적이 있다. 그러다가 그 지역 조직범죄와 연관된 증언을 하게 되고 FBI는 빈스를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올려놓는다.
이때부터 빈스 캠든의 새 삶이 시작된다. 빈스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과거를 갖는다. 물론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던 과거도 모두 없어진다. 빈스는 제빵기술을 배워서 워싱턴 주의 한적한 곳인 스포캔에 정착한다.
하지만 역시 제 버릇은 남을 주지 못하는 법. 빈스는 다시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손을 대게 되고, 어디선가 냄새를 맡은 뉴욕의 조직원은 빈스를 찾아서 스포캔으로 다가온다. 이런 상황에서 빈스는 과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1980년 가을이다. 미국에서 지미 카터와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이다. 대선의 영향은 작은 마을인 스포캔에까지 미친다. TV를 켜면 카터와 레이건의 유세장면이 나오고, 이와 맞물려서 이란에서 억류하고 있는 미국 인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긴박하게 돌아간다.
지미 카터는 양심적이면서 소심하고, 로널드 레이건은 낙천적이면서 과격하다. 그리고 과거가 말소된 깨끗한 인물인 빈스는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손에 넣었다. 빈스는 TV를 보면서 난생처음으로 자신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작품의 공간적 무대는 스포캔과 뉴욕을 오간다. 조용하고 한적한 작은 마을과 정신없고 복잡한 뉴욕. 주인공은 그 두 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시각각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새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작가는 스포캔과 뉴욕의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그 속에서 정치와 투표에는 별 관심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느끼고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후회하는 주인공의 모습까지.
<시티즌 빈스>는 2006년에 미국 추리소설 최고 권위인 에드거 앨런 포 상을 받은 작품이자,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올해의 책이기도 하다. 잘 짜인 추리소설이면서 동시에 신랄한 정치풍자,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범죄자의 내면을 들여다본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 곳곳에서 미국 대선과 이란인질사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하지만 작가는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가치나 애국심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투표권'으로 상징되는 일반인들의 삶과, 그런 삶을 동경하는 범죄자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결국 범죄자가 딛고 있는 현실의 토대가 얼마나 빈약한지, 그로부터 나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과거를 씻고 새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주인공, 진정한 '시티즌'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제스 월터 지음 / 이선혜 옮김. 영림카디널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