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원
춘천에 도착하니 하늘의 구름이 좋았다. 소양댐 가는 11번 버스를 기다리며 힐끔힐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구름만 구경하다 가도 좋을 듯 하였다.
여행의 이상함 가운데 하나는 몇 번 가본 곳은 이상하게 버스가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처음 왔을 때 터미널에서 소양댐까지는 그렇게 멀어보였다. 서너 번 다녀가며 눈을 익힌 뒤끝이라 그런지 이제 버스는 금방 소양댐에 도착한다. 대부분의 물은 댐에 갇혀있지만 댐에서 풀려난 운 좋은 물들이 멀리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 먹기로 했다. 그래 갇혀있는 생각은 하지 말자. 댐의 물은 옹기종기 모여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 뭐. 거대한 대가족을 거느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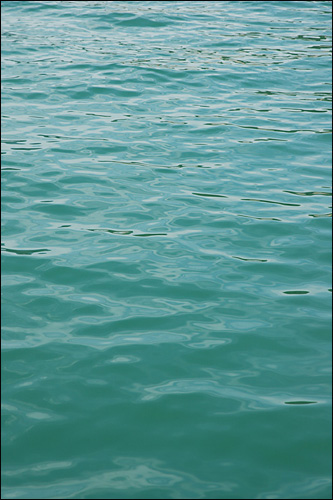
ⓒ 김동원
원래 나는 양구까지 한바퀴 돌아오는 유람선을 타고 배에서 바라본 소양호 풍경을 찍거나 그 배가 양구에서 사람을 내려주면 그곳에서 내려 양구를 여기저기 돌아보다 서울로 다시 올라갈 생각이었다. 유람선은 안하냐고 물었더니 사람이 없어서 배를 띄우기가 뭐하다고 한다. 하긴 평일날 유람선 타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냥 청평사 들어가는 배표를 끊었다.
배가 뜨길 기다리는 동안 일렁이는 물결을 구경한다. 물결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끊임없이 문양을 바꾼다. 나도 물결처럼 저렇게 계속 생각의 문양을 다르게 엮어낼 수 있을까. 어차피 내가 몸을 묻고 있는 일상의 풍경이란 그렇고 그런 것. 하지만 그 똑같은 듯한 일상에서 항상 다른 의미와 색깔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나도 물결이 되고 싶었다. 똑같은 듯해도 매일 달리보이는 삶을 읽어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동원
배가 사람들을 내려주고, 그곳에서 청평사까지는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돌산 하나가 나를 맞아준다. 정수리에만 나무가 남았다. 산은 오늘 나무 위로 구름을 쏘아 올린다.
사람들이 모두 그냥 지나간다. 전에 분명히 한번 다녀갔었는데 그때 이런 산이 있었나 싶다. 나도 이 자리를 그냥 지나친 게 분명하다. 가끔 세상은 바로 곁에 있어도 보이질 않는다. 오늘 비로소 산을 보고, 또 운 좋게 구름까지 곁들여서 본다.

ⓒ 김동원
청평사로 가는 길은 숲이 울창하다. 한낮의 빛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지만 시간이 늦은 오후로 접어들면 그때부터 비스듬히 몸을 눕히는 법이다. 빛은 몸을 눕히면서 숲의 틈새를 비집고 슬쩍 숲의 품을 파고 든다.
숲은 저 혼자 있을 때면 짙푸른 녹음으로 어둡기까지 하지만 빛이 그 품에 안기면, 갑자기 투명한 푸름으로 푸르르 떨린다. 숲길을 오를 때 그 푸른 떨림을 보았다면 발길을 멈추지 않을 수 없다. 나도 누군가를 가슴에 안을 때면 저렇게 투명하도록 푸르게 떨리는 것일까.

ⓒ 김동원
계곡이 낳은 알이다. 계곡을 파고든 빛이 온도를 맞추어주고, 이끼가 그 부화를 보살핀다. 무엇을 잉태한 돌일까. 혹 세월을 잉태한 돌은 아닐까. 세월이 부화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의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돌은 내 머리 속의 갖가지 생각으로 부화를 하고 있는 듯 싶었다.
암벽의 연속...가파른 길 생각하면 내려갈 일 까마득

ⓒ 김동원
아무 생각 없이, 또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은 청평사에서부터 였다. 청평사로 오르는 길목에서 보았던 등산로 안내도 앞에서 나는 오봉산을 오른 뒤 다섯 개의 봉우리를 타고 배후령으로 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다시 들어가 서울로 가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중간에 만난 해탈문 앞에서 나는 그 앞에 걸쳐놓은 들어가지 마시오란 표지를 보곤 겁을 먹었다. 길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절로 내려왔다. 지나는 분에게 등산로를 물었더니 청평사 경내로 들어가면 극락보전 옆으로 길이 있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난 내가 올라갈 산이 절의 위쪽으로 빤히 보여 그다지 어려울 게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 김동원
중간쯤 올랐을 때 나는 카메라의 삼각대를 카메라 가방에 묶어야 했으며, 카메라도 가방 속으로 집어넣어야 했다. 산은 암벽의 연속이었다. 계속 쇠줄을 잡고 올라가야 했다. 올라가다 숨을 고르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저 멀리 아래쪽으로 내가 발걸음을 떼었던 청평사가 숲에 파묻혀 귀퉁이 모습만 약간 보여준다. 다시 내려가고 싶었지만 올라올 때의 그 가파른 길을 생각하면 다시 내려갈 일이 오히려 더 아찔했다. 나는 자꾸만 위로 위로 올라갔다.

ⓒ 김동원
조금 올라가다 또 카메라를 꺼내들고 사진을 몇 장 찍는다. 경관은 좋다. 하지만 물은 작은 생수 하나가 전부이고 목의 갈증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었지만 걱정이 되서 마음대로 마시기가 어려웠다. 풍경은 좋았지만 그러나 목의 갈증을 풀긴 어려웠다. 물은 아껴마셨지만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다.

ⓒ 김동원
드디어 정상을 알리는 표석으로 보이는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으나 뭉개져 있어 알아보기 어려웠다. 길은 또 위로 계속되고 있었다.

ⓒ 김동원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진을 찍지 못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나는 등산로라는 표지를 따라 길을 갔지만 결국 절벽으로 가로막힌 등산로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4봉과 3봉 사이의 구간이라고 한다. 절벽을 옆으로 두고 쇠줄을 잡고 가야 하는 아주 험악한 구간이란다.
돌아오다 보니 해탈문으로 내려가는 길이 눈에 띈다. 나는 내려가는 길을 그곳으로 잡았다. 극락문으로 들어갔는데 정작 내가 본 극락의 세계는 그 가파른 산엔 없었다. 다리는 아팠고, 계속 쇠줄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길은 팔의 힘도 빼놓았다.
극락은 저 아래쪽 내가 사는 세상이었다. 극락문이란 그러고 보면 극락의 세계로 가는 문이 아니라 극락의 세상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문이다. 내가 사는 아래쪽 세상에 즐거움이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해탈문을 나와선 나는 힐끗 문 뒤쪽을 바라보았다. 이미 배는 끊긴 상태. 서울로 돌아갈 일이 걱정이다. 하지만 산 속에서 길을 못찾아 헤매던 시간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이 그 걱정을 덮어 버렸다. 해탈이 따로 없었다. 내려오다 계곡에서 뜨거운 발을 식히고, 계곡물로 목을 축였다. 말할 수 없이 달콤했다.
청평사에 도착하니 승용차 한대가 막 산 아래로 내려가려 하고 있었다. 108배를 드리고 떠나는 부부였다.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내려가는 길이면 태워주랴고 했다. “태워주시면 고맙지요”하고 냉큼 뒤에 올라탔다. 뱃길이 끊어지면 못나가는 곳이지만 배후령으로 해서 배치고개를 넘어 들어오는 찻길이 있기는 있다. 그 길로 들어온 부부였다.
송파에 산다는 두 분은 우리 집 앞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 살다보니 이런 행운도 있다. 충동질에 떠난 여행에서 이번에도 또 좋은 사람만나 여행의 마무리가 훈훈했다.
덧붙이는 글 | 개인 블로그에 동시에 게재했다. 블로그에선 6월 24일부터 보입니다. 블로그 --> 김동원의 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