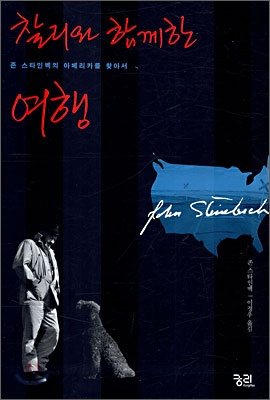
ⓒ 궁리
존 스타인벡은 자신의 조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작가였던 것 같다. 그의 작품 전부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인 작품 몇몇에서 드러나는 미국사회에 대한 초상과 미국인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애견이었던 '찰리'와 함께 했던 국토여행기 <찰리와 함께 한 여행>은 작가의 그러한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작가는 '뱃고동 소리만 들으면 온몸이 쭈뼛쭈뼛해지며 발이 들썩거린다'며 자신의 불치명인 역마살이 이 여행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자신의 나라인 미국과 미국인에 대해 잘 알기 위해'였다고 뒷부분에 가서 그 본심(?)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곧 작가정신과도 연결된다. 자신이 쓰고 있는 미국과 미국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설가로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때는 1960년 9월의 첫째주 월요일. 58세를 맞은 존 스타인벡은 그의 애견 찰리만을 동행하고 '로시난테'라 이름붙인 그의 트레일러(집처럼 개조해 만든 대형트럭)에 몸을 싣는다. 그가 살고 있는 롱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장장 3개월에 걸친 미국대륙순례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예견한 독자도 있겠지만, 이 책은 그 고장의 유적지와 맛집, 문화재 등 '볼거리'를 순례를 그런 종류의 여행기는 아니다. 저자 자신의 발길이 닿는 대로 이동하면서 만나게 된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의 풍광들, 그곳에서 만난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은 사람들,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의 이면을 바라보는 감회와 소견 등의 감상이 작가의 깊은 통찰력을 통해 드러나는 책이다.
한마디로 1960년대 미국사회의 한 단면을 뚝 잘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여행기이면서 동시에 역사책이기도 하며 동시에 1960년대 미국사회의 풍속서랄 수도 있다.
당대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력 엿보여
특히 산업화와 공업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예리하고 날카롭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잃게 될 것들, 예를 들면 따뜻한 인정이라든지 친절함, 배려, 전통문화, 골동품 등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정치에 무관심해져가는 국민들의 태도며,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일삼고 있는 관료들, 부당한 부동산 과세법 등 당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퍽 상세하게 기술해놓아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1960년 뉴올리언즈 사건(1960년 2월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시각 한명씩 흑인 여자 아이가 입학 허가를 받았던 때의 일. 이건은 한국에서도 널리 보도되었다고 한다)과 관련해서 이를 직접 목도한 작가의 경험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 그 당시 흑인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흑인아동이 등교하는 동안, 이를 규탄하는 백인 학부모들의 맹렬한 시위를 보며 저자는 '소름이 끼치고 속이 아니꼬울 정도로 슬펐다'고 적고 있다.
사실, 여행이 후반부로 접어들며 행선지가 남부로 향하면서 저자는 남부를 지나야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백인 작가로서의 '아킬레스 건'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흑인차별문제가 당대의 주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야했던 백인 작가로서 짊어져야 될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랄까.
'나는 각기 독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무수한 주를 통과하고 무수한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지만 이제 내 앞에는 남부라는 지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을 가본다는 게 어쩐지 두려웠지만 꼭 가서 보고 듣고 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나는 겁을 집어먹은 채 남부로 향했다. 남부에는 고통과 혼란이 있고 당황과 공포에서 빚어진 온갖 결과가 있다.'(336쪽)
뉴올리언즈에서 목격한 사건은 저자의 마음에 두고두고 충격으로 남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뉴올리언즈를 빠져나오는 동안에 저자는 흑인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풀어놓는다. 심지어 마침 피곤에 절어 길을 걸어가는 흑인노인을 태워주지만 그 흑인에게는 존 스타인벡의 친절이 절대로 호의로 느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벽을 느끼게 된다. 흑인 차별이 살벌했던 그 시대상황에서 존 스타인벡 역시 고민하고 갈등하는 한 사람의 작가였던 것이다.
여행? 설렘과 고독이 공존하는 것
당시 미국사회의 풍속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즐거움도 크지만 이 책이 주는 단연 큰 기쁨은 '여행', '떠남' 그 자체에 있다. 저자 역시 역마살을 이기지 못해 떠난 걸음이지만 여행을 하는 도중, 자신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여행은 꼭 즐겁고 설레기만 하는 것일까? 여행은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특히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물론 찰리가 있긴 하지만) 겪게 되는 뼈저린 고독과 외로움, 그리움은 여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설렘과 고독과 번갈아가며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도서출판 궁리의 '궁리미국총서' 시리즈에 해당한다. 원래 <찰리와...>는 1965년,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던 이정우 교수에 의해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그 번역본을 2006년에 재출간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재출간 후기에 적혀있는 에피소드 하나. 이정우 교수는 적확한 번역을 위해 의문이 나거나 잘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당시 생존해있던 존 스타인벡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그러면 존 스타인벡은 '미스터 리, 당신이 해석한 문장이 내가 쓰고자 했던 의도보다 훨씬 더 훌륭하니 꼭 그렇게 번역해주기 바라오'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진다.
매끄럽고 훌륭한 번역이 돋보이는 책이기도 하다.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번역을 한 흔적이 여실하게 보인다. 특히 '휘우듬한' '그느름' '갱충쩍다' '청처짐하게' '너주레하니' 등 순 우리말을 섞어서 표현하고자 한 번역자의 노고 덕분에 이 책은 더욱 제 빛을 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찰리와 함께 한 여행/존 스타인벡 지음, 이정우 옮김/ 도서출판 궁리/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