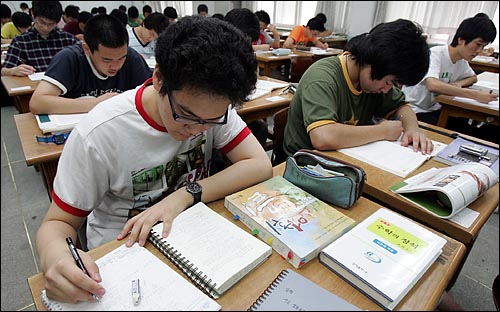
▲사진은 서울 한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 ⓒ 연합뉴스 조보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우열반', '0교시 수업', '심야자습'에 관한 이야기로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 불현듯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아침 7시 학습지 방송수업을 시작으로 보충수업-정규수업-보충수업-야간자습-심야자습으로 이어져 밤 12시가 되어야 학교생활이 모두 끝나는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저와 같은 75년생들은 잘 알겠지만 수능시험을 처음 본 세대이자, 본고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특히 부활된 본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본고사반', '특과반'이라는 이른바 '우열반'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열반', '0교시 수업', '심야자습'을 모두 겪어봤다는 것입니다. 10시간의 수업과 7시간의 자습은 지금 생각해도 참 징글징글합니다. 그래도 수업과 자습은 육체적으로는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견딜 만했습니다.
'특과반', '본고사반'...나머지는 수능반하지만 '우열반'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 당시 '수능반', '본고사반', '특과반'이라고 말하는 '우열반'은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른바 '수준별 학습(학업성적에 따른 이동수업)'과 비슷합니다.
학교수업 10시간 가운데 3시간정도를 할애해 전체 학생 중 3분의 1은 '본고사반'으로 나머지는 '수능반'으로 이동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면 '본고사반' 애들 중 5분의 1은 다시 '특과반'으로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특과반'은 서울대, 연·고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반이고, '본고사반'은 그 다음 서열에 있는 대학, '수능반'은 나머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 편성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고사가 부활되면서 학교가 이른바 '일류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공부로 잘 나가는 것 보다는 주먹으로 잘 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수능반'이었습니다. 제 자체가 공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수능반'으로 낙인(?) 찍히고 나니 꼭 학교로부터 '너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거치적거리지 마라'라는 통보를 받은 듯했습니다. 또 졸지에 열등생이 된 저는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패배감을 그 때 처음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라서 그런지 그 당시 그 일이 학교로부터 상당한 차별을 받는 기분이 들었고, 적지 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의 '패배주의'와 '상처'는 학교에 대한 '분노'와 본고사반, 특과반 애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동수업을 받기 위해 '본고사반' 애들이 이동할 때 조금이라도 복도가 소란스러우면 저는 교실 문을 벌컥 열어 “어이! 본고사반 조용히 안 댕길래, 너것들이 이래 시끄러우니깐 우리 수능반 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아이가!" 하며 괜한 고함과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폭력성으로라도 그들을 억눌려 '나는 너희들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변명 같지만 열등생 입장에서 보면 '우열반'이라는 존재는 하기 싫은 공부를 더 하기 싫도록 만들고, 없던 패배주의와 적대감, 분노를 새롭게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상처가 되는 것은 평소 친하던 친구와 거리감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업성적에 따라 잘 지내던 친구와 반이 갈리고 나니 분위기가 참 어색해졌습니다. 같이 도시락 먹는 재미도 예전 같지 않고, 쉬는 시간마다 나누던 대화수도 부쩍 줄었습니다.
열등생 입장에서는 '괜히 나 때문에 친한 친구가 앞길 망치는 것은 아닌지'하는 자격지심이 생겨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우등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우열반' 제도를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 중에는 '특과반'에 편성이 되었지만 평준화 학교에서 '우열반'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로 인해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은 더더욱 싫다며 '특과반' 들어가길 공개적으로 거부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종의 계급화 과정을 거치면서 친구들과 신분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 함께 어울려야 할 친구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겨 멀어지게 된 것은 물론 계급이 달라짐에 따라 없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진학률과 맞바꾼 한 후배의 목숨하지만 학교가 바라는 효과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 해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우열반'이 일류대 진학률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학교는 그 후 계속해서 '우열반' 제도를 운영해 왔고 제가 졸업한 2년 뒤에는 이동수업 형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반 편성을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졸업한 지 3년째가 되던 해 모교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등반'에 들어가지 못한 한 후배가 그것을 비관하여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후배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들으면서, 저는 결국 학교가 '서울대진학률'과 한 후배의 '목숨'을 맞바꾸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열반'에 대한 저의 기억은 '패배주의', '위화감', '죽음'으로 얼룩져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극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나름 굵어진 고등학생 때도 이 '우열반'은 큰 상처로 다가왔는데 이제 이러한 '우열반'이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과연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상처와 패배주의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학교가 본디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좀 더 인간다운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르는 것입니다. 결코 일류대학에 많이 진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양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 등의 논리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학교교육마저 그런 정글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열반'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승자독식' 게임에 길들여지고, '패배주의'와 '위화감'에 상처를 받는 것은, 또 그렇게 상처 받은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에 닥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앞당겨서 심화,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제 개인적 경험과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내놓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연 '철학'이 있는 교육자인지 '입시'만을 생각하는 대입기술자인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우열반'은 우리 아이를 열등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일찍부터 패배자가 되어 상처받고, 그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열려 있던 가능성마저 모두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큰 상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국가가 나서 학교를 학원화시키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주는 일은 이쯤에서 그만둬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제 주변의 고등학생 혹은 대학 신입생들에게 저의 고3시절 '우열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니 웃어 버립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학교내 '우열반' 경쟁은 물론, 보다 좋은 학원에 가기 위한 학원내 '우열반' 경쟁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