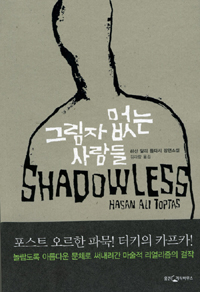
▲<그림자 없는 사람들>겉표지 ⓒ 웅진지식하우스
터키 작가 하산 알리 톱타시의 <그림자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곳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다. 읍장이 있고 파수꾼이 있고 이발사가 있고 사람들은 정을 나누는 그런 곳이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읍장은 이상한 '신고'를 받게 된다. 이발사 즌글 누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발사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간 흔적이 없다. 무슨 일이 있어 마을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다. 읍장과 사람들은 이발사의 흔적을 찾아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단서는 없다. 이발사의 가족은 울면서 더 열심히 찾아달라고 사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건 아니다.
또 누군가가 사라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름다운 소녀가 사라지자 마을은 난리가 난다. 이발사가 사라졌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 유괴의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찾지만 단서는 없다. 읍장은 마을 바깥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도시에 가서 실종신고를 하려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무슨 수가 생기는 건 아니다. 또 누군가가 사라진다. 불안함이 마을을 뒤덮기 시작한다.
<그림자 없는 사람들>의 시작은 자극적이다. 사람들이 사라지지만 단서가 없고, 그로 인해 마을에 전염병 같은 불안함이 퍼진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자극적인 스토리를 내세우는 소설이 아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진지한 것이 있다. 한없이 가벼운 존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깊게 스며들어 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깨닫는다. 단지 그들의 신체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누군가의 기억도 사라진다. 기억을 잃어버린 것인지 사라진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존재감도 사라진다. 눈앞에 형체가 보이지만 존재감이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뭔가를 말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된다. 그 외에 또 무엇이 사라지는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
<그림자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불안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존재감이 한없이 가볍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고민하다 그 답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질문은 질문하는 것과 동시에 사라지고 만다. 그런 불안함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아니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나'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상적인 것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시골 마을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많은 소설들이 정체성 등을 이야기할 때 중산층이나 지식인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를 이뤘는데 <그림자 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그래서일까. 소설 속의 그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소설을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주변의 이야기 같다. 어쩌면 나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까지 들지도 모른다.
생경한 이름의 낯선 소설이다. <그림자 없는 사람들>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그 생각부터 할 것이다. 하지만 소설의 끝에 이르면 알 것이다. 터키 문학을 기대하는 또 한 명의 작가가 탄생했음을. 기괴한 '사라짐'을 다룬 <그림자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무엇을 상상했든, 그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