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빵값과 책값과 찻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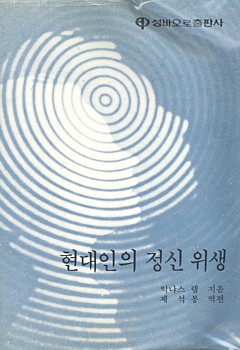
▲헌책방에서 2000원에 사들인 작은 책 하나로 여러 날 마음이 따뜻하게 됩니다. ⓒ 최종규
헌책방에서 <현대인의 정신 위생>(익냐스 렙 씀,성바오로출판사 펴냄, 1970)이라는 조그마한 책을 2000원에 사서 읽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볼일을 마치고 옆지기 부모님이 사는 일산으로 전철을 타고 가는 먼길에서 조금씩 읽어냅니다. "어린이의 정신적 평형을 보전하자면 육아가 어머니만의 독무대여서는 결코 안 된다. 아버지도 가능하면 처음부터 참여해야 한다. 육아는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 여자가 할 일이라는 좋은 핑계로 자기의 임무를 거부한다면 어머니 혼자서 자녀 교육을 도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39쪽)"는 대목에 밑줄을 긋고 한참 동안 곱씹으면서, 서양이든 이웃 일본이든 중국이든 또 우리 옛살림이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란 '어버이 두 쪽이 모두 힘쓰고 마음쓸' 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알면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무척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에서만 '알고도 안 할'까 싶어요. 정치꾼(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군수이든 구청장이든 읍장이든)을 뽑을 때에도 참되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하는 줄은 알지만, 막바로 먹고살기 팍팍하다면서 '돈 잘 벌게 해 주겠다'는 사람을 뽑고야 맙니다.
먹고살자면 옳든 그르든 가리지 않겠다는 뜻인지, 먹고살기만 할 수 있으면 착하든 나쁘든 아랑곳 않겠다는 넋인지 궁금합니다. 내 배가 고프니 우리 삶터를 더럽히는 1회용품을 마구 쓰더라도 괜찮고, 내 집이 따뜻해야 하니 우리 자연을 무너뜨리면서 끝없이 나무를 베고 석유를 뽑아내어 써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결이 되고 마는가 싶습니다. 빨리 가야 하니까 건널목 푸른불이 들어와도 자동차는 부릉부릉 빵빵빵 지나가며 사람들이 못 건너게 합니다. 댈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 걷는 길에 자동차를 올려놓고는 하루 내내 볼일을 봅니다.
곰곰이 따지자면, 삶이 삶답지 못합니다. 생각을 생각답게 키우지 못합니다. 몸을 몸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을 말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러는 우리들이라면 책을 책답게 바라보면서 읽을 수 있겠느냐 싶고, 도서관마다 그윽한 아름다움을 알아볼 눈이 없을 뿐 아니라 도서관 나들이를 즐기지 못하겠구나 싶습니다. 도서관을 즐길 줄 모르니, 책 하나 제 주머니를 털어서 장만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겠구나 싶으며, 헌책방에서 조금 값싸게 사들이는 보람과 판이 끊어진 책을 뜻밖에 만나는 신남을 느끼지 못하겠구나 싶어요. 저는 고작 2000원만으로도 고달픈 전철길을 넉넉히 채워 줄 좋은 벗을 만났고, 전철에서 내려 옆지기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에서도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좋은 느낌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지면서 제 몸과 마음을 한결 낫게 감쌀 테지요.
대화역에서 전철을 내립니다. 바로 버스 갈아타고 갈까 하다가 빵집에 들릅니다. 뭐 하나 사들고 가려고 둘러보는데 값싼 작은 빵 하나도 1000원이 넘고, 웬만큼 부피가 되는 빵들은 오륙천원을 하고 롤빵은 1만2000원을 합니다. 맛보기 빵을 몇 점 집어먹으며 혀를 내두르다가 작은 마늘바게트와 스폰지빵을 골라 6000원. 인천에서 용산까지, 또 용산에서 일산까지 해서 전철삯은 2700원.
ㄴ. 좋은 책 하나를 읽으면
세상을 꿰뚫는 눈을 일러 주는 책은 꾸준하게 나옵니다. 사람들 마음속을 파고드는 눈길을 보듬어 주는 책은 지며리 나옵니다. 우리 삶터를 아름다이 가꾸도록 이끄는 책은 한결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책들이 널리 팔리거나 읽히는 일은 뜻밖에도 드뭅니다. 재미가 있어서 많이 팔리는 책, 다들 많이 읽는다 하여 제법 팔리는 책은 있으나, 담긴 줄거리나 알맹이가 참으로 훌륭하기에 골고루 읽히며 우리 마음밭을 북돋우게 되는 책은 생각 밖으로 얼마 안 됩니다.
누구나 <태백산맥>과 <토지>와 <삼국지>를 재미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깊은 바탕지식이 없어도 어느 만큼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탕지식이 없는 만큼 더 재미나게 읽을 수 없고, 바탕지식이 얕은 만큼 한결 애틋하게 받아먹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마다 제 그릇이 있어서 제 깜냥껏 좋은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다만, 스스로 바탕지식을 키우지 않거나 마음그릇을 넓히지 않고서는 '책으로 얻는 재미'와 '책으로 나누는 즐거움'이 그 한때로 그치게 될 뿐, 내 이웃과 둘레로 퍼져나가지는 못하기 일쑤입니다.

▲좋은 책 하나는 다른 책 하나로 줄줄줄 잇닿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면서 둘레에 널리 추천하거나 선물하는 책 가운데 하나인 <수달 타카의 일생> 같은 책도, 이웃한테 여러모로 책씨를 퍼뜨리지 않았으랴 생각합니다. ⓒ 그물코
<녹색시민 구보 씨의 하루>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저절로 <수달 타카의 일생> 같은 책을 읽도록 손길을 뻗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수달 타카의 일생> 같은 책을 읽은 분이라면 시나브로 <제7의 인간> 같은 책으로도 손길이 뻗쳐야 하지 않느냐 싶고, <제7의 인간> 같은 책을 읽은 분은 으레 <일본군 군대위안부> 같은 책으로 손길이 뻗치리라 봅니다. <일본군 군대위안부>로 손길이 뻗쳤다면 <니사> 같은 책으로도 손길이 뻗칠 테며, <니사> 같은 책으로도 손길이 뻗친다면 <산골유학> 같은 책으로도 손길이 뻗칩니다. <산골유학> 같은 책으로도 뻗친 손길은 <빅토르 하라> 같은 책으로도 뻗치고, 또다시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실>로도 뻗치며, <골목 안 풍경>이나 <연변으로 간 아이들>로도 뻗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책 하나 읽은 손길이 그 책 하나로 그치는 일이 없으며, 이러한 손길은 책을 살피는 손길로만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 모두를 둘러싼 우리 삶터를 헤아리는 손길로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만 읽는 손길이라면, <우리들의 하느님>을 읽고도 <몽실 언니>나 <초가집이 있던 마을>로 뻗치지 못합니다. 뒤이어 <산골마을 아이들>과 <탄광마을 아이들>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지식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삶(실천)을 말하는 책임을 보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뒤엎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부터 작은 한 가지부터 갈아엎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됨을 말하는 책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혼자 나아가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책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름쯤 앞서 <바다로 간 플라스틱>을 덮으면서, 이 작은 책에 담긴 넋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곱씹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한편으로, 아무리 이 작은 책을 읽어내 주더라도 우리 생각과 매무새와 삶 모두 달라지거나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책이 곧잘 팔리게 되더라도 무슨 뜻이 있을까 싶더군요. 책은 읽으라고 있으며, 책은 읽어서 좋을 수 있지만, 돈에 눈멀어 만들어지는 책이 있고, 책만 읽어 머리통만 무거워지는 얼간이는 조금도 좋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