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정오, 청운관 앞에서 경희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내가 졸업한 국문과 선생님들 일곱 분의 성함이 선언문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적혀있었다. 가슴이 찡해져왔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었다. 그런 내게 잊혀지지 않는 은사님 두 분이 대학에 와서 생겼다. 두 분의 이름도 살포시 적혀있다. 다시 한 번 가슴이 뭉클해져왔다.
단과대 학생회장 시절, 단식 10일 정도 됐을 때, 본관 앞에서 면담 요청과 함께 농성을 하고 있었다. 학생처장이던 선생님이 오셔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손을 꼭 잡으셨더랬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선생님, 저 정말 괜찮아요." 속상해하는 선생님 표정을 보는 내가 더 죄송스러웠다. 선생님은 그렇게 한참 손을 꼭 잡고 계시다가 가신단 말도 얼버무리시며 나가셨다. 잠시 후 잠시 다른 곳에 갔다 온 간부 오빠가 들어오자마자 우리에게 물었다. "처장선생님 우신다. 왜 그러냐?"
그 때 느꼈던 선생님 사랑, 아직도 내겐 큰 바람막같은 것이 되어있다.
선생님은 늘 그러셨다.
학생처장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 농활대 방문을 거르는 일이 없으셨고, 등록금 협상이 난항일 때에도 "학생 편 들라고 학생처장 시킨 거 아니냐"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셨다.
전필수업을 맡고 계셔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 강의실에서 만나시면서도 조를 짜서 수업 전 후로 제자들에게 밥을 사주시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00여명의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셨고, 그런 모습들로 과 제자들에게 선생님보단 "최아빠"로 불리셨다.
문과대 학장을 맡으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실천하는 인문학"이었다.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방 참여 등 다양한 '나눔'의 실천들을 학생들에게 권하셨다.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회실로 들어오셔서 스스럼없이 "니들 밥 먹었냐? 밥먹으러 가자!" 하는 분이셨고, 그것이 어색하지 않은 유일한 선생님이셨다. (물론, 그렇게 찾아오는 다른 교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었다.)
또 한 분, 과 선배이시자 선생님이셨던 분.
"그래서 하늘은 넓은 게다. 어디서든지 올려다 보라고. 그래서 바람은 부는 게다. 바삐 걷다가도 날리는 머리칼 쓰다듬으라고"라는 말로 한참 힘들어하던 날 위로해주셨던 분이셨다. '가난이 가난의 편을 들지 않으면 세상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대화명으로 오래 걸어두고 계신 선생님은 늘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 중 한 분이셨다.
오늘 선생님 사진을 발견하고선 문자를 드렸다.
"선생님, 가슴 찡해요 ㅠ 선생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살게요...
제 은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잠시 후 답문이 왔다. "왜이래 새삼스럽게스리....~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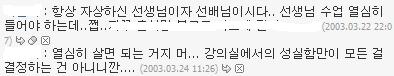
▲선생님 사진을 퍼와 멘트를 남겨놨는데 선생님이 답글을 다셨다 ^^;; ⓒ 이진아

▲선생님이 남겨주셨던 싸이월드 일촌명 ⓒ 이진아
선생님이 문득 너무 보고싶어졌다. 스승의 날 가 뵙지 못한 주제에 선생님께 미니홈피에 감사하단 인사와 함께 학교갈테니 밥사달라는 염치없는 글을 남겨놨더니 만날 사달라면서 정작 사줄 기회는 안 준다시던 선생님….
이러지 않으셔도 선생님들은 이미 마음 속에 늘 스승으로 자리잡고 계신 분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선생님들 모습에 하루종일 내 심장은 꾹 눌러삼킨 눈물들로 촉촉하게 적셔져있다.
정말, 선생님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고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