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언론이 위기다. 대학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앙대에서는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학내 교지가 전량 수거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다. 한신대학교의 경우, 오보를 이유로 6개월 가까이 학교 신문을 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mbn 12.1일 보도)
성역이 없어야 할 대학 언론, 하지만 학교 눈치를 보며 진실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학보를 제작하는 대학 기자의 수도 크게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학보사는 소수의 인원으로 어렵사리 학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학우들의 관심 저하, 열독률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학 신문의 위기?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은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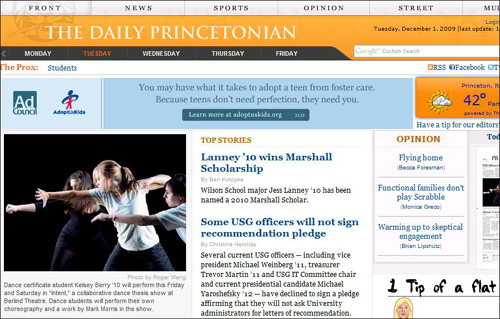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 인터넷판 화면 ⓒ dailyprincetonian
그런데 위기에 직면한 국내 대학 언론과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외국 대학 신문이 있어 주목된다. 화제의 신문사는 바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신문사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The Daily Princetonian. 이하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이다.
30명의 에디터와 150명의 스태프, 일반 언론사 버금갈 정도의 큰 조직을 갖추고 있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은 1876년에 일간으로 창간된 이후 성황리에 발행되고 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성역 없는 취재로 학우들의 신뢰가 높기에 국내 학보사가 배울 만한 장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
하루에 발행 부수만 2000부, 웹사이트에 하루 접속자 수 평균 3만건에 달하는 신문은 학우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성장하고 있다. 과연 그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을 만드는 열정 가득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기자들을 인터뷰 해 그 특별한 비결을 알아 보았다.
<번역, 이메일 인터뷰 도움: 박선유(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4학년)>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의 133번째 편집장 매티에게 듣다프린스턴 대학 뉴스룸은 신문에 환장한(?)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기자들이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에 붙인 'The prince'(왕자님) 라는 별명에서 보듯, 신문에 대한 기자들의 애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133번째 편집장인 매티 웨스트모리랜드(23·역사전공)가 바로 그렇다.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 사무실 내부 전경 ⓒ 박선유
고등학교 때 교내 신문에서 에디터로 활동했었던 매티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기자를 꿈꿨고 편집장이 되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뉴스와 함께 보내는 매티의 놀라운 하루 일과를 들어 보자.
"하루 24시간 동안 프린스(프린스턴 신문사 별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뉴스룸에서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신문사와 관련된 여러 이메일과 전화를 받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4시쯤 신문사에 도착해 새벽 3시에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취재와 기사 쓰기에 푹 빠진 매티,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뉴스룸에서 보내는 그는 신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었다.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의 편집장다웠다.
"저에겐 학업보다 신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쩔 땐 학업에 지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학업과 신문의 비중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다행히도 5일이 아니라 3일만 발행합니다."시험 기간 동안 일주일에 3번 발행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매티에게서 대단함이 느껴졌다. 일주일에 한 번 발행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국내 대학 언론의 현실을 생각하면 말이다.
"학생들은 신문사에서 일한다고 학교 학점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신문사는 학교에서 전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데일리 프린스토니언> 기자들은 대학교로부터 받는 혜택이 거의 없었다. 그 흔한 장학금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운영비까지 책임져야 했다. 따라서 비즈니스 스태프들은 약60만 불(약 6억9700만원)의 운영비를 도맡고 있다. 수익은 주로 광고나 교내 또는 교외 구독료를 통해 충당했다. 말 그대로의 일당백의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니터를 가르키는 잘 생긴 청년이 바로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의 133번째 편집장 매티 웨스트모리랜드(23.역사전공)이다. ⓒ 박선유
광고 수주는 물론 취재까지 전담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역시나, 매티는 취재 중에 발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어려움은 더 좋은 신문을 만드는 과정, 그는 더 나은 신문 발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프린스턴처럼 그렇게 큰 사건이 많지 않은 '조용한' 캠퍼스에 대해 일주일에 다섯 번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스토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합니다."편집장으로서 그의 일은 신문사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매티가 말했다.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의 주요 독자층은 프린스턴 학부생이지만 종이신문을 구독해서 보거나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보는 교수, 학교 운영진, 졸업생, 학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신문의 확대, 블로그나 팟캐스트 재 디자인, 그리고 옛날 신문의 디지털, 온라인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의 이사진과 함께 공동 CEO로서 신문사의 현황을 보고하는 것도 제 일이죠." 학교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비판할 수 있어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에서 기사와 사진 레이아웃을 맡고 있는 박선유(23·금융공학과 4학년)는 신문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순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만 기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학교 내의 문제, 또는 사회 이슈를 재조명하는 특별 칼럼 기사가 많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동문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사도 실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는 계가가 됩니다."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 뉴스룸, 왼쪽이 나의 이메일 인터뷰, 번역을 도와준 박선유(프리스턴4학년)이다. ⓒ 박선유
뉴스, 스포츠 등의 기사를 쓰는 가브리엘 데베네데티(20·전공 미정)는 성역 없는 취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의 대학의 진실에 대해 조사하고 보도하는 능력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학교에서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학교에 대한 어떤 주제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습니다."막힘 없이 취재할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이 부러웠다. 국내의 학보는 대부분 발행인이 대학 총장이고 학교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비판기사는 취재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요구한다는 말까지 들리기에 이런 아쉬움은 더욱 컸다.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 신문을 교열한 흔적 ⓒ 박선유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의 자유로운 취재 여건은 133년의 역사 동안 앞선 대학기자들이 만들어온 땀방울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기에 기자 선발과 교육은 뜨겁고 치열했다.
뉴스, 스트리트, 그리고 스포츠 섹션에 지원하는 기자들은 첫 번째 기사를 쓰기 전 훈련을 받는다. 선배 기자 한 명이 멘토가 되어 조언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오피니언과 사설에 지원하는 기자들은 먼저 지원서를 내야하고 그 후, 편집장과 오피니언 에디터가 함께 기자를 뽑는다.
그렇기에 <데일리 프린스토니언> 기자가 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편집부 에디터인 조세핀 울프(21·수학전공)는 필자의 마음을 전율시키는 한 마디를 던진다.
"우리 신문의 매력은 발간된 신문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학보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는 조세핀 울프의 이야기에 필자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찼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꾸준히 학보를 발행하는 국내의 학보 기자들도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신문은) 취재를 위해 수많은 부서와 행사를 참여하고 유명 인물을 인터뷰할 기회가 많아서 좋습니다.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 비평적으로 보도하는 기자들을 환영하는 조직입니다."부장 기자인 타스님 샤마(21·영어전공)는 '비평을 환영하는 조직'이 바로 자신이 활동하는 신문사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국 프리스턴대 대학생 기자들, 대한민국의 학보사에 조언하다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의 대학생 기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나라의 학보사에 대해서 애정 어린 조언을 건네줬다. 가브리엘 데베네데티는 '진실'과 '스토리'를 찾으라고 조언한다. 참여와 지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보도 자체라는 것이다.
"교내 신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실과 스토리를 찾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문 보도 자체로 신문사는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다. 참여, 지원 등의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합니다."

▲왼쪽은 편집장인 매티 웨스트모리랜드(23.역사전공), 오른쪽 두명은 어시스턴트 에디터이다.
ⓒ 박선유
부장 기자인 타스님 샤마는 참여 인원 부족, 학우 관심 저조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학보사에 발상의 전환을 권유했다. 온라인 신문으로의 방향 전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취재를 물심양면 도와준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의 스태프인 선유도 한국의 학보사에 애정어린 조언을 전했다.
"이번 기사를 위해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이 학생들의 열정에 굉장히 놀랐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도와주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다. 학교 숙제와 다른 일과 병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일 매일 하루에 6~7시간씩 신문사를 위해 일하는 학생들을 보니 왜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이 양질의 기사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지 알 것 같았다. 한국의 학보사 기자들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편집부 에디터 조세핀 울프는 짧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학보사 기자들에게 애정 어린 마음을 전했다. "열심히 계속 하세요!"라고 말이다. 편집장 매티도 한국의 학보 기자들을 격려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항상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 많은 노력을 해야 그들의 관심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쓰려고 노력하십시오. 파이팅!"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실을 파헤치는 우리 대학 언론. 하루빨리 '자유롭고 독립적'인 신문이 되어 <더 데일리 프리스토니언>처럼 진실의 날개를 펼치길 기대해본다.
덧붙이는 글 |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 웹사이트 주소: http://www.dailyprincetonian.com
제4회 전국대학생기자상공모전 응모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