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탐험하고 온 한 비행사가 이런 말을 했다. 밖에서 본 지구는 너무 푸르고 아름답더라. 멀리서 본 세상이라면 희망과 아름다움이 넘칠 수도 있을 게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농촌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한 번도 제 손으로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나 같은 이들은 그곳을 아름다운 전원생활과 후한 인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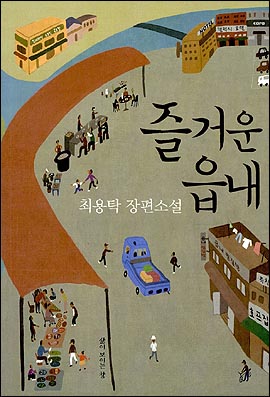
▲지금 이 시대의 자화상을 그려낸 <즐거운 읍내> ⓒ 삶이보이는창
최용탁 작가의 장편 <즐거운 읍내>는 그런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다. 충주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작가의 이 장편은 시종일관 비수처럼 읽는 이의 가슴에 덜커덩, 꽂힌다. 몸 안을 휘젓고 다니는 멍울을 두 손으로 찾다가 문득 발견하게 되는 것은 상처다. 이 시대의 환부. 쉽게 낫기 어려운 암세포들이 몸 곳곳을 누비며 우리를 병들게 한다. 이 소설은 바로 그 암세포들을 현미경으로 꼼꼼하게 바라본 병상기록이다.
소설 속 인물들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은 문제적 인간 조백술이다(중간에 재필과 진규 부자의 이야기도 등장하나 중심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열일곱 나이에 전쟁 중인 군대에 들어갔다가 다리에 총알이 박혀 상이용사로 제대한 인물되겠다. 백술은 상이용사의 힘을 이용해 형제간의 의까지 끊어가며 재산을 모았다.
돈을 위해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던 그가 달라진 건 첩으로 들인 봉선댁을 만나면서부터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란 말이 있듯 피가 어디 갈 리 없다. 두 아들 원오와 창오는 여러 번 사업을 말아먹고 나서 이제는 대놓고 아버지 백술의 재산만 노린다. 그건 딸인 은희도, 그밖에 사위와 며느리들도 마찬가지. <즐거운 읍내>에는 이렇듯 돈에 환장한 막장 가족의 난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쾌하게 펼쳐진다.
작가는 조백술 가족의 이야기 속에 돈 때문에 변모해가는 농촌의 현실, FTA, 학교 교육과 폭력, 성폭행, 돈으로 시인 자격증을 사는 문단의 행태 등 세상의 이면을 날카로운 촉으로 담아낸다. 인물 대부분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길만을 걸어간다.
왜 그럴까. 돈은 오로지 한 줄기의 흐름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좀 더 위에 서 있기 위해 그들은 이 악물고 싸운다. 패배자가 된다는 건 이 길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니까.
세상은 돈을 토해내고, 또한 그만큼 집어삼킨다. 동정 없는 세상은 그렇게 생산 벨트 위에 생존자를 남겨놓고, 패배자를 가차 없이 쫓아낸다. 그러니 소설이 조백술 가족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머니게임에 물든 우리의 자화상 그 자체인 셈이다. 작가는 뜨거운 글의 온도로 거침없이 문장을 내달린다. 한 번 잡으면 책을 놓을 수 없을 만큼 흡입력이 있고, 그에 못지않게 바늘로 콕콕 찔러대는 메시지도 무게감이 있다.
<즐거운 읍내>를 읽으며 우리 문학에 큰 구멍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농촌소설이 어느 결에 사라졌다는 거며, 그와 더불어 이문구라는 작가가 떠난 자리가 새삼 크다는 사실이다. (소설가 윤정모) 그가 들려주는 농촌의 이야기는 그가 기른 복숭아를 껍질째 먹을 때처럼 들척지근하면서도 목구멍이 꺼끌꺼끌 하게 한다. (소설가 이시백)소설가 카프카는 좋은 소설이란 읽는 이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야 한다고 믿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다, 익숙하다고 믿었던 것들의 추악한 이면을 꺼내 보여주며 소설은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을 노래한다. 깊은 절망과 아픔 뒤에 더 힘찬 희망이 다가올 수 있을 테니까. '절망하지 말라. 설혹 너의 형편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절망은 하지 말라. 이미 끝장이 난 것 같아도 결국은 또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즐거운 읍내>는 지금 이 순간, 동정 없는 세상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희망이 샘솟기 전, 가장 깊은 어둠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