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가방을 찍은 두 장의 사진. 한 사진은 유명 명품브랜드 '프*다' 로고가 잘 보이게 가방 앞면을 찍었고, 다른 사진에는 포토샵으로 가방의 브랜드 로고만 지워 '이거 G*켓에서 싸던데 살까요?'라는 글을 덧붙였다.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사진이 각각 올라왔을 때의 반응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다.
프*다 로고가 있는 사진에 달린 댓글은 '와~ 진짜 예쁘다. 얼마줬어요?', '이거 신상? 잡지책에서 본 것 같아요. 예쁜 거 잘 사셨다!'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로고가 지워진 가방에 대해서는 '사지 마요. 엄마 계모임할 때 드는 것 같음', '저게 뭐예요~ 차라리 고속터미널을 가세요' 등의 심드렁한 반응이었다. 연출된 장면이 아니다. 실제 올해 초 한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실 기자 본인도 로고가 있는 가방이 왠지 더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착각이 '살짝' 들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명품 효과'인가?
사실 대학생 신분인 기자에게 특별히 갖고 다닐 일도 별로 없지만 명품은 언제나 로망의 대상이다. 여대생이라면 한 번쯤 잡지 속 명품 브랜드 페이지에 시선이 꽂힌 경험이 있지 않을까? 또 요즘에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명품가방을 대학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대중적인 명품 브랜드 루*비통의 특정 모델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3초에 한 번씩 마주친다 하여 '3초백'이라는 애칭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이 정말 그 값을 다주고 명품을 구매하는 것일까? 대학생들이 등록금도 모자라 이제는 명품영역까지 손을 뻗쳐 부모님의 '등골브레이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하지만 명품은 생각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명품에 목말랐던 기자의 에피소드를 포함, 사촌의 팔촌까지 수소문해 알게 된 다양한 명품 구매기를 모아봤다.
"이 가격에 물건 못 구한다니까"... 생각만해도 '아찔한' 짝퉁 구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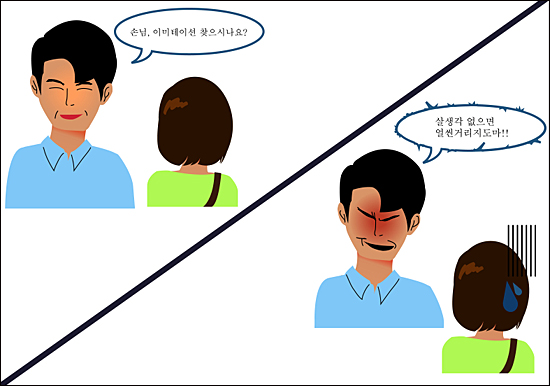
▲구매 의사를 보이지 않자, 갑자기 돌변한 짝퉁 판매직원 ⓒ 이은실
지난해 9월. '짝퉁' 관련 학보사 기사 취재차 동대문 일대의 짝퉁 가방 판매점들을 돌았다. 취재가 목적이기는 했지만 평소 명품가방 하나쯤 구비하고 싶었던 기자에게 짝퉁 역시 내심 끌리는 존재였다.
손님인척 가방들을 둘러보며 기웃거리고 있던 기자에게 한 남자가 "이미테이션 찾으세요?"라며 접근했다. 기자가 흥미를 보이는 척하자 그 남자는 매장안쪽의 구석진 곳으로 기자와 동료를 안내했다. 옆과 뒤는 벽면, 앞에는 가방 진열대로 모두 가려진 그 구석진 공간에서는 가방들 사이로 사람이 지나다니는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나마 입구로 갈 수 있는 길마저 직원이 서 있으니 '독안에 든 쥐'가 따로 없었다.
남자는 여러 잡지책을 보여주고 '20대가 주 고객인데 샤*, 루*비통, *찌가 잘나간다'며 맘에 드는 모델을 고르라고 했다. '독안에 든 기자'가 얼떨결에 몇 가지 모델을 고르자 남자는 열쇠를 가지고 사라지더니 한참 뒤에야 물건을 가져왔다. 단속이 심해진 탓에 창고에 물건을 숨겨두고 고객이 원하는 모델을 말할 때 가져오는 방식이었다. 짝퉁도 원산지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갈리는데 기자는 남자가 권하는대로 '국산 A급'을 선택했다. 물건 가격은 정상가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취재가 목적이기도 했고 엉겁결에 처음으로 들어온터라 구매가 영 내키지 않았다.
"조금만 더 둘러보고 올게요.""아, 뭘 둘러봐요~ 우리집만큼 잘해주는 집 또 없어. 이거 샤* 클러치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싸게 줄게. 20장 어때?""저희 여기가 처음이라서요. 더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둘러볼 필요가 없다니까 참~ 알았어 알았어, 18 아니아니 15! 됐지? 이 물건 이 가격에 못 구해!"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가격에도 기자와 동료가 머뭇머뭇하며 구매를 꺼리자 남자는 갑자기 돌변했다. 살살거리며 샤* 클러치를 건네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살 생각도 없으면서 괜히 장사 방해나 하는 이따위 짓 할 거면 다신 얼씬거리지도 말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심지어 기자와 동료가 가게에서 등을 돌리는 순간,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욕을 퍼붓기까지. 아, 여기가 명품 판매점이었다면 안 산다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진 않았을 텐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망치듯 다른 건물로 들어가 역시나 짝퉁 판매점들이 줄지어 있는 층으로 갔다. 이번에도 은밀히 다가오는 직원의 유혹. 방금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놨더니 '같은 업계종사자지만 그 사람이 너무 심했네요'라며 친절하게 응대해주었다. 시종일관 친절하게 물건의 등급과 가격을 요목조목 따지며 비교해주던 그 직원으로 인해 결국 기자는 루*비통 베르니 라인의 가방을 구입했다. 큰 수모를 당하고 마음을 쓸어내리며 구입했던 그 가방. 지금도 그 가방은 왠지 진짜 명품보다 더 애틋하게 느껴진다.
'어떻게든 날 가져요~' 명품계부터 대여점, 중고판매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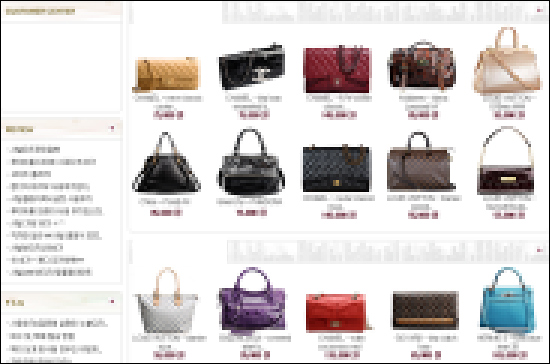
▲한 명품대여점 사이트. 대여가격과 상품 사진 등이 올라와 있다. ⓒ 화면 캡쳐
한때 인터넷에 떠돌았던 신조어 퀴즈의 26번 문항이다. "유명제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조직한 계 또는 그러한 계를 조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정답은 바로 '명품계'.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으며 고등학생들도 조직한다는 파문이 일기도 했다. 20대 여대생들은 한시적으로 명품계를 조직하기도 한다. 해외로 나가는 친구가 있을 때마다 그 친구에게 돈을 몰아주면 그 당사자는 공항 면세점에서 친구들이 요청한 명품들을 사다주는 식이다. 면세점에서는 일반 백화점이나 명품관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탄탄한 믿음이 없다면 불안감을 수반하기도 하는 명품계의 특징을 이용해 최근 계를 대신 조직해주는 인터넷업체까지 생겨났다.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비납부체크부터 미납통보까지 모*미에서 모두 해드립니다'라는 이 친절한 홍보 문구에 명품계원 언니들, 꽤나 솔깃할 법하다.
고가의 명품을 정가의 3~5% 수준에서 대여해 주는 명품대여점도 대학생들 사이에선 인기다. 온라인상에서만 수십 개의 업체가 운영 중이며 종로와 강남 일대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도 여럿 볼 수 있다. 안국동에 위치한 A 명품대여점 사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고객층은 20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편"이라며 "샤넬이나 루이비통, 연예인들이 착용했던 물건들은 브랜드 상관없이 항상 불티나게 나간다"고 설명했다.
대여기간은 기본 4박 5일에서 9박 10일까지이며, 가격은 5만 원대부터 13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명품대여점을 애용한다는 한 블로거는 대여한 명품의 착샷(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프*다 가방과 함께 있는 며칠 동안은 마치 공주가 된 양 어디든 들뜬 기분으로 다니게 된다'는 내용의 대여점 이용기를 자주 올리기도 한다. 명품대여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친한 친구인 L양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당연하지~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나중에 특별한 일이 생길 때 꼭 한 번 이용해보고 싶어! 이러다 조만간 남친도 명품처럼 빌려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호호"한편 기자의 고등학교 동창 C양은 대여점보다는 중고판매점에 더 관심을 보였다. 남들처럼 명품에 관심은 많지만 주3일, 시급 4500원을 받으며 빵집 알바를 하고 있는 C양에게 새 명품 장만은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라 일찌감치 중고판매점에 눈을 돌렸다고 한다.
"시급 4500원의 월급을 꼬박 6개월 정도 숨만 쉬고 모으면 겨우겨우 루*비통 하나 살 수 있으려나? 대여하면 며칠 동안은 내 것일지 몰라도 결국 반납해야 하잖아. 중고가 훨씬 낫지. 눈 크게 뜨고 잘만 고르면 새 것 같은 물건도 얼마나 많은데~"또한 기자의 주변에는 각종 업계에서의 알바비를 차곡차곡 모아 조르지오 아*마니의 시계를 사고 뿌듯해하던 기특한(?) 남자 후배도 있는가 하면, 항상 '비비안*스트우드', '샤*'을 칭송하지만 본인은 돈이 없다며 부모님을 졸라대는, 참으로 귀여운(?) 여자 선배도 있다. 물론 그들은 명품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느 20대처럼 그들의 명품을 향한 애정은 금방 식지 않을 것 같다. '명품구매 가이드북'을 펴내면 명품만큼 잘 팔리려나? 기자의 주변사람들이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명품을 공수해올지 내심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