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이라는 게 흔치 않던 1980년대. 명절이 되면 시골 어르신들은 명절 쇠러 오는 자식들의 승용차로 자식의 성공 정도를 판단하기도 했다. 우리 집은 친형들이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터라 '성공했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지만, 정작 명절이 되면 자가용을 타고 오는 형들은 아무도 없었다. 형들은 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면허증을 땄다. 그리고 휴학 후 군대에 있을 때도 운전병으로 병역을 필했다. 군을 전역하고 나니 군에서 차를 몰고 다녔던 습관이 남아있었는지 사회에서 차가 없어서 겪는 불편함은 무척이나 컸다. 그래서 저렴한 중고차를 사기 위해 매매센터를 찾아 가격에 비해 비교적 차 외관이 깨끗한 엘란트라 중고차 한 대를 샀다. 그 차의 몸값은 100만 원 대, 오토기어를 장착한 엘란트라는 군에서 몰았던 군용차와는 승차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다. 지난 1997년, 20대였던 내게도 '애마'가 생긴 것이다. 나는 그 애마와 함께 학교에 복학했다.
내가 다니던 대학교는 넓고 예쁜 캠퍼스로 지방에 있었지만 명성이 자자했다. 3월이면 젊은 청춘들이 대학 시절의 낭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승용차를 몰고 유유히 아름다운 캠퍼스를 누비는 나는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을 샀다. 당시 시세로는 학교 근처에서 1년 사는 데 드는 돈과 중고차 한 대 값이 비슷했다. 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살던 나는 자취방을 구하는 대신 승용차 통학을 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생각처럼 통학은 쉽지 않았다. 대학 강의라는 게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주욱 있는 것도 아니고, 술 약속이 많아 결국 친구 자취방에서 신세를 지기 일쑤였다. 게다가 내 신분이 학생인지라 차랑유지비를 대기 힘들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마가 짐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애마가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엠티서 만난 그녀, 이후에도 날 계속 찾은 이유

▲내 전 애마 엘란트라. 중고차였지만 당시만 해도 꽤 멋졌다. ⓒ 이경관
어느 날 친구가 '학교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에 엠티(MT) 가자'고 제안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드물었던 때라 내가 승합차 운전을 맡았다. 그 엠티는 몇몇 친구와 함께 가는 게 아니었다. 우리 학과 남학생들과 다른 학과 여학생들이 함께 가는 것이었다. 엠티 때 나는 한 여학생을 알게 됐다. 그녀는 서울 출신 '도시녀'였다.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공부를 해 소위 '촌스러웠던' 나는 그런 여학생과 어울리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는 '애마'가 있었다. 캠퍼스 속에 있는 건물을 열심히 걸으며 강의실을 찾아가는 시간만 해도 적지 않게 소요됐으며, 도심권과 달리 대중교통이 보편화 돼 있지 않은 지방대 생활에는 승용차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었다. 그 필요성은 나만의 장점이 됐다. 엠티가 끝난 뒤, 그녀는 학교에서도 나를 자주 찾았고, 나의 애마는 그녀의 든든한 발이 됐다. (당시에도 어림짐작은 했지만) 그녀가 정작 필요로 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을 빠르고 편하게 태워다 줄 내 '애마'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됐다. 나와 그녀는 당일 코스로 여행도 자주 가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렇게 관계가 성장해가던 어느 날, 그녀는 졸업장을 들고 학교를 떠났다.
졸업 후 그녀는 전공을 살려 서울에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일자리를 구했다. 나는 당시 학교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내게 애마가 있는 이상 물리적 거리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주말이면 그녀를 향해 쌩쌩 달렸다. 애마는 중고차였지만 잘 달렸다. 심지어 오전 6시에 지방에서 출발해 9시 그녀의 출근시각에 맞춰 회사에 바래다 준 적도 있었다. 애마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우리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오빠 동생'이 아닌 '연인'으로 발전했다.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서울에서 그녀를 자주 만났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가 일하고 있는 직업 분야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외형적 화려함과 대중적 인기와는 달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과 그 분야에 맞는 전문 언론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새벽에 나와 출근 배웅까지, 다 '애마' 덕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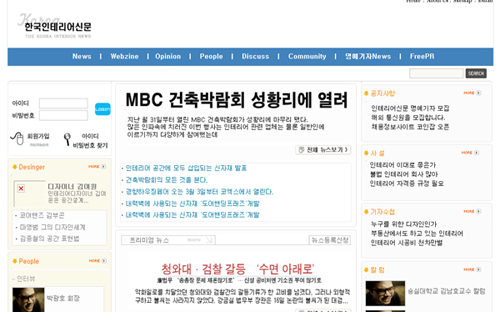
▲그녀와의 인연으로 인해 나는 생각치조 못하게 인테리어 분야의 신문을 만들게 됐다. ⓒ 이경관
그래서 나는 2003년,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신문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액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인터넷 신문을 시작했다. 사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전공을 살린다면 중앙일간지 혹은 공중파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하지만 내게 소위 '언론고시'라 불리는 입사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였다.
국내 인터넷 성장 초기인 2000년대 초반 '딴지일보'와 '오마이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시작된 것을 봐 왔었다. 이 역시 나에게는 큰 새로움이었다. 하지만 종합신문이 아니고 비록 전문신문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직접 할 용기는 없었다. 아니 능력도 없었다. 그것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전혀없는 분야를 말이다. 속말로 인테리어디자인의 '인'자로 모르면서 그 분야의 신문을 시작한 것이다.
나의 애마 때문에 시작된 그녀와의 인연 때문에 나는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길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 마포에 일곱 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직장을 그만둔 그녀와 나, 단 둘이서 컴퓨터 두 대와 카메라 한 대만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 달 여에 걸쳐 신문 사이트를 만들었다. 취재는 오로지 나 혼자의 몫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신문은 해당 분야의 정보나 지식의 전달보다는 직업 환경에 대한 비판 일변도의 논조를 보이게 됐다. 반향은 꽤 컸다. 회원 수와 접속자 수는 많아졌고, 전문 구인구직누리집과 서적, 쇼핑몰까지 오픈하면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모델을 만들었다.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다. 당연히 직원도 채용했다. 급기야 2003년에는 격주간지로 종이신문까지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신문은 사라졌다. 그녀도 없다. 그리고 그때의 나의 '애마'도 없다. 부유했던 그녀의 집안은 사업가 아닌 '사'자 가 들어간 직업을 가진 사위를 원했다. 그녀 집안의 반대 시기와 맞물려 신문사는 인테리어시공 사업까지 확장됐지만, 2004년에 망했다. 내가 만들고 있었던 신문은 '과거의 한 매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됐다. 나는 애마를 팔 수밖에 없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오른 게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그 뒤로 사태가 해결되기까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했다.
대학 시절 나의 애마 때문에 시작된 그녀와의 인연, 7년 동안의 세월은 지금도 가슴 깊이 잊고 싶지 않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추억은 내가 글을 쓸 수 있게끔 인생을 변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