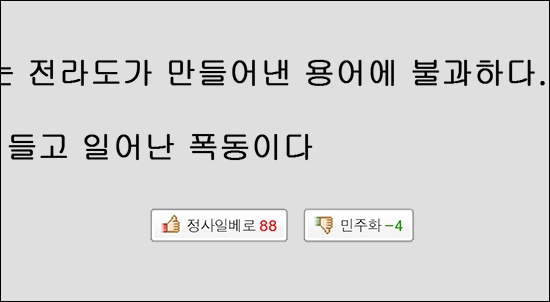
▲'일베' 는 민주화를 거부감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일베 사이트 캡처 화면. ⓒ 일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혹은 어느 네티즌의 신상이 털렸다는 기사에서 '일베(일간베스트)'가 거론된다. 이제는 사회 분야를 다룬 뉴스에서 '일베'라는 이름을 듣는 일이 낯설지 않다. '유머사이트'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일베는 특정 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일이 잦아져 문제가 되었다. 여성의 신상을 털어서 공개한 뒤 "이 여자를 성폭행하겠다"고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자신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있음을 '인증'하는 사진도 게시된 바 있다.
최근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면서 '고인 모독'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기사에 언급되는 사건들로 해당 커뮤니티의 성격 자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일베'라는 이름을 마치 하나의 '사회현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누리꾼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일베의 게시글이 꾸준하게 노무현과 김대중을 비하하고,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당하다(강제로 뭔가 안 좋은 일을 겪다)"라는 말로 표현하며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지적한다. 꾸준히 민주진보 진영을 희화화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에 반감을 갖고있는 심리상태라는 분석이다.
'불안'이 창궐한 시대, 일베는 괴물이 아니다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일부 젊은 세대에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은 역사책 속의 '독재'라는 단어와 비슷한 무게로 자리잡은 과거의 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민주화'가 정의로운 쪽이라 자칭하며 따르기를 강요한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다소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일베 사용자 중 일부는 선거 전후의 분위기를 회상하며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따르지 않으면 '친일독재세력 옹호론자'로 몰아가는게 싫었다"고 고백하는 이도 있었다. 가치판단을 스스로 내리기도 전에 선을 그어놓고 "진영을 선택하라"는 말이 몹시 불쾌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베'라는 현상이 입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진영을 향한 극단적인 어휘를 동반한 맹렬한 비난이 단순한 반발감 때문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일베로 사람들이 모여든 배경에는 이들 행동의 근원이 되는 심리적 요소가 숨어있다. 바로 '불안'이다.
문화비평가 최태섭씨가 쓴 책 <잉여사회>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면, 현재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불안'을 앓고 있다. 한국에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는 IMF를 기점으로 이미 지나갔고, '무한경쟁'이 시대적 가치인 양 여기저기서 울려퍼진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빈번한 사회에서 여유를 잃은 대중은 정신적인 가치를 찾기보다는 '먹고사니즘'에 빠져 개인의 안정을 찾는 일에 급급하다. 정착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불투명한 현실에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고, 고스펙을 갖추어도 앞날은 흐릿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했다'는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더하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반감이 겹친 집단이 바로 일베라고 <잉여사회>는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마냥 마음을 놓고 이들을 비웃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이 빠진 함정은 지금 우리도 함께 빠져 있는 함정이다. 일베가 아닌 모든 이들도 불안과 불만을 양손에 가득 쥐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노의 분출대상과 방식이 매우 비겁해서 문제지만, 일베의 출현 자체가 괴물의 탄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안 폭발'로 인한 '집단 붕괴' 막으려면...

▲영화 <테이크쉘터>의 한 장면. 주인공 커티스는 이유모를 불안감에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린다. ⓒ 찬란
지난 4월에 개봉한 영화 <테이크쉘터>를 보자. 주인공 커티스는 평범한 미국 중산층 가정의 가장이다. 비슷한 형편인 그의 이웃들은 다들 좋은 집을 장만하고, 멋진 차를 구입한다. 이들을 따라 집을 알아보고 일에 매진하며 살던 도중, 커티스는 원인 모를 불안감과 끔찍한 악몽에 시달린다. 매일 밤 태풍이 몰아닥치거나 누군가에 의해 딸이 위험에 빠지는 꿈을 꾸는 것이다. 꿈이 점점 더 사나워져서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불안해지자,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뒷마당에 방공호를 파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이웃들을 적으로 인식한다. 커티스는 최대한 그들을 멀리하면서 가족을 보호하고자 벙커 안에 틀어박힌다. 영화는 불안에 사로잡힌 현대인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려는 심리로 귀결되는지 광기어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색깔론'을 앞세운 매카시즘이 야당 압박에 사용되고, 인터넷에서는 일베와 국정원 직원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쏟아낸다. '김치녀'라며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글도 더러 섞여 있다. 비난을 받는 것보다 악플을 다는 쪽이 덜 괴로워서 동참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이 정도면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인 '왕따'가 사회적으로 확장된 꼴이다.
'불안'이 창궐해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반공'의 구호가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같은 말보다 "빨갱이를 때려잡자!"는 피아구별의 논리가 더 행동에 옮기기 쉽다. 이런 태도는 소속감을 빠르게 얻게 되면서 불안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처럼 깊어진 갈등에 적대감을 갖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은 끝없이 반복될 따름이다. 한 번의 미끄러짐이 곧 실패한 인생을 규정짓는 사회야말로 불안을 퍼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길이 아닐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폭탄을 서로 떠넘기려는 '눈치 게임' 같은 현실만 계속될 것이다. 사회 곳곳에 극도의 불안과 불만이 퍼진 상태로 잠복해있다 언젠가 집단 전체가 폭발로 붕괴하기 전까지 말이다.